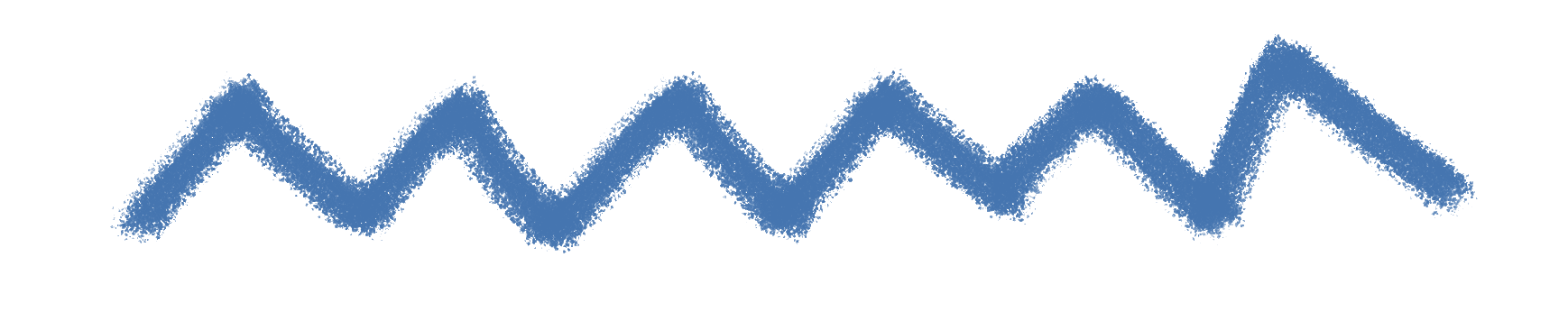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가락이 신경이 쓰여서 이따금씩 곁눈질을 했다. 손가락이 메트로놈처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진자운동을 반복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은 한참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내가 내려야 할 역까지 아무래도 저 손가락을 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참 고역이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잠시 멈추자 나는 놀라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어 상처인지 아니면 그저 노화에 따른 현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두 눈.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두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휙 돌렸다. 그를 보고 있지 않은 잠시 동안 나는 호흡이 가빠졌다. 나의 머릿속에서 그의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다시 돌렸다. 다시 손가락질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초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까딱거리기.
손가락질을 보고 있자니 마음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았다. 나는 깬 채로 꿈을 꾸고 있었다.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노래가 들리는 앞 차량을 향해 눈을 돌렸더니 그곳에 노래를 부르는 짐승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짐승을 오랫동안 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나는 내가 내려야할 곳을 지나쳤고, 출근시간에도 늦어버렸다. 노래가 끝나자 나는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까딱거리기. 손가락을 까딱거리기. 그것이 내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나는 이제 눈을 감았다. 이상해진 지하철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지 않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 머릿속에서 손가락이 까딱이는 리듬에 맞춰 노래가 흐르는 것 같았다. 폭죽과도 같은 것들이 리듬에 맞춰 터져 나왔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지하철은 어느새 평소의 지하철로 돌아가 있었다. 창밖으로 어두운 지하의 시멘트벽들이 보였다. 그 앞으로 여전히 피곤한 표정을 한, 그러나 눈을 감기 전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내릴 역을 지났을 뿐, 출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다음 역에 내려 반대로 지하철을 타야만 했다. 다소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출근길의 정상궤도에 오른 것을 안도하는 찰나에 나는 다시 손가락을 떠올렸다. 그리고 손가락이 실재하던 자리를 흘겨봤다. 그곳엔 여전히 손이 있었다. 손가락을 까딱거리던 호랑이를 닮은 눈동자를 지닌 사람의 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손을 엿보고 있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다시 손가락이 까딱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다.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것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떴다. 그러면 손가락은 마치 그곳에 자리한 장식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다음 역에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열차 안에서 나는 거의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과 같은 처지여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사람들의 암초에 부딪히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어깨와 팔을 손이 닿는 대로 낚아채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통수로 욕설이 들려오기도 했다. 구역질이 나는 것만 같았고,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다. 나는 괴물이 침을 뱉듯이 지하철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곧장 눈에 보이는 쓰레기통으로 직진했다. 그곳에 허리를 숙이고 오늘 아침이며, 어제 저녁에 먹은 모든 것을 게워냈다. 속을 비우니 개운한 기분이 들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제 까딱거리는 손가락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내린 역을 둘러봤다. 주위에는 아무도, 아니 시야에는, 역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심쩍은 마음으로 역의 이름을 찾아보았으나, 역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하얀 빈 칸만이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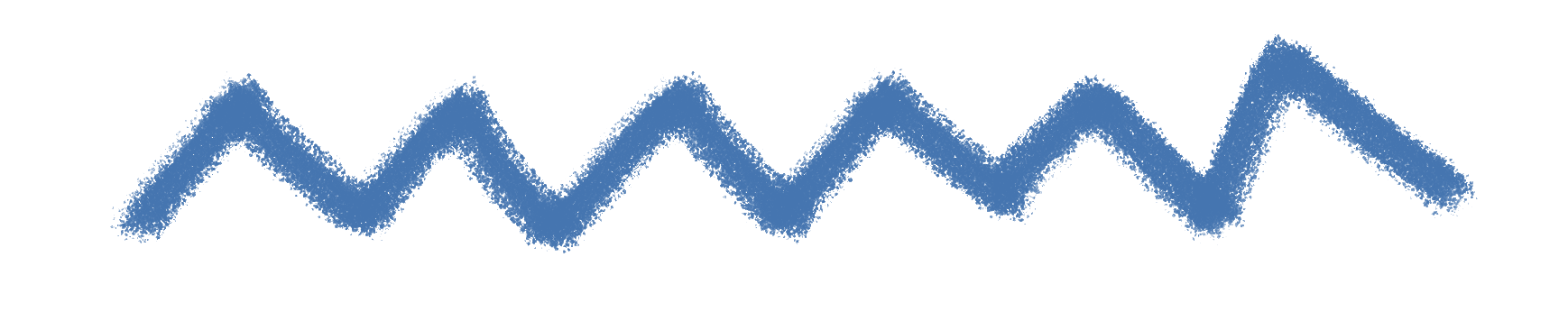


![타인의 마음 [주간 묘사 제 8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6/1687164905700379.jpeg)
![Anniversary [주간 묘사 제 10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7/1688475612638437.jpeg)
![엔지니어링 [주간 묘사 제 38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2/1707741366713689.jpeg)
![가급적, [주간 묘사 제 42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3/1710284655210995.jpeg)
![작가 인터뷰: 오동석 [주간 묘사 제 22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9/1695728143800965.jpeg)
![오늘의 기분 [주간 묘사 제 7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6/1686662995574941.jpeg)
![11월 [주간 묘사 제 27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11/1701073066835986.jpeg)
![잠든 척 [주간 묘사 제 43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3/1710854354777092.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