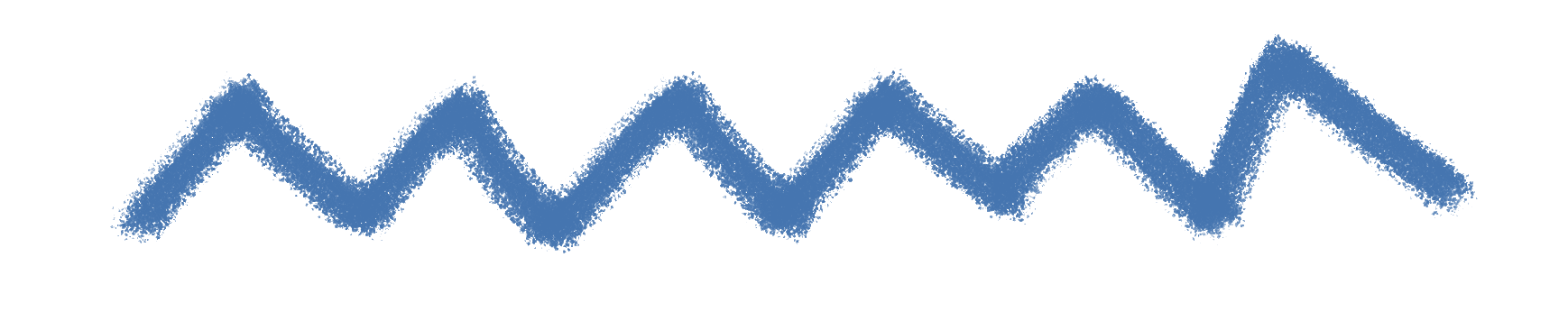
그는 분명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너무 늦지 않은 오후에 강 옆에 난 숲길을 가로지르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과 온통 단절될 수 있었다. 5월이 코앞이던 그날은 유독 강이 반짝여 울창한 수풀 사이 시야로 빛이 새어 나왔지만 아직은 강물이 춥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수영을 즐기지는 않는 걸로 보였다. 속옷까지 한꺼번에 벗고 곧장 호수로 뛰어든 건 딸의 수업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걸 인지한 직후였다. 풍덩 생각보다 차가운 물이 예상치 못하게 입안 가득 들어왔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에 카타르시스— 곧이어 수면 위로 올라와 보니 따끔거리는 눈을 비벼 뜨니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은 이전에 알던 곳이 아니었다. 그는 뭍으로 나와 옷을 입으려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수영복 차림이었다는 걸 알아차린다. 해는 지나치게 쨍쨍했고 몸은 타들어 가는 듯하다. 40도쯤 될까.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닐 수 없는 돗자리와 파라솔에 다가가 앉는다. 몸에 묻은 소금물은 이미 조금씩 마르고 있지만 그래도 수영복은 늦게 마르기 때문에 수건을 아래쪽에 덧대어 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수건을, 그러니까 그가 샀을 법한 파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색쯤 되는 그 수건을 익숙한 손짓으로 꺼낸다. 그의 것으로 보이는 빨간 천 가방과 그 안에 든 립글로스와 물병과 200페이지쯤 되는 알베르 카뮈의 에세이. 이상하거나 낯선 것은 어디에도 없다. 밭은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얼마나 잠수했는지 생각한다. 부르튼 손과 발에 녹아내리듯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감각을 천천히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발가락에 묻은 모래가 진짜인지. 부드러운 파도의 소리와 사람들이 펑- 펑 하고 발리볼을 던지는 소리와 저 멀리 계속해서 바다, 바다, 바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뒤에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계가 정말로 있는지? 그곳이 있다면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마음속에 분명한 정답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손을 꿈틀댈수록 바스락 소리를 내는 돗자리의 질감을 만지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 얼마나 있었든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사실 이미 이곳에 있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심장박동이 느려지자 점차 평온한 기분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멀리 보이는 해상구조원이 앉아 있는 빨간색 의자와 연한 파란색 하늘, 상아색에 가까운 고운 모래사장, 문득 그는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어 한 장을 찍어낸다. 작은 핸드폰의 프레임 안에 다시 계속해서 상아색, 사람들, 파라솔이 이어지다가 멀지 않은 곳에 감자튀김과 마실 것을 파는 노점을 발견한다.
허기가 진 것 같아 가방을 뒤적여 동전을 꺼내고 무작정 근처 노점에 줄을 선다. 삶의 그 어느 때보다 미끈하고 가벼운 느낌이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어. 그는 가끔 기분이 좋을 때면 어떻게 좋은 기분이 되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곤 했다. 노점의 파라솔로 얼굴에는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고 그늘이 끊기는 허벅지 부근부터는 따뜻한 햇빛이 느껴진다. 손을 뻗거나 오른쪽 발에 힘을 실어 서면 해 쪽으로 걸어 나갈 수도 있다. 손가락 사이로 간질간질한 기분이 드는 게 누군가 언제라도 덥석 잡을 것만 같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정말로 어떤 남자가 그 자유로운 손을 잡아채는데, 선글라스를 껴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미소가 아름다워 키스하고 만다. 콜라? 맥주? 나는 화이트 와인으로 할래. 그는 계단에 앉아 남자가 건넨 담배를 말며 생각한다. 나를 버린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안돼, 기다리지 못할 거야, 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도착한 유치원에 종일반 친구들은 이미 집에 가고 난 뒤였고, 딸은 혼자서 엎드려 누워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따님이 기다리다 지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 게임도 실패했네요 하며 속으로 생각하겠지. 아 아이들은 너무 쉽게 죽고 말아.
이번 회차를 끝으로 <주간 묘사>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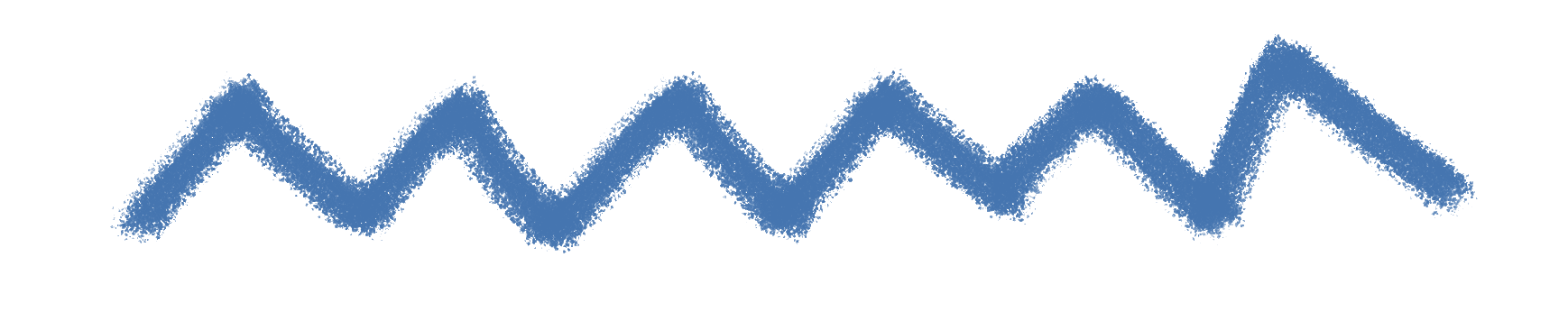

![잠든 척 [주간 묘사 제 43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3/1710854354777092.jpeg)
![엔지니어링 [주간 묘사 제 38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2/1707741366713689.jpeg)
![가급적, [주간 묘사 제 42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3/1710284655210995.jpeg)
![작가 인터뷰: 오동석 [주간 묘사 제 22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9/1695728143800965.jpeg)
![오늘의 기분 [주간 묘사 제 7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6/1686662995574941.jpeg)
![11월 [주간 묘사 제 27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11/1701073066835986.jpeg)
![거울 속의 상처 [주간 묘사 제 5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5/1685454593816303.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