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빤 내 아빠 아니잖아요.” 뜬금없는 딸의 말에 아내와 함께 긴장한다. 이제 4살 아이의 당찬 고백에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나 집 나갈꺼예요. 나 아빠 찾아나갈 거야.”
고작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주지 않는다고 내 아빠가 아니라니. 이게 말이냐. 기가차서 덤덤하게 내뱉었다. “알았다. 네가 정 그렇다면 찾아 가야지. 안녕. 짐은 잘 챙겨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엉엉 울면서 아빠하고 달려 나오는 그림을 상상했다. 하지만 역시 내 딸은 달랐다. 짐을 싼다. 어떤 짐을 싸는지 보니 어린이집 가방에 양말 2켤레, 속옷 2개를 집어넣고 집 현관문으로 향한다. 그리곤 문을 열 찰나 뒤돌아 나를 쳐다본다.
“이리 온나. 내가 네 아빠가 아니면 누가 네 아빠니. 과자는 못 주겠고 그래도 이리 와. 안아줄게.” 쪼꼬미 딸이 날 유심히 바라보며 쭈삣쭈삣 다가온다. 다가와 안기고 왕 하며 운다.
아빠의 삶이 다이내믹하다. 아빠가 된다는 건 그저 쉬운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빠란 이름이 주어지기까지 11년이 걸렸다. 11년간 아이가 없이 지내는 동안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름이 있었다. 카페 사장, 간사, 선생, 전도사, 목사까지. 나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름 중 내게 주어지지 않는 이름은 아빠였다.
중년의 나이에 아빠라는 찬란한 이름을 얻었는데 딸 아이가 아빠가 아니란다. 섭섭하다. 하지만 이내 딸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아이가 바라는 곳에 마음을 맞춘다.
두 아이를 입양하고 사는 삶은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다. 막내딸을 키울 땐 어렸을때부터 꼭 내 등에 업혀서만 잠을 청했다. 두세 시간 등에서 어르고 얼러 겨우 잠이 들면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을때면 딸의 등은 기똥찬 동작감지센서가 있는지 늘 깨곤했다. 내가 자는 건지 애가 자는 건지 헷갈리는 시간을 매일 살아야 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건 희망사항일뿐 현실을 살아가며 한계를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딸는 아빠가 아니라고 했지만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았다. 오랜 시간 첫째는 항상 내게 물었다. “아빠 나 안 버릴꺼지요?” 그럴때마다 “아빠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아빠는 너를 버리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보호하는 사람이란다.” 라며 토닥거리면 안아주었다. 사실 내가 생각해도 멋진 말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어디 사람 버릴 인간으로 보는지 성질이 나기도 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아이들은 아빠가 아니라는둥, 버릴꺼지요란 물음은 더 이상 하진 않는다. 훌쩍 커 버린(그래봤자 아직 초등학생일뿐이지만)아이들에게 그때의 질문들이 생각나는지 물어봤다. 기억도 못하더라.
문득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자신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한다. 어디서 이런 생각이 왔는지 아직도 지속되는지 난 알 길이 없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마저 품어야 하고 가감 없이 이야기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성경에 ‘사랑은 오래참고’라는 말이 있다. 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향해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말이다. 내게 사랑은 늘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 오래 참야 할 이유가 있냐고 질문을 바꾼다면 그 이유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난 참고 견뎌낼 수 있다고 말이다.
사랑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보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시작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본다. 두 아이의 눈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아빠란 무게감이 있는 이름이다. 아빠가 되기 전 아빠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지 몰랐다. 무겁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무게감을 가볍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아빠가 되면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내 몸도 무거워졌다. 딸은 무거워진 나에게 쏙 달려와 처진 뱃살을 조물락거리며 말한다 “아빠 난 말랑이(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어린이 장난감)가 참 좋아요. 아빤 내 말랑이예요.”라며 내 눈을 쳐다본다.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없다. 세상에 내 자녀만큼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관계는 없다. 아빠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난 아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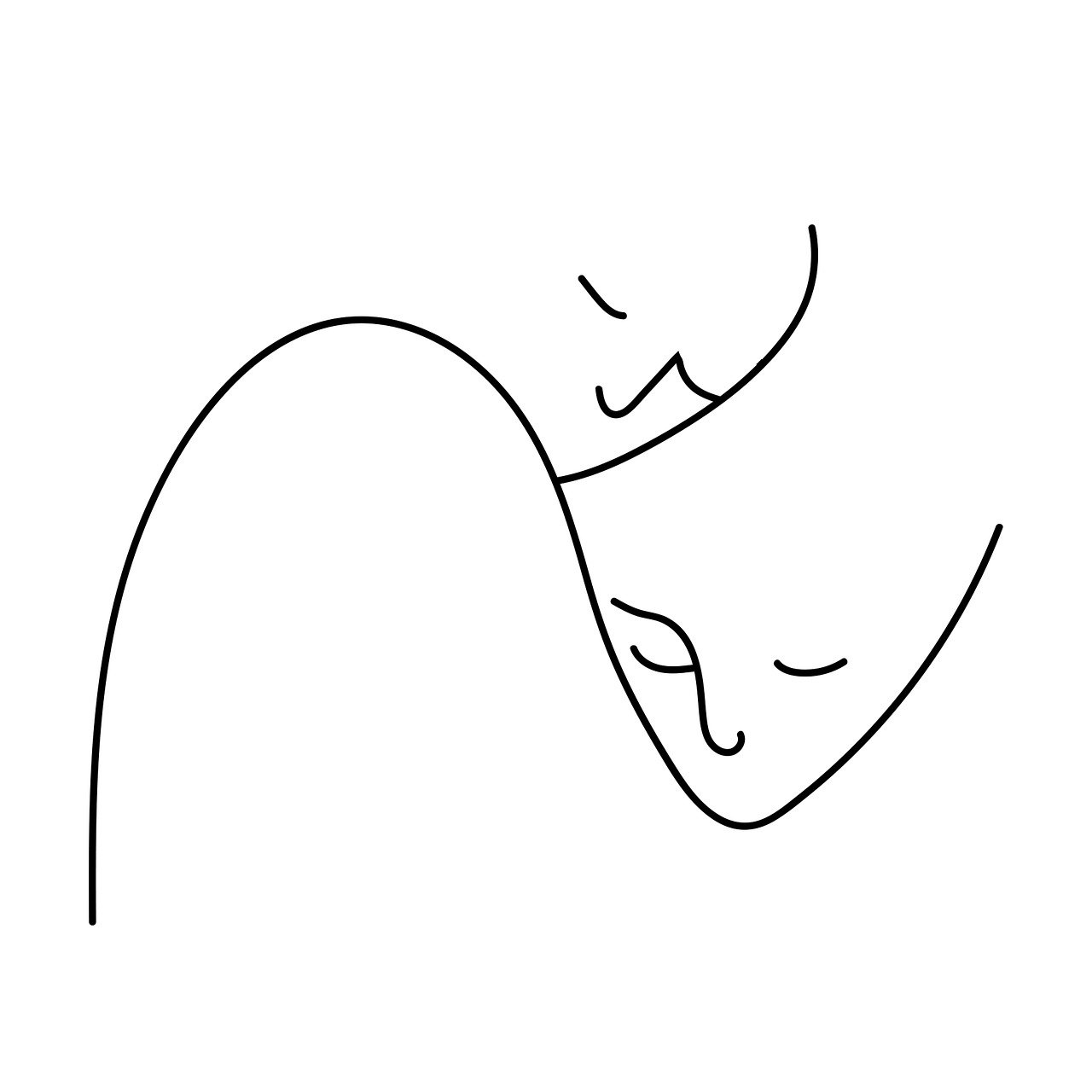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려산소통
“사랑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보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서 시작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가슴을 쿵 칩니다. 계속 계속 읽고 싶고 더 듣고 싶어 기다려지는 글이에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빌
가슴으로 낳은 세 살배기 아들을 재우던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어찌나 안 자려고 하는지, 그리고 외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라 잠이 깨어 울던지... 아빠라는 이름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알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