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점’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다. 정확히는 텍스트가 아닌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점’이라는 단어로 형상화되어 계속 따라오는 듯하다. 어쩌면 이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 둔 그림책의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좋아하는 그림책을 고르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나의 인생 그림책 두 권은 그렇게 ‘점’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책은 ‘문장부호’라는 그림책이다. 이 책은 출간되기 전부터 SNS를 통해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우연한 경로로 알게 된 작가의 SNS에는 그녀의 일상이 꾸준히 올라왔다. 점묘법으로 그린 세밀화만큼이나 촘촘한 그녀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다. 작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예술가의 삶이 반영되는 듯하다.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알아서인지 그림책이 완성되었을 때 내 일처럼 기뻤던 기억이 난다.
제목만 보면 왠지 지식 그림책 같고, 그림을 보면 생태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 번 볼수록 철학이 가득 담겨 있다. 그림책은 아주 작은 씨앗이 톡 땅으로 떨어지면서 시작한다. 그 씨앗은 마침표로 보여 지고, 새싹은 쉼표가 되고, 느낌표로 자라서 물음표라는 꽃을 피운다. 그 사이 잎사귀에는 작은 알이 마침표가 되고, 꼬물꼬물 애벌레는 쉼표가 되고, 느낌표로 자란 번데기는 나비가 되어 아름다운 물음표를 보여준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림 속 숨겨진 문장 부호를 찾는 일이 그저 즐겁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질문처럼 느껴진다. 나는 지금 어떤 문장부호를 찍고 있을지, 내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장 부호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점묘법으로 그려진 그림 덕분이라 생각한다. 점이라는 하나의 작은 시작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그림들이 꼭 우리의 삶을 닮아 있는 듯하다. 가끔은 그 반복이 지루할 것이고, 가끔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형태가 드러나는 그림처럼 내 삶에서 드러날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수많은 날들이 하나씩 점을 찍는 과정과 참 닮았다.
첫 번째 책이 삶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면, 두 번째로 ‘점’을 떠오르게 하는 책은 ‘쨍아’라는 시 그림책이다. 시와 그림책의 만남이라니. “책은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돼야 한다.”는 카프카의 유명한 말이 이 그림책을 위해 쓰인 것 같았다. 그림으로 시의 감동이 더 구체화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뜰 앞에서 쨍아가 죽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림책은 사라져가는 쨍아의 죽음을 수많은 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색색의 점들이 모여 있다가 흩뿌려지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름답고도 슬픈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몽환적인 그림은 긴 여운으로 남아 죽음의 공포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떠오르게 한다. 어쩌면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스며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할머니의 기억처럼 말이다.
삶과 죽음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점’이라는 공통분모로 한 권의 그림책은 삶을, 또 다른 그림책은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권의 그림책을 아이들과 즐긴다면 복잡하지 않은 선으로 된 그림을 하나 출력해서 점으로 채워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다. 아이가 어리다면 풀 뚜껑처럼 조금 큰 물건을 활용해서 점을 찍는 것도 좋다. 그렇게 그림을 채워가다 보면 생각보다 애씀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다 완성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살아가는 일도, 사라지는 일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애쓰는 날들 만으로도 모든 날들이 괜찮을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채워진 날들이 쌓여 뿌듯한 순간을 만나게 할 것이고,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스며들어 남겨질 것이다.
- 글에 등장한 그림책-
< 문장 부호 / 난주 지음, 고래뱃속 출판사 >
< 쨍아 / 천정철 시, 이광익 그림, 창비 출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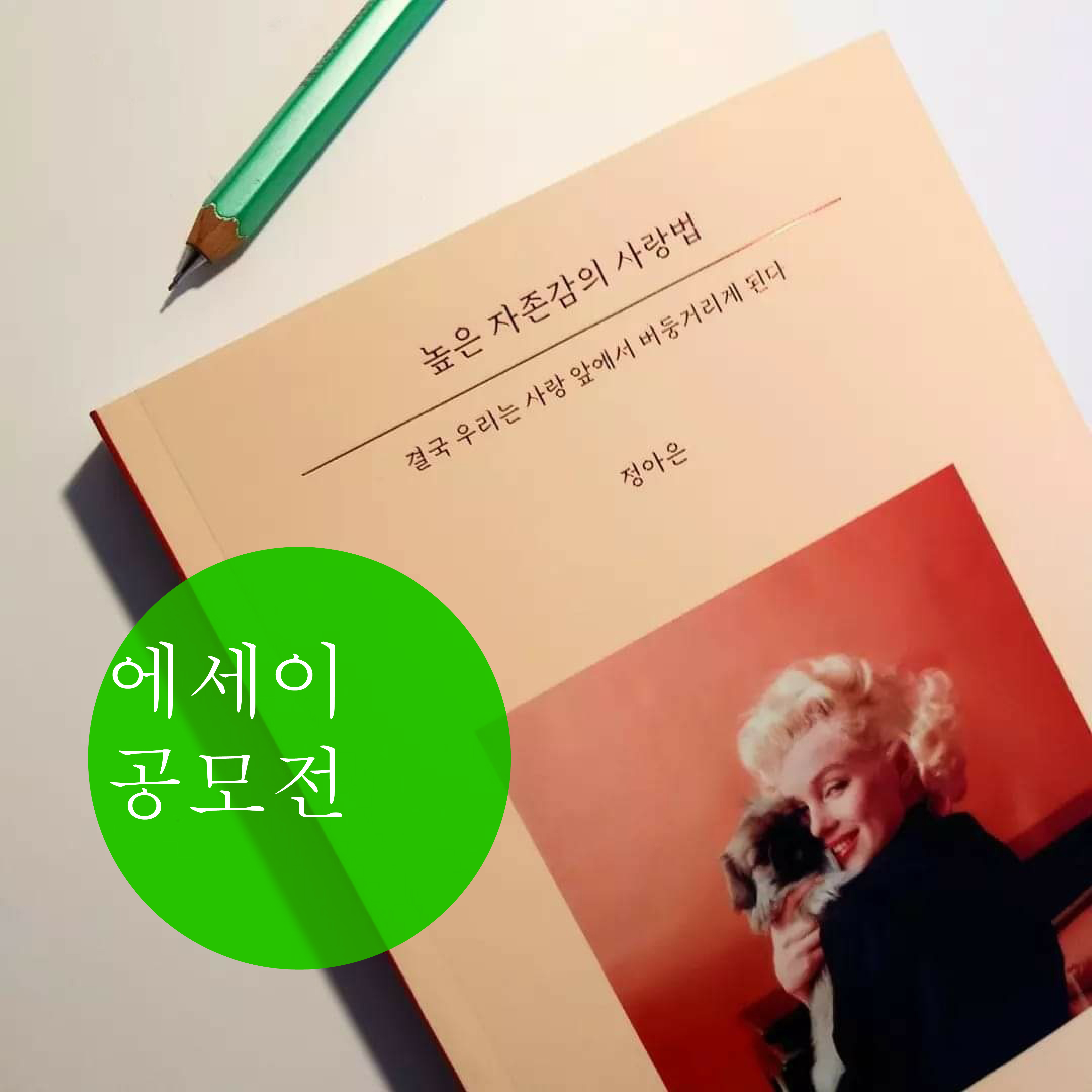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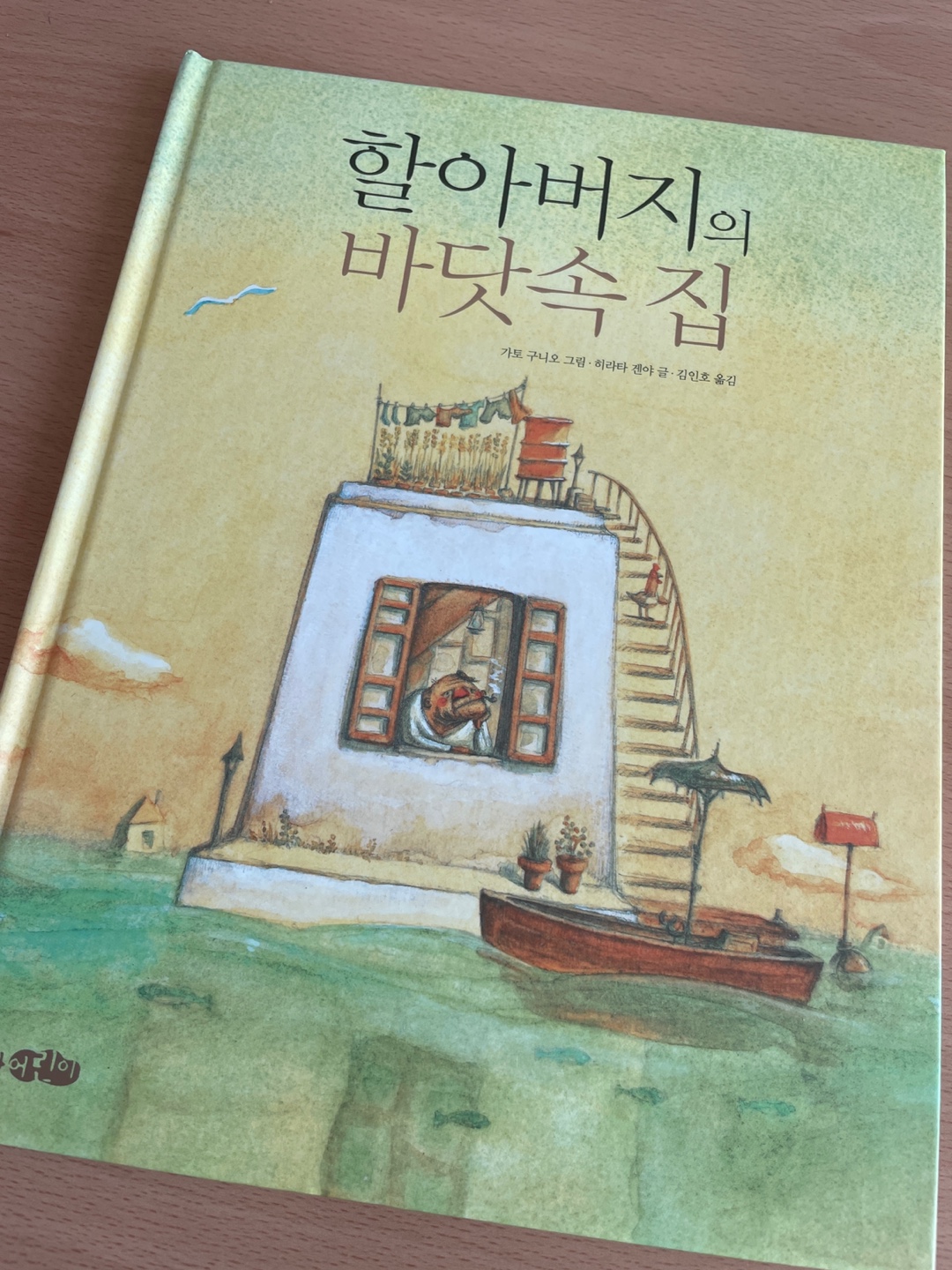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