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수신 시 '웹에서 보기'로 읽으시면 포맷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촘촘한 관찰력과 예리한 추론으로 사건들의 전모를 파헤치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는 그 스타일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었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긴 세월을 거치면서도 홈스의 유명세는 전혀 퇴색하지 않아, 누구던 아는 픽션의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시리즈들은 읽지 않았어도 읽은 것 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한편, 어릴때 봤던 요약본들 외에는 제대로 원작을 읽어본 적이 없어 사실상 모르는 책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책장을 들추기 전까지는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는 과학 수사에 대한 드라마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이 작품이 매력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니, 반신반의하던 우려와는 달리 단숨에 빨려 들어가듯 몰입할 수 있었고, 백이십 년 전 출간 당시 독자들이 열광했던 것과 동일한 매력을 지금의 독자도 마찬가지로 느낀다는 것, 세기를 거듭해도 여전히 스타일 자체가 장르인, 고전일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가 아서 코넌 도일과 바스커빌가의 개에 대한 간략 소개는↓
이야기는 셜록 홈스가 뒤를 전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등 뒤에 서있는 친구이자 동료 왓슨 박사에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손님이 두고 간 지팡이에서 뭘 추론할 수 있는지 다짜고짜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기척을 전혀 내지 않고 지팡이를 바라보다 친구의 질문에 화들짝 놀란 왓슨 박사가 뒤통수에 눈이 달렸냐고 반문하자 홈스는 자기 앞에 놓인 티포트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응수하죠. 이렇게 책의 첫 시작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셜록 홈스 이야기의 특징을 바로 보여줍니다. 홈스는 항상 레이더망을 가동한 채 남들보다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세밀한 추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왓슨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 이걸 따라가는 게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재미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죠.
셜록 홈스와 왓슨을 바로 등장시키며 시작하는 소설은 곧이어 그 지팡이의 주인인 의뢰인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데번셔에 위치한 오래된 바스커빌 가문의 저택에 살았던 찰스 경이 얼마 전 자신의 정원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했고, 공식적으로 심장마비라고 알려졌으나 찰스 경의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모티머 박사는 당시 주변에서 수상한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바스커빌 가문의 나쁜 전설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 고민 끝에 다음 상속자인 헨리 경을 저택에 들여도 될지 말지 결정을 위해 홈스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을 의뢰합니다.
바스커빌에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개에 대한 이야기는 가문 사람들뿐 아니라 그 동네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나쁜 일을 하면 마치 신의 심판을 받듯 무서운 사냥개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전설과도 같은 내용으로, 과거에 가문의 누군가가 바스커빌가의 저택 근처 황무지에서 그렇게 변을 당했다는 사실 역시 두고두고 함께 회자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황무지 어딘가에 그 개가 살고 있을 수 있으니 늘 조심하라는 지침도 대대로 함께 전해지죠. 얼마 전까지 그 저택에서 살았던 찰스 경의 급작스러운 사망 사건은 이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하인들까지 다음 상속자인 헨리 경을 걱정하게 합니다.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셜록 홈스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설이 실현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개입이 의심되는데, 그럼 대체 누가, 왜, 어떻게 찰스 경의 사망을 의도했을까요?

작가는 사건의 핵심을 볼 수 없게 이것저것 장애물들을 배치하지만, 동시에 이 실마리들은 결국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설을 하나하나 확인해 그 모든 추론들이 무용함을 알아내는 과정에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동참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면서 즐겁게 기대하게끔 합니다. 이쯤에서 저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고, 이 정도에서 반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렇게 독자는 딱 반 보 뒤에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모습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작가는 독자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맞춰 적절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상에 부흥하기도 하고, 때때로 실망과 반전을 선사하기도 하죠.
깜깜한 밤의 어둠에 의해 별빛이 돋보이듯, 이 소설의 명료함과 깔끔함, 그리고 속도감과 집중력 있게 이끌어 나가는 힘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부수적으로 배치한 장치들입니다. 이야기는 주변 인물들과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왓슨이 헨리 경과 함께 데번셔에서 지내며 남긴 관찰 일지를 따라가며 진행됩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정도로 기존 다른 작품들과 구별될 만큼 셜록 홈스가 직접 등장하는 분량이 적지만, 왓슨이 화자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 덕분에 오히려 후반부 셜록이 등장했을 때 극적 느낌이 배가되죠. 또한, 극의 배경이 되는 거대한 저택과 그 주변의 외진 황무지, 그리고 늪의 섬뜩함은 독자들의 관심을 오히려 더 사건에 몰입하게 만들고 마지막 범인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 긴장감을 한층 높입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 후반부 범인을 미리 알려준 상태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구성에서, 쉽고 분명하면서도 흥미를 잃게 하지 않는 작가의 능력이 더욱 드러난다고 느꼈어요.
오래된 작품이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추리소설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던 것 외에도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작품의 꽤 쏠쏠한 흥미 요소였습니다. 지금의 택시처럼 마차에도 번호가 있고 그걸 추적해서 마부까지 알아낼 수 있었으며, 통신과 교통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짐과 메시지들을 주고받을 수 있던 ‘지역 연락 사무소’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 등이 흥미로웠고, 사건 해결을 위해 호텔의 벨보이들에게 팁으로 1실링씩 주며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는 대목에서는 지금쯤이면 얼마에 해당하게 될지 추측해 보기도 하는 등의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글을 닫으며
꽤 오랜 시간 흥행을 하고 있는 탑건 매버릭을 며칠 전 관람했는데, 모든 장면, 대사들, 화면의 구도, 캐릭터 간의 갈등과 해소하는 방식까지, 옛날 80년대 감성의 영화 스타일을 촘촘하게, 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연출한 작품이라 무척 재미있게 봤습니다. 줄거리가 아닌, 연출 스타일에서 매력을 느껴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바스커빌가의 개’의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부 사항보다는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 자체가 핵심인, 스타일이 곧 장르와 정체성인 작품이었고, 아마도 그런 이유로 앞으로도 수 세기 동안 고전으로 남겠다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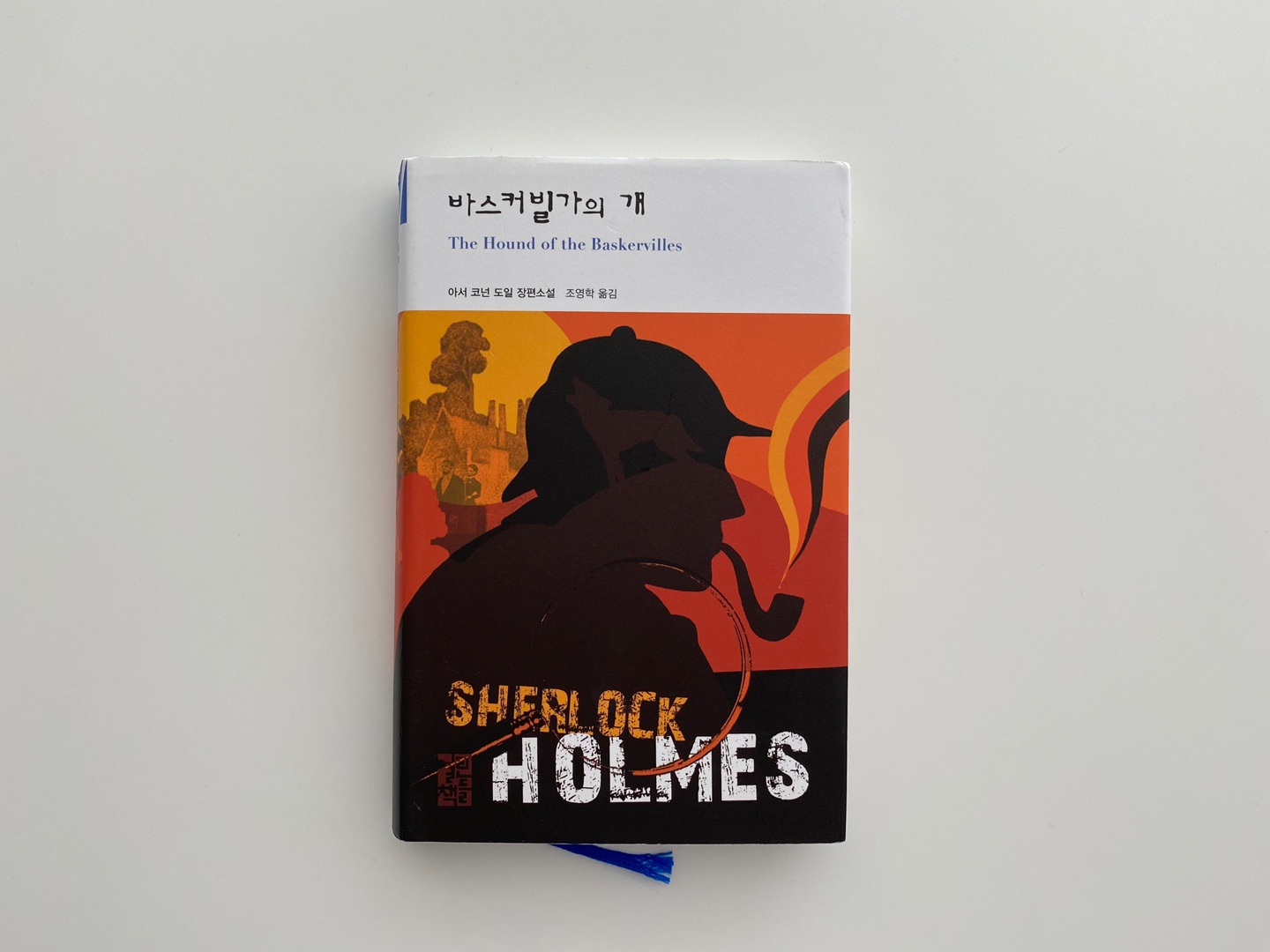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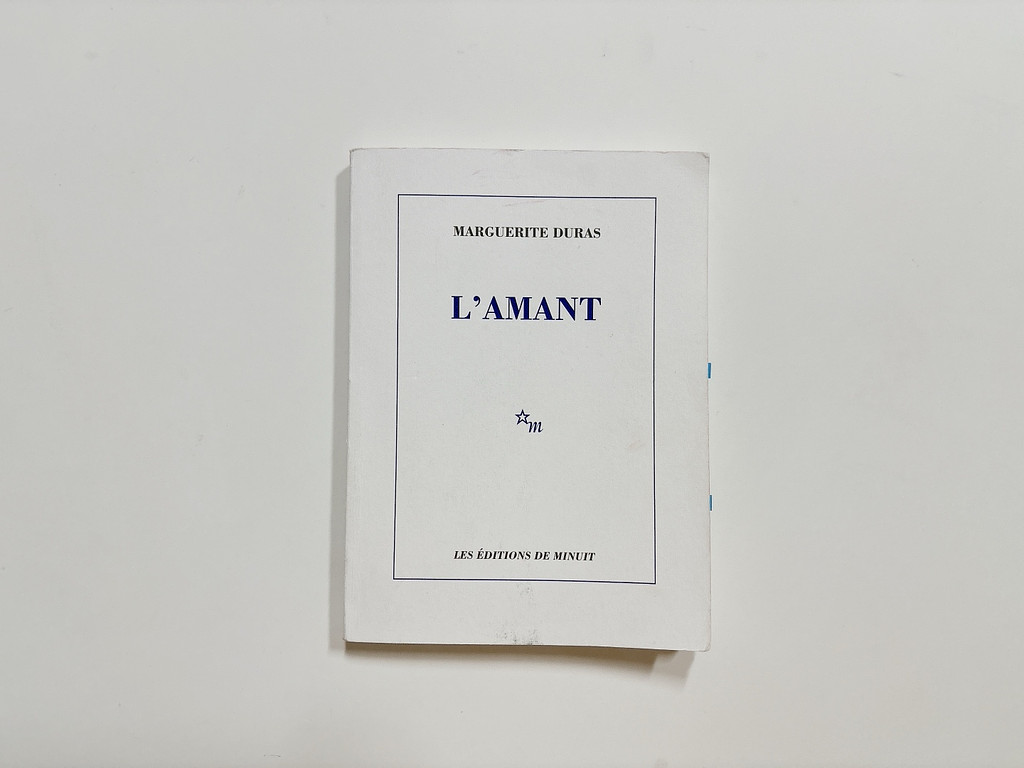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