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부터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스포츠 팀은 여자프로농구의 부천 하나원큐다. 거의 십 년 동안 (성적으로) 거지꼴을 못 면할 만큼 무너졌던 팀이다. 코칭스태프를 바꿔도 답이 없고, 선수들은 탈출할 생각만 하고, 외부에서는 기피 팀 1순위였다.
이랬던 팀이 작년부터 운영진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면서, 조금이나마 회생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워낙 경험 없는 미완성의 유망주만 넘쳐나서 뭐가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하루이틀에 바뀔 수 없으니 이번 시즌까지는 어렵고, 다음 시즌에나 뭔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예상보다 훨씬 빨리 터지고 있다. 고생하다 못해 다른 팀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1987년생 최고참 선수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다른 팀 가서 우승도 해봤으니 이제 폼 나게 은퇴할까 했는데, 좀 더 뛰어야겠단다. 루키 때부터 십 년 넘게 있었던 하나원큐가 너무 눈에 밟혀서 그냥은 두고 못 가겠더란다.
하나원큐 선수단은 요즘 전부 입이 귀에 걸렸다. 그 살벌한 경기 도중에 농담이 나오고, 감독은 경기에서 이기면 “너무 기분 좋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다. 아마도 큰 마이너스 이슈가 없는 한 이번 시즌에는 드디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암담무쌍한 시절부터 봐온 입장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팬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늘 말하고 다니지만, 결국 이런 게 팬심이구나 싶기도 하다.

12월 초에는 올해 첫 K리그 직관을 했다. 2부 리그 다이렉트 강등이 걸린 수원과 강원FC였다. 미루고 미루다 본 경기가 강등 싸움이 되다니, 그것도 흥미로웠다.
결국 수원이 강등됐고, 분위기는 시궁창이 됐다. 축구를 꽤 오래 봤지만 어떤 팀이 강등이 결정되는 순간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다. 휘슬이 울리는 순간 지쳐서가 아니라 맥이 풀려서 일제히 주저앉아버리는 선수들, 그 추운 날에 90분 내내 일사불란하게 응원가를 부르다가 충격으로 미동도 없어진 서포터들. 아, 이런 거였구나. 스포츠 팬, 특히 특정 팀의 오랜 팬이라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일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세상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 순간.
스포츠 산업의 핵심은 결국 낭만팔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런 잔혹함이 깔려 있다. 그게 농구든 축구든 이 생산적이지 않은 공놀이를 계속하게 하는 미덕이자 본질이다. 어느 쪽의 편도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구경이야말로 흥분되는 것이다. 소중하고 애틋하니까 뺏기고, 뺏겨서 몸서리치게 괴로워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빼앗아서 뭐하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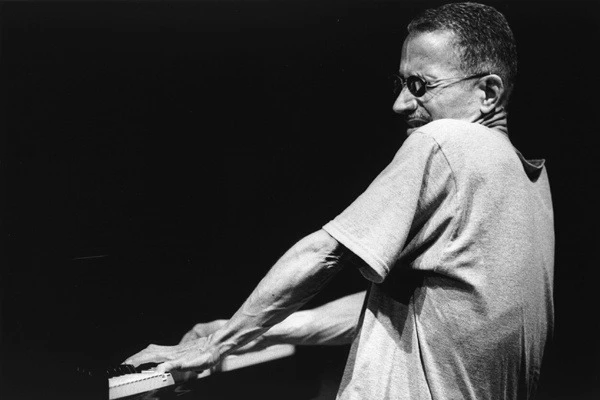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