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끄적이기

일상에 치여 파리우쟁에 소홀했다. 산티아고 순례를 마친지 벌써 두 달이 흘렀다. 파리생활 이야기가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마치고 싶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초기에 쓴 글과 지금의 글을 비교해보면 생생함이 덜하다. 기억을 되살려 쓰다보니 했던 일들을 나열하는 데 그쳐버린 것 같다. 길 위에서 나누었던 대화, 머리에 쥐가 나도록 해왔던 생각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유명한 작가들은 글쓰기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말한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가 쉬워서 달리는 게 아니듯 글쓰기가 쉽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모순이다.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류시화)" 나 역시 언론고시를 공부할 때부터 제일 못 하는 게 작문이었고, 제일 어려워 하기 싫었던 것도 에세이 과제였다. 그럼에도 작가도 아닌 내가 매일 일기를 쓰는 이유는 사라지는 순간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기록하지 않으면 휘발된다. 내놓기 부끄러운 글이더라도 파리우쟁을 시작한 이상 뭐라도 계속해서 끄적일 예정이다.
책장 넘기기

할 일이 많지만 수시로 책을 읽고 있다.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읽으니 일주일에 두 권이 부족할 정도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쌓여 있던 한국에서는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읽히더니 타지로 나오니 책 만한 재미가 없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느낄 수 없는 한국어만의 따뜻하고 정겨운 문장 조화가 특히 좋다.
영혼을 돌보기
일기 쓰기와 책 읽기, 이게 산티아고와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발화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있다.
영혼의 돌봄에는 명상이나 독서뿐 아니라 여행, 예술 활동, 자연과 가까워지는 일도 포함된다. 건강한 음식, 만족스러운 대화,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경험들도 영혼에 자양분을 선물한다. 또한 예술 감각을 갖는 것,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평범한 행위를 예술 감각으로 수행하는 것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좋은 지 나쁜 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800km를 걷고, 매일 건강한 순례자 메뉴를 먹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기대 이상의 대화를 주고 받았다. 당시엔 몰랐지만 걷기 전보다 지금의 내 영혼은 훨씬 아름다워졌다. 더불어 건강한 몸도 얻었다. 앞으로도 영혼을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발에 작은 문신을 새겼다.

33일차 39.39km
Arzúa Preguntoño A Peroxa Taberna Vella Calzada Calle Salceda Brea Santa Irena A Rúa Pedrouzo Amenal San Paio Labacolla Vilamaior San Marcos Monte do Gozo Santiago de Compostela

하나 둘 씩 산티아고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멋진 인증 사진을 보니 ’끝‘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반면 이대로 ‘끝’을 맺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어찌해야 할 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내게, 리옹은 하루에 20km씩 이틀을 걷자고 제안했다. 하루쯤 늦게 도착해도 나쁠 건 없었다. OK. 이어서 나도 하나 제안했다. “I want to finish this road with you.”

허나 역시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 오늘의 순례길에는 마땅한 숙소가 없었다. 거의 없기도 했지만 침대 수도 겨우 5개라서 모두 만실이었다. 부킹닷컴을 뒤져봐도 100유로 이하의 방은 모두 ‘full booked.’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미 오후 5시였다.

주변 숙소를 샅샅이 검색한 끝에 겨우 60유로짜리 2인실 방을 찾았다. 리옹이 믿을 만 한 친구라 같은 방을 쓰는 건 괜찮았는데 문제는 위치였다. 지금까지 걸은 20km 만큼을, 앞으로 더 걸어야 하는 곳. 즉, 목적지인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 초입에 있는 숙소였다. 오늘 40km를 다 걷게 될 줄은 몰랐다. 새벽까지 걷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저녁 무렵 한적해진 길에서, 지난 순례 여정을 돌이켜보았다.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들에 늘 리옹이 있었다. 순례 2일차, 물집에 좋다는 밴드를 건네줬다. 당시 거의 기어가다시피 걷던 나인데, 그런 나를 10m 앞 먼발치에서 기다려주었다. 걷다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순례 중반, 그의 거대한 가방에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담아 갖다주기도 했다. 담배가 똑 떨어졌을 때는 계속해서 서너 개씩 채워줬다. 자기가 없을 때 필 수 있게 일단 갖고 있으라고 했다. 거리를 두자고 했던 브루고스에서는 서프라이즈 선물이 있다면서 기대하라더니 다 도착해서 와인을 꺼내 줬다. 다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바람에 같이 마시지도 못 했다. 흠, 열거하자니 끝이 없겠다.
함께 걸으면서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다고, 같이 걸어주어 고맙다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던 중 리옹에게 레나와 마르코 부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바로 앞 마을에서 맥주 한 잔 하고 있었다. “어차피 오늘 순례 끝나는데 뭐!”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근사한 저녁을 먹었다. 1차로 맥주, 2차로 와인 한 병을 마시고 헤어졌다. 아직 갈 길은 10km도 넘게 남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놀았던 걸까, 다시 걷기 시작할 땐 이미 하늘이 어두웠다. 리옹은 “이걸 쓸 날이 올 줄 몰랐는데…“하며 헤드라이트를 꺼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에서 작은 헤드라이트 빛을 따라 걸었다. 리옹은 내 앞으로 랜턴을 비춰주며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다.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고마운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새벽 1시, 드디어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에 도착했다. 숙소까지는 30분 더 가야 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바가 있길래 들어가 쥬스를 하나를 시켰다. “이 시간까지 걷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시내에 왔으니 이제 라이트는 끄자.”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정말 걷기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말이지 순례의 끝장을 보고 있었다.
숙소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미리 알려준 번호키를 입력해 들어간 로비에는 카드키가 담긴 편지봉투가 놓여 있었다. ‘Woojung ko’ 내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 딱 남아 있었다. 우리보다 늦게 체크인하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지. 오늘의 마지막 담배를 피고, 방에 들어가 씻자마자 쓰러져 잠에 들었다. 1km, 10분만 더 가면 산티아고 대성당을 볼 수 있다. 비로로 순례가 끝난다.
마지막 날, 34일차
Santiago de Compost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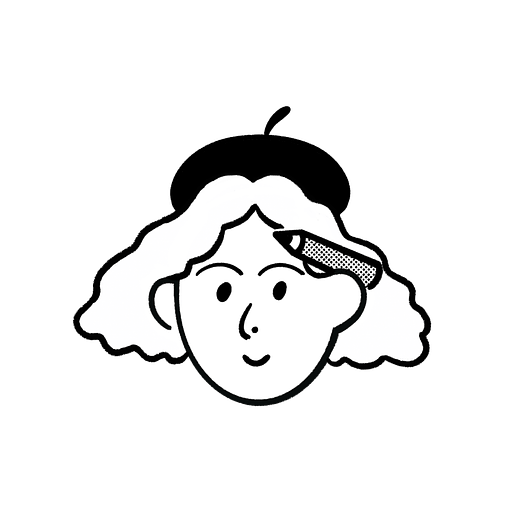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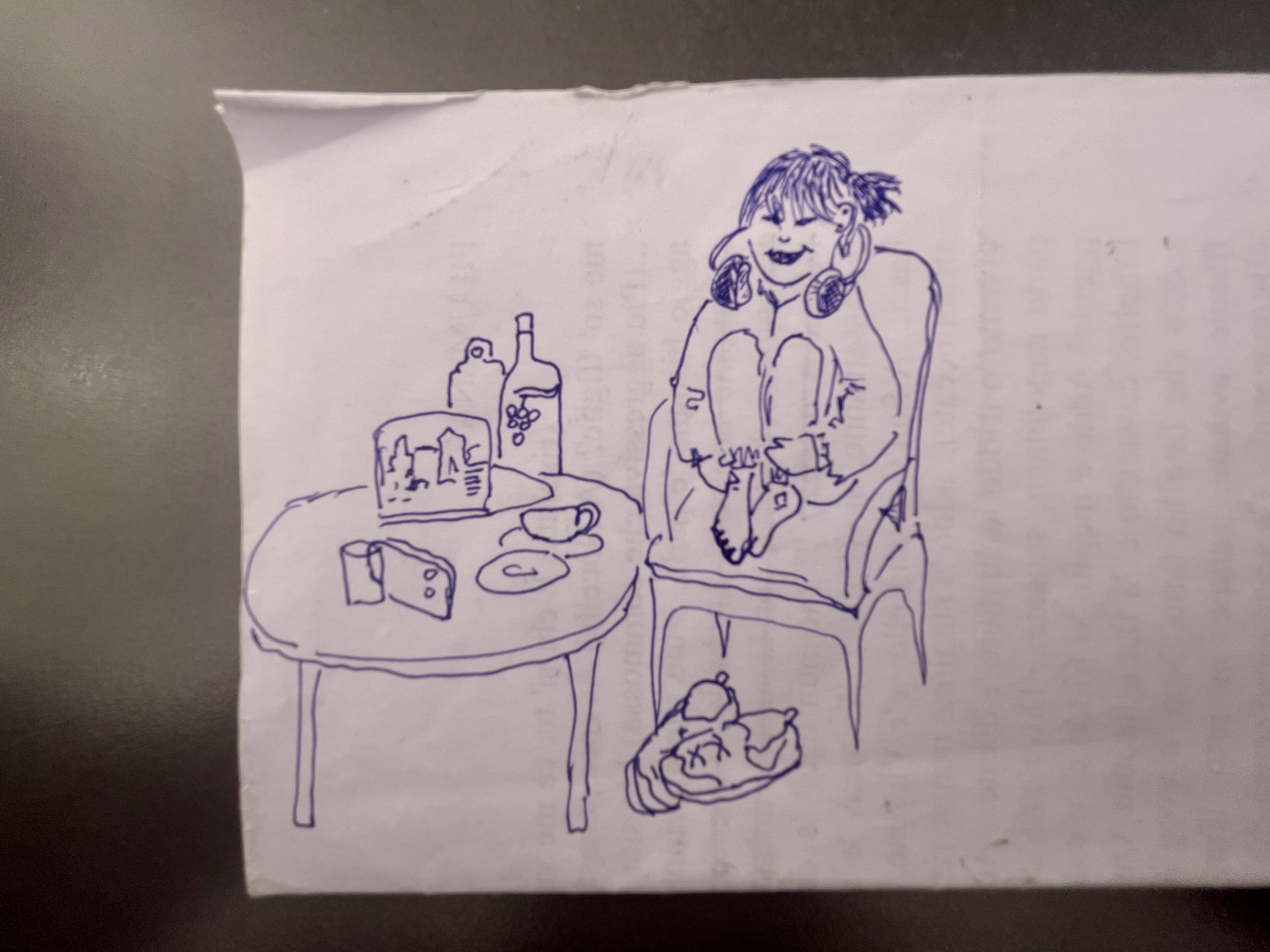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