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수시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Q : 발은 좀 어때?
A :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 걸을 만 해.

600km 걸었을 무렵,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통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하루에 40km까지도 거뜬히 걸어내고 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발바닥부터 종아리, 골반, 허리, 어깨...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국이었다면 진작에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겠지만 여긴 산티아고니까. 잔뜩 부은 발을 신발에 꾸겨넣고 어김없이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번거롭지만 발가락 사이에 바세린을 덕지덕지 바르고, 그 위에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두꺼운 양말을 또 하나 신고...

Q : 잘 지내?
A : 불안하지만 지낼 만 해.
카톡으로 종종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 순례길을 걷고 있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파리생활을 시작해서도 무탈하게 잘 지낸다고 전할 수 있을까? 불어를 못 하는 내가 잘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발의 통증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걸었다.
계속 걸어서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삶은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도 통증도 내 삶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걸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누군가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설령 파리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걸을 작정이다. 걸을 수록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처럼, 조금 더 강해져 있기를 바라며. 아니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20일차 뒷 이야기


차가 내 휴대폰 깔고 뭉갤 뻔 함.
지난날 못 걸은 거리를 만회하고자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다.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머지 않아 해는 뜨거워졌다. 역시 스페인.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마침내 도착한 한 마을에서 1시간 정도 꽤 오래 머물렀다. 그늘 하나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길을 너무 오래 걸었나보다. 더위를 먹은 듯 힘이 없었다.
마르티니를 원샷하고 또띠아를 먹는 도중 많은 한국인을 만났다. 한 분은 내게 “산티아고 여러 번 오신 분 같아요”라고 칭찬?을 해주셨다. 작은 가방을 들고 다녀서 종종 듣는 말이다. 한편 내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인스타툰 작가셨다. 현재 인스타에서 연재되는 중인데, 내가 걸은 일정과 비슷해서 그분의 산티아고 여정을 염탐하는 재미가 솔솔했다.
산티아고를 걷는 이들은 모두 자기만의 매력을 갖고 있다. 뒷모습만 보면 구멍 뚫린 양말과 싸구려 슬리퍼를 데롱데롱 가방에 매고, 허름한 차림으로 걷는 순례자일 뿐이다. 하지만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군데 군데 자기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와인을 들고 다니는 나처럼. 이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화려했다. 닮고 싶은 색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너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힘들 정도로 알록달록했다.

León까지 10km를 남기고 더는 못 걷겠다 싶어 Puente Villarente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체크인을 했다. 시간은 저녁 7시.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않은 채, 맥주 한 잔 시키고 앉아 일기를 썼다. 혼자 오래 걷다보면 일기에 생각을 쏟아내고 싶어 손이 근질거린다. 막상 앉아서 멍때리기 일수지만 일단은 아이패드를 켠다. 허공을 보며 생각에 잠긴 찰나에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조셉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표정이셨다. 어느새 내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셨고, 대화는 어찌나 재밌던지 2시간이나 흘러버렸다.
아부지같은 조셉 아저씨

파이프를 물고 계신 분이 Giuseppe(조셉)이다. 이 아저씨는 Intel 세일즈 파트에서 일하다 은퇴하셨다. 보통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을 만나면 하는 일, 걷게 된 이유, 내일의 목적지, 하루 평균 걷는 거리 등에 대해 얘기하지만, 조셉 아저씨랑은 조금 다른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왜 저녁을 안 먹어?”
“오렌지 하나랑 맥주 500L가 내 저녁이야.“
“너 너무 말랐어. 뭐라도 좀 먹어.”
“응? 살 더 빼고 싶은 걸?”
아저씨는 나를 장차 Korean top model이 될 애라고 놀렸다. ‘왜 이토록 마른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왜 와인을 물통에 담아 다니는가’, ‘왜 삶에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까지. 영어가 가능한 분이셔서 세대 차이, 동서양의 차이를 비교해보기도 하고, 나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조셉 아저씨를 세 번 정도 마주쳤다. 그 때마다 기특하다는 듯이 어깨나 머리를 톡톡 쳐 주셨다. Sairra에서는 물통에 와인이 있는지 확인하셨고, ???에서는 리옹을 보고 독일인 말고 이탈리아인을 만나라고 슬쩍 귓뜸해주셨다. 참고로 조셉아저씨는 로마에 사는 이탈리아인이다. 고작 2시간 수다로 이렇게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다니 산티아고길은 정말 신기하다.
21일차 19.79km
Puente Villarente Arcahueja Valdelafuente León Trobajo del Camino La Virgen del Camino

León 레온은 산티아고 길에서 세 번째로 들리게 되는 대도시다. 분명 "welcome to leon"이라는 사인을 본 것 같았는데, 도시의 중심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 만큼 큰 도시였다.
오전 10시. 레온 대성당 앞에서 리옹을 만났다. 멀쩡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었다. 이번에도 내가 대성당을 돌아보는 동안 성당 앞 카페에서 기다려주었다. 미안하고 또 고마운 리옹. 배낭을 리옹에게 맡기고 가벼운 차림으로 대성당을 들어섰다. 가방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그 홀가분함이란…!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배터리가 또르륵 꺼지고 말았다. 그래서 대성당 안에서 찍은 사진이 없다...

레온 대성당은 하늘을 향해 높게 솟은 스테인드글라스가 유명하다. 내부가 어두워서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예술이다. 알록달록한 색과 반복적인 패턴이 강렬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대성당이라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단체관람객이 많았다. 이곳 저곳에서 인증사진을 찍느라 편히 보기 힘들었다. 심지어 스페인어처럼 들리는 가이드의 설명이 소음처럼 느껴져 감동이 덜했다.
이전에 지나온 팜플로나와 브루고스 대도시에서는 볼 것, 즐길 것이 많아 이틀씩 머물렀다. 하지만 레온은 감흥이 덜했다. 밤새 울려퍼지는 도심의 술자리 소음이 싫었고, 이곳 알베르게에 자리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굳이 잘 만한 곳을 찾기도 귀찮았다. 다음 마을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일도 있잖아. 왜 그렇게 무리해?”
“늦은 시간까지 걷는 게 좋아서”
TO DO LIST - 쇼핑

도시에 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작은 마을에서는 팔지 않는 물건 사기.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신발이었다. 발이 아픈 그 즉시 사고 싶었지만 HOKA 브랜드를 어디서도 팔지 않아 레온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이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형광 노-란 색의 신발을, 180유로나 주고 샀다. 출혈이 컸지만 이후로 발이 아프지 않았으니 그거면 됐다. 심지어 빨래를 해도 다음 날 뽀송하게 잘 마르는 재질이라 300% 만족했다. 신발가게 옆 소품마켓에 들어가 우산을 구입하고, 타박에 들어가 담배도 두둑하게 샀다. 아, 든든해!
레온에 가면 타파스를 꼭 먹어야 해. 파이널 퀘스트.
스페인인 ‘베아’가 강력 추천했던 스페인 음식이 있었다. 그것은 "타파스". 스페인 사람이 추천하는 스페인 메뉴라니, 대단히 맛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품었다. 레온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사람이 가장 북적거리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타파스 메뉴가 있는지 물었다. "Do you have Tapas here?" “Yes we have.”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배낭을 주섬주섬 내려 놓고 화장실도 다녀왔다. 그리고 막 타파스를 시키려는데... 종업원은 타파스만 먹을 거면 바테이블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다. 허나 마침 바테이블에 빈 자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가방을 매고 다른 레스토랑을 찾아 나섰다.

문제는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이쯤되니 타파스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이렇게 먹기 힘든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람이 적은 레스토랑을 골라 들어갔다. 역시 ”타파스 주세요“하니 ”바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세요“라는 대답을 들었다. 리옹은 자기는 타파스를 먹지 않아도 되니 너 혼자 먹고 오라고 했다. 그는 상당히 지쳐보였다. 리옹을 혼자 두는 건 미안했지만, 타파스 맛보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혼자 바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타파스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타파스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타파스는 술을 주문하면 딸려오는 안주다. 정식 메뉴가 아니고 '공짜로 주는 안주'를 통칭한다. 공짜이므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없었다. 레스토랑마다 다른 타파스를 자랑하는데, 베아는 타파스바를 옮겨 다니면서 술과 안주를 즐겨보라는 뜻으로 추천한 거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A바에서 1차로 맥주 한 잔을 시키면, 딸려 나오는 샌드위치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다. 그런 뒤 건너편에 있는 B바로 옮겨 두 번째 맥주를 시키면, 이곳의 타파스 메뉴가 나온다. 그것은 햄버거. 아주 배가 부르지만 다시 C바에 가서 고기볶음이랑 맥주를 마신다. 이걸 다 합쳐도 15유로가 안 나온다.
나는 리옹에게 가서 타파스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그제서야 리옹과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우리 타파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찾아다녔던 거야..?“ ”응 이제 소원 풀었어. 이만 다음 마을로 가자.“
22일차 17.22km
La Virgen del Camino Valverde de la Virgen San Miguel del Camino Villadangos del Páramo San Martín del Camino


오늘은 거의 모든 마을에서 쉬어 갔다. 첫 번째 마을에서 커피를 마셨고, 다음 마을에서 맥주를, 그 다음 마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혼자 걷는 것 만큼 리옹과 같이 걷는 것도 즐거웠다. 바나나 한 쪽도 반으로 나눠먹고, 오렌지 하나도 반으로 나눠 먹으니 더 맛있는 느낌이랄까. 리옹도 기분이 좋았는지 걷다 말고 갑자기 속 마음을 꺼냈다. “I must say that I missed you so much and I think you are really nice person. I really like walking with you.” 이런 말은 친구 사이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응 나도”라고 답하고 하하 웃으며 어물쩡 넘어갔다. 나를 좋아한다는 뜻일까? 아니겠지 아무렴.

오후 2시, 싸고 좋은 알베르게를 발견하고는 들어가 체크인을 했다. 리옹의 컨디션을 고려해 17km만 걷게 되었다. 어제 퇴원한 애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참에 낮잠도 자고, 빨래도 하고, 저녁으로 성대한 순례자 메뉴도 먹었다.
순례자 메뉴는 세 가지 메뉴에 음료까지 포함된 코스요리다. 13유로밖에 안 하지만 양이 많으므로 정말 배고플 때만 주문한다. 한 번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들로 시켰다가 배가 터지는 줄 알았다. 식전음식으로 파스타 한 그릇, 메인음식으로 스테이크 한 그릇, 디저트로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음료로 맥주. 가뜩이나 1일 1식중인데 이렇게 먹으면 위가 놀란다.
아무튼, 리옹과 나는 밥을 먹으면서 내일의 목적지를 정했다. 22km 정도 거리의 Astorga까지 걷기로 합의하고 몇 시에 숙소를 나설지 얘기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고 싶은데, 같이 출발할 수 있겠어?”라고 내가 물었지만. 답은 당옇니 “NO”였다. 리옹은 유럽인답게 느즈막히 출발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내일은 따로 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빠이.
23일차 22.92km
San Martín del Camino Hospital de Órbigo and Puente de Orbigo San Justo de la Vega Astorga

오늘 순례길은 난코스다. 오르막 길을 3시간 정도 오르자, 쉼터가 보였다. 다양한 과일과 음료, 빵 등을 펼쳐져 있는 걸 보니,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다. 자유롭게 먹은 다음, 원하는 만큼 기부하는 곳이었다. 해먹에서 누워 낮잠을 잤다.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다. 기분이 좋아져 있는 잔돈을 모두 냈다.

잠자리가 어찌나 아늑하던지 리옹이 온 줄도 몰랐다. 자는 사이에 리옹은 나를 따라잡아 내 앞에서 “안뇽”하고 인사를 건넸다. 솔직히, 아침 일출을 보고 싶었다는 건 핑계였다. 리옹이랑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보니 왠지 모르게 신경쓰이고 불편해서 다시 혼자가 되고 싶었다. 이 쉼터에서도 나를 기다리려는 리옹을 먼저 가라고 보냈다. 리옹은 이제 내가 혼자 걷길 원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지상낙원에서 프랑스인 루이스, 스페인인 베아, 미국 텍사스인 콜린과 이런 저런 수다를 떨었다. 외국인을 만나 현지 이야기를 듣는 건 늘 신나는 일이다. 3시가 지날 무렵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곧 빗줄기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새까맣고 거대했다. 서둘러 목적지인 Astorga로 뛰다시피 걸었다.

도착하고 보니 리옹이 체크인을 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체크인 하면 될텐데 도대체 얼마나 기다린 것인가. 답답한 마음이 짜증으로 튀어나왔다. 같이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돌아와 내일의 목적지를 정하고 내일도 따로 출발하기로 했다.
‘Hospital de Órbigo and Puente de Orbigo’
이게 마을 이름이다. 겁나 길다
800km를 걷는 동안 수많은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그중 유독 ‘HOSPITAL(병원)’로 시작되는 마을의 이름이 가장 길고 외우기 어렵다. 왜 마을 이름에 ‘병원’이 들어갈까. 걸으면서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순례자를 위한 병원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중세 시대에 ‘순례’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다. 범죄도 많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HOKA 신발도 없으니 발 상태도 좋지 않았으리라. 한 마디로 인생을 걸고 걷는 고난의 길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순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병원을 세워 그들을 보살폈다고 한다. 멋진 동네였잖아!
이제 병원은 사라졌지만, 순례자들을 배려하는 숭고한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음식을 나누는 기부 쉼터(지상낙원)와 기부로 운영되는 공립알베르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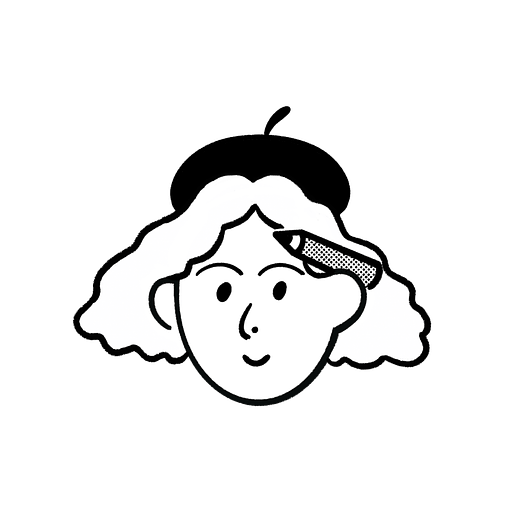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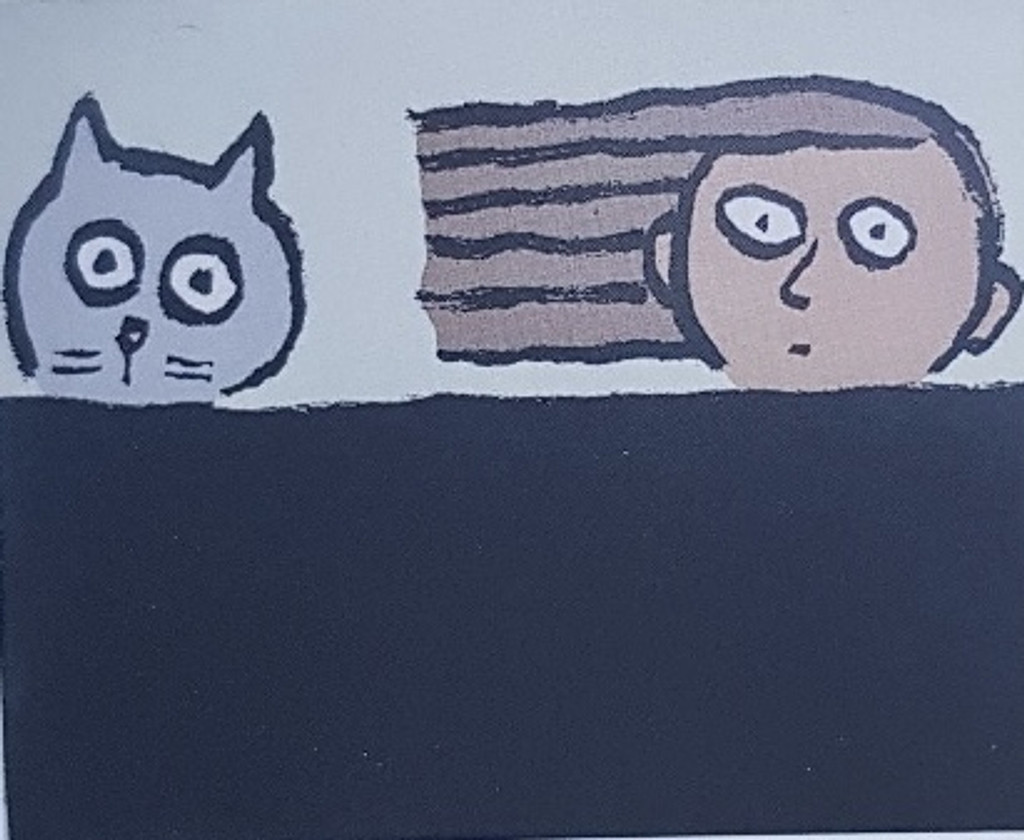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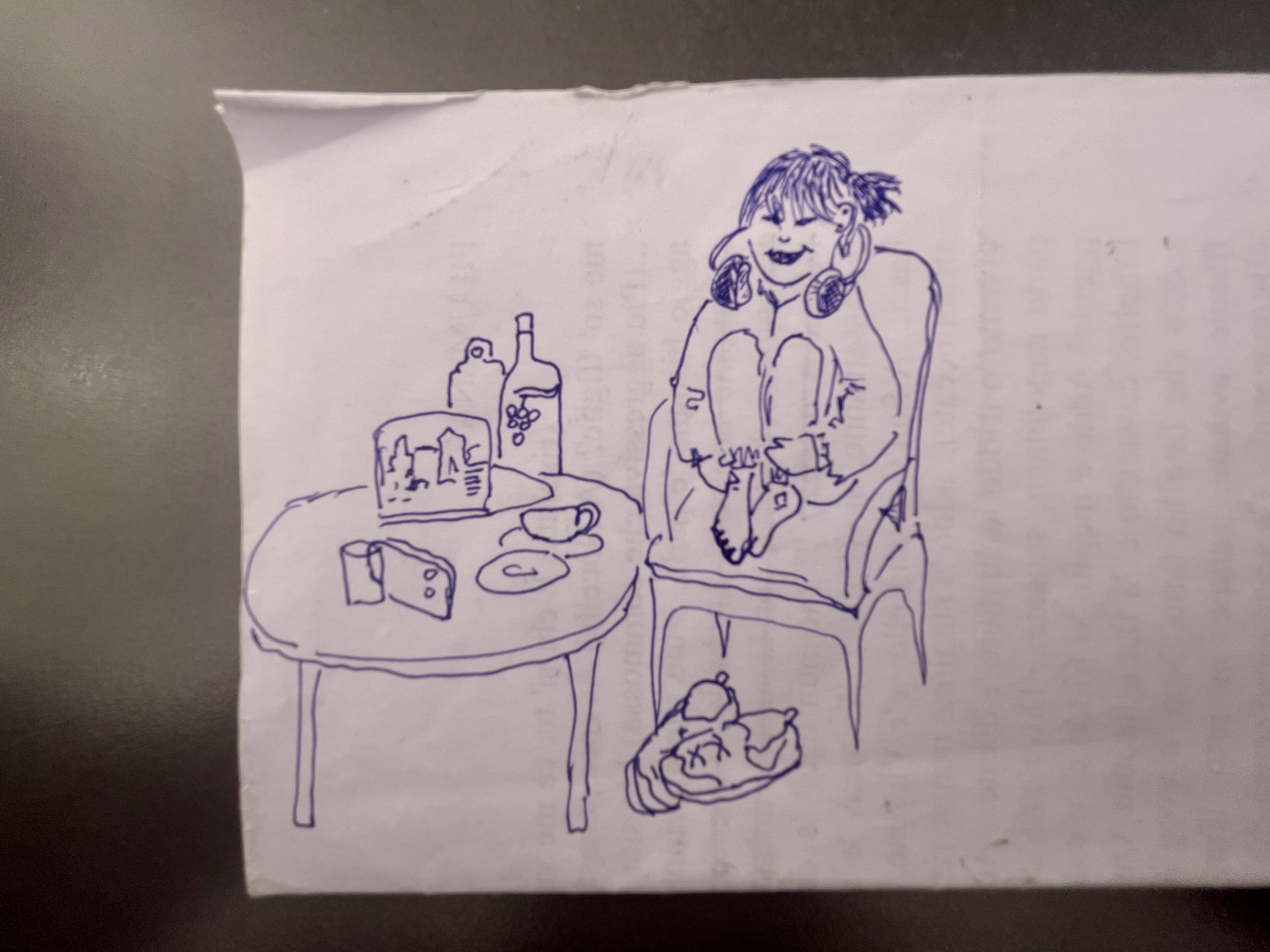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