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km 비석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었다. 각종 언어로 쓰여진 낙서를 제외하면 더 크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았다. 여느 때처럼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홀로 사진을 찍었다. 비석의 숫자는 백 단위에서 십 단위로 떨어지면서, 앞자리가 수시로 바뀌었다. 체감상 남은 거리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았다. 행복이 끝나 가는 것 같아 애써 비석을 외면하며 걸었다.

쁘띠 세레모니

비석 위에는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다.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알려주실 때까진 사람들이 재미삼아 쌓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 순례 막바지인 요즘은 길 위에 눈에 띄는 돌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고 “아고고” 소리를 내며 허리를 숙인다. 작고 둥근 돌을 손에 움켜쥐며 아끼는 친구와 가족들을 떠올린다. 그들을 위한 마음을 돌에 담는 것이다. 다음 비석이 나올 때까지 돌은 나와 함께 걷는다. 더 긴 거리를, 더 오랫동안 갖고 있을수록 기도는 강해지는 듯 했다. 다음 비석에서 마침내 돌을 올릴 때는 기도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속삭인다. “00야, 행복하자”, “00야, 건강하자.”
순례길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주변인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들에게 고마운 것, 미안한 것, 서운한 것, 추억이 되었던 날들 사이에 내가 존재했다.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100km 남았다. 매순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감사한 것들 투성이다.
30일차 남은 이야기

멋진 뷰를 앞에 두고 근사한 점심을 먹었다. 시간은 어느덧 3시. ‘배를 채웠으니 슬슬 걸어야지?’하고 시동을 걸었으나 십여분 만에 천둥소리가 울렸다. 어두워지는 하늘이 예사롭지 않았다. 태풍이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기부로 운영되는 쉼터를 발견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갔다. 입구에는 몇 가지 음식이 놓여 있었다. 파리가 마구 붙어 있어서 차마 먹을 순 없었지만 잠시 비를 피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곧이어 거센 바람에 의해 빗줄기는 옆으로 쏟아졌다. 한동안 앉아서 또 밀린 일기를 썼다. (사실 빗소리가 너무 거세서 일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얼마나 기다리면 이 비가 멈출까. 오늘도 일찍 도착하긴 글렀으나 저 비를 맞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쉼터에는 강아지 한 마리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태풍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던 두 시간 동안 나는 영어로, 그들은 스페인어로 열심히 얘기했다. 손짓, 몸짓도 뒤따랐다.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마음 한 켠이 포근했다.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다가 할머니를 따라 빗물을 닦고, 의자와 식탁을 정리했다. 할머니는 특히 작은 키에 주름이 많으셔서 부여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셀카 찍기 싫어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비 온 뒤 숲향은 한결 짙어졌다. 새소리, 바람에 풀잎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더 깊은 자연을 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 너머로 포트마린 마을이 보였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공립알베르게에서 체크인을 했다. 공립은 딱 나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미리 예약할 수 없어서 단체 순례자들은 거의 없고, 침대 수는 100개가 넘는다. 하루 10유로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단점도 확실하다. 시설이 다소 열악하다. 이날은 어떤 남자가 갑자기 여자 샤워실에 들어왔다. 샤워칸에 문이 없어서 샤워실에 들어오면 바로 모두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아직도 수건 없이 사는 중이라, 몸을 더 말렸다가는 그대로 노출될 뻔 했다. 언제나 그렇듯 열악한 상황에서 큰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나를 빗겨간다. 옷을 막 입은 상태여서 놀란 눈으로 "여기 여자 샤워실이야."라고 말해줬다. 남자분이 나보다 더 놀라는 걸 보니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다.
레나, 마르코 부부

씻고 나니 저녁 8시 30분, 리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 가도 되는 거야?” 그는 “Sure!” 이라며 바의 위치를 찍어줬다. 비를 맞아서 몸이 노곤했지만 알베르게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젊은 이탈리아인 친구들이 왁자지껄하게 피맥을 하고 있었다. 굶주린 배를 달랠 겸, 리옹에게 답장을 보냈다. ”I’m coming.“
바에는 리옹이 길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었다. 리나와 마르코, 독일어를 쓰는 오스트리아인 부부였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다. 농담도 유쾌했다. 산티아고 길을 걷는 부부들의 케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나도 결혼하게 된다면 저렇게 걸어야지!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누구도 우연히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 류시화
맛있는 '술'. 곁들여 나오는 공짜 안주 '타파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다음을 기약하며 짧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다.
31일차 25.39km
Portomarín San Roque Gonzar Castromaior Hospital da Cruz Ventas de Narón Ligonde Eirexe Portos Lestedo Os Valos Abenostre O Rosario Palas de Rei

일기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하다. 하루 일과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1) 체크아웃 후 간단히 스트레칭을 한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야 다치지 않는다. 2)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5km를 걷는다. 그쯤 마음에 드는 바에서 적당한 아침 메뉴로 허기를 채운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카푸치노는 필수다.

3) 다시 5km를 걷는다. 이 구간에서 보통 리옹을 만난다. 나보다 훨씬 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걸음이 빨라서 이때쯤 나를 따라잡는다. 4) 태양이 뜨거우므로 시원하게 낮술, 맥주를 마시고 5km를 걷는다. 5) 2시 경, 늦은 점심을 먹는다.

6) 배부른 상태로 5km를 걸으면 딱 20km를 채우게 된다. 보통 하루에 25km 걸으니까 목적지까지는 더 걸어야 한다.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든 법이다. 괜찮은 바에서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짠다. 7) 걸음은 초반보다 느려져서 저녁 6시가 다 되어 체크인을 한다. 8) 씻고, 빨래한 뒤 8시쯤 리옹이랑 저녁을 먹는다. 발 상태가 괜찮으면 소화시킬 겸 짧게 마을을 둘러본다. 그러다 마트가 보이면 쏜살같이 들어가 나는 와인을, 그는 물을 산다. 9) 각자 숙소로 돌아가 일기를 쓴다. 이렇게 오늘 하루일과가 끝난다. 10시를 넘기지 않는다.

32일차 28.11km
Palas de Rei San Xulián do Camiño Pontecampaña Casanova O Coto Leboreiro Furelos Melide Santa María de Melide Parabispo Boente Castañeda Ribadiso Arzúa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다. 1번부터 9번까지 동일한 루틴으로 걸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은 많았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없었다. 그래서 일기도 거의 비어있다. 산티아고 순례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름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는 내용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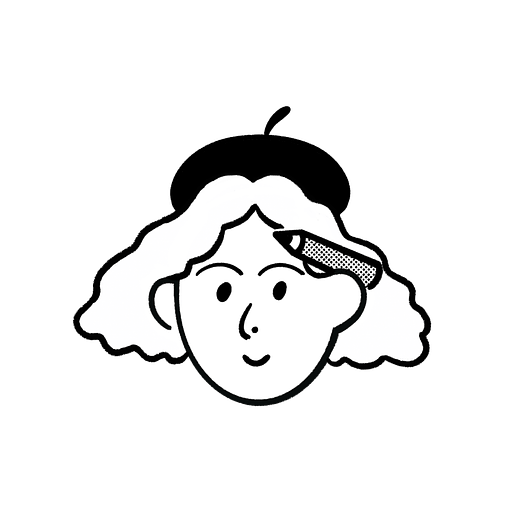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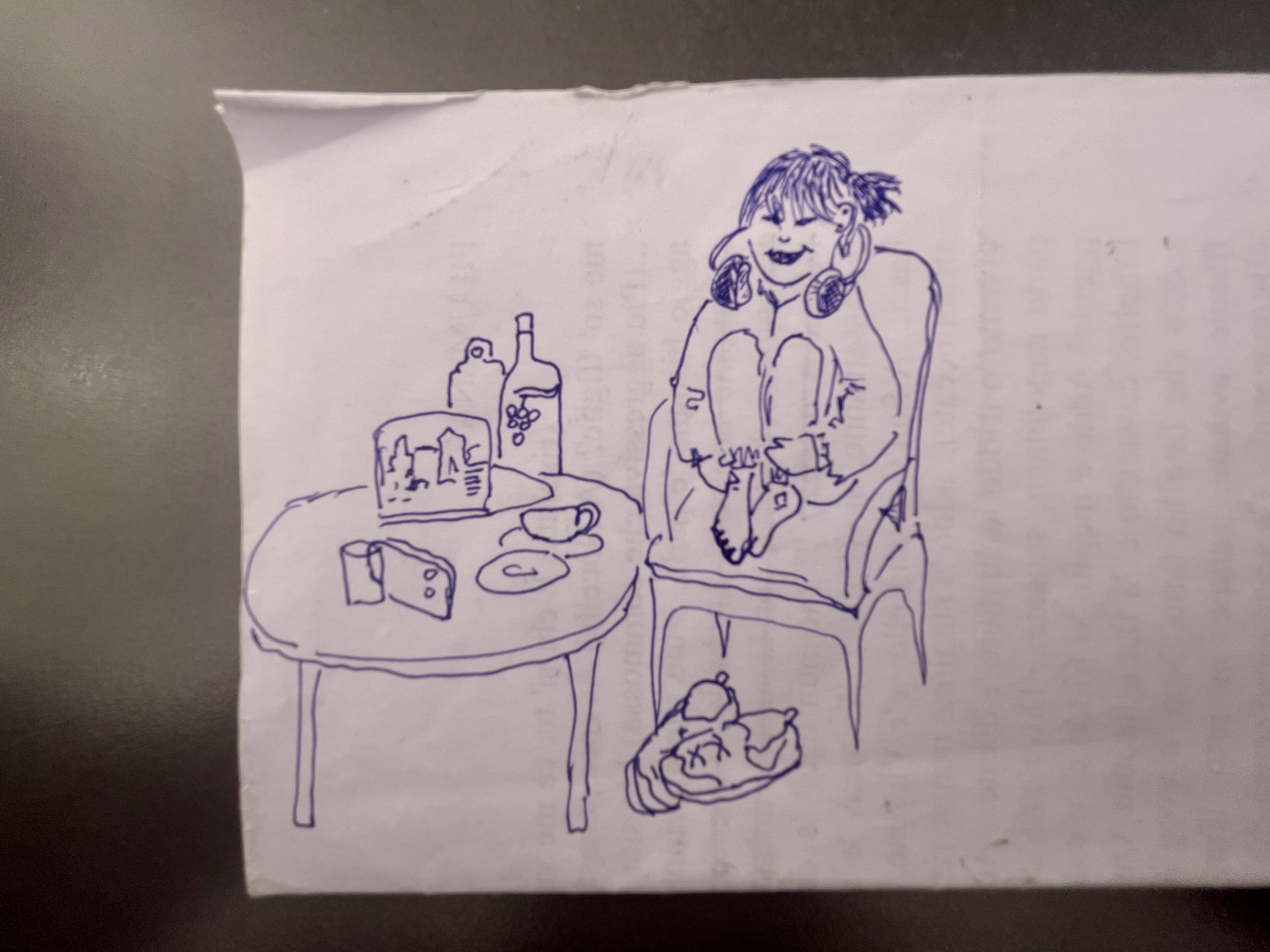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