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이야기

파리로 떠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이다. 너무 오랫동안 솔로로 지냈다. 쥐똥만하게 줄어든 연애세포를 깨우고 싶어서 한국을 떠났다. 헌데 예상보다 일찍 남자친구가 생겼다. 파리에 지내는 동안 다양한 나라의 많은 사람을 만나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일단 시작은 이 녀석이다.
그의 이름은 리옹. 독일인이다. 나보다 12살이나 어리다. 독일군으로, 의무병(파마씨)으로 일한다. 영어를 나보다 못 해서 어려운 문장을 구사해야 할 때면 구글번역기를 이용한다. 걷는 동안 독일어를 가르쳐주려고 시도했으나, 프랑스어가 아니라서 머리에 잘 입력되지 않았다. 내 평생에 독일 군인과, 그것도 띠동갑과 연애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이, 직업, 국가 뭐 하나 이상형과 맞는 게 없다.

그런데 어쩌다 만나게 된 거냐!? 그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걷기 시작한 2일 차 길에서 처음 만난 후부터 30일을 같이 걸었다. 파리우쟁에 담지 못한 수많은 에피소드와 추억들이 생겼다. 목적지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는 800km를 끝내고 밀려오는 감동을 같이 느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린 친구였다.
리옹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 행복을 신경써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산티아고까지 다 걸은 뒤 피에스타로 떠나는 날이었다. 내가 미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피에스타로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그는 가방을 들고 성당 밖에서 기다리던 참이었다. 다음 버스까지는 5시간이 비었다. 그동안 그는 미사를 기다려준 것처럼 코리안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고, 타투샵에서 타투를 받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챙겨주었다.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덜렁거리는 내 옆에서 정말 많은 걸 챙겨줬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Are you happy?“ 타투받은 발이 너무 아파서 표정이 안 좋았지만 나는 상당히 행복했다. ”완전!“ 그는 내 대답을 듣고 씩 웃었다. ‘내 행복이 네 행복이 될 수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피에스타까지 버스로 3시간. 우리는 버스에 나란히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어제 새벽까지 걸어서 둘 다 피곤했다. 연신 헤드뱅잉을 하다가 리옹에게 ”어깨 빌려도 되겠니?“라고 물었다. 그는 ”물론이지“라고 답하며 “higher? Lower?” 내가 편하도록 높낮이를 맞춰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아파왔다. 불편해 일어난 내게 그가 물었다. “higher?” “Yes.” 그는 허리를 굽혀 어깨를 내렸다. 낮춰달라는 건 줄 이해한 모양이었다. “no, no, higher!” 허리를 열심히 굽혀가며 어깨를 낮추다가 다시 올렸다. 귀엽고 고마웠다. 높아진 어깨에 기대어 다시 편히 잠들었다.

피에스타에 도착해 체크인을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을 깼다. 이제 걸을 거리가 없다는 게 어쩐지 허전하지만 늦잠 잘 수 있다는 여유를 만끽했다. 느즈막히 아침을 먹으며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 지 의논했다. 이날 나는 저녁 버스를 타고 떠나고, 리옹은 남는 일정이었다. 심지어 이때까지도 우린 그저 친구였다.
”피에스타까지 왔는데 지중해에서 수영 한 번쯤 해봐야하지 않을까?“ 서둘러 짐을 챙겨 해변으로 나갔다. 날씨는 좋았지만 지중해의 바다는 차가웠다.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그냥 숙소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자.” 숙소에는 따뜻한 물의 수영장이 하나 있었다. 그곳으로 잽싸게 옮겨 몸을 녹였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 속마음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나랑 걸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산티아고 도착했을 때 혼자가 아니어서 기뻤어.“ ”네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걷지 못 했을 거야.” 나는 어쩌면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잡았다. 그는 물속에 반쯤 앉은 채로, 나는 서 있는 채로, 손이 물에 불어서 쭈굴쭈굴해질 때까지 눈을 보며 한참동안 이야기 했다. 그리고 더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는 나를 들어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꼬옥 안아주면서 “네가 정말 좋아”라고 속삭였다. 나도 그에게 같은 말을 해주었다. “이제 나 너의 여자친구가 되는 건가?“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어. 너만 괜찮다면.” “음, 독일이랑 프랑스가 되게 먼데 잘 만날 수 있으려나.” 내가 먼저 물었지만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기엔 뭔가 애매했다.

산티아고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가 너머로 피에스타 바다가 보였다. 그 위로 지는 석양을 보면서 그대로 생각에 잠겼다. ‘이게 꿈은 아닐까, 비포선라이즈 영화 같은 로맨스 한 편을 찍었네. 우리도 결국 헤어지겠지? 진지한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두근거리네.‘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런가 진짜 삶을 사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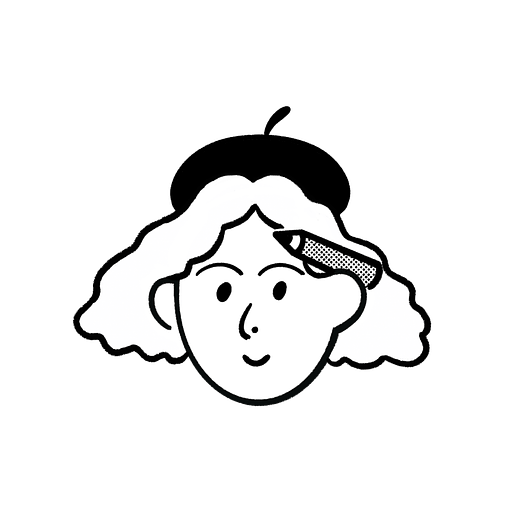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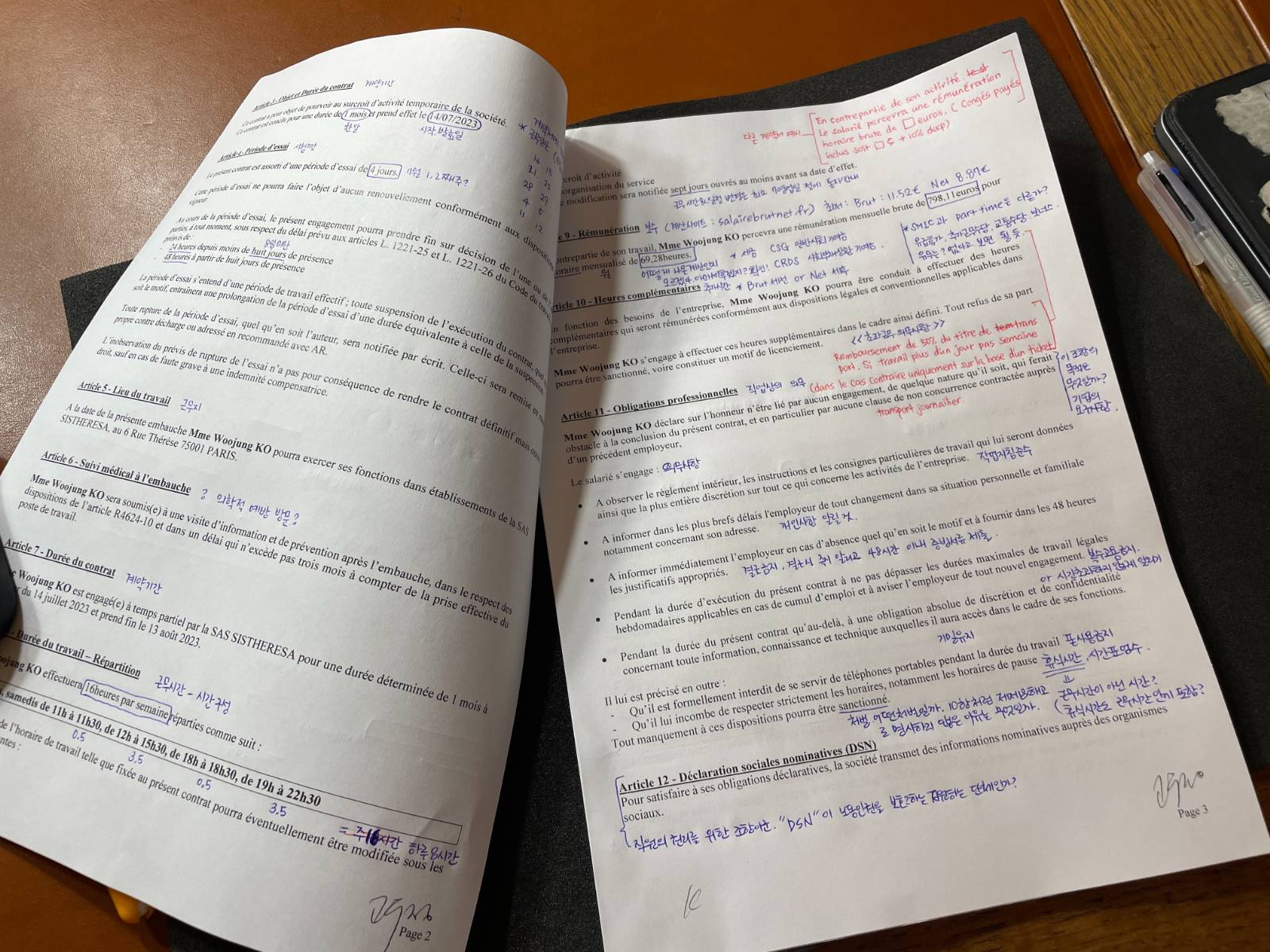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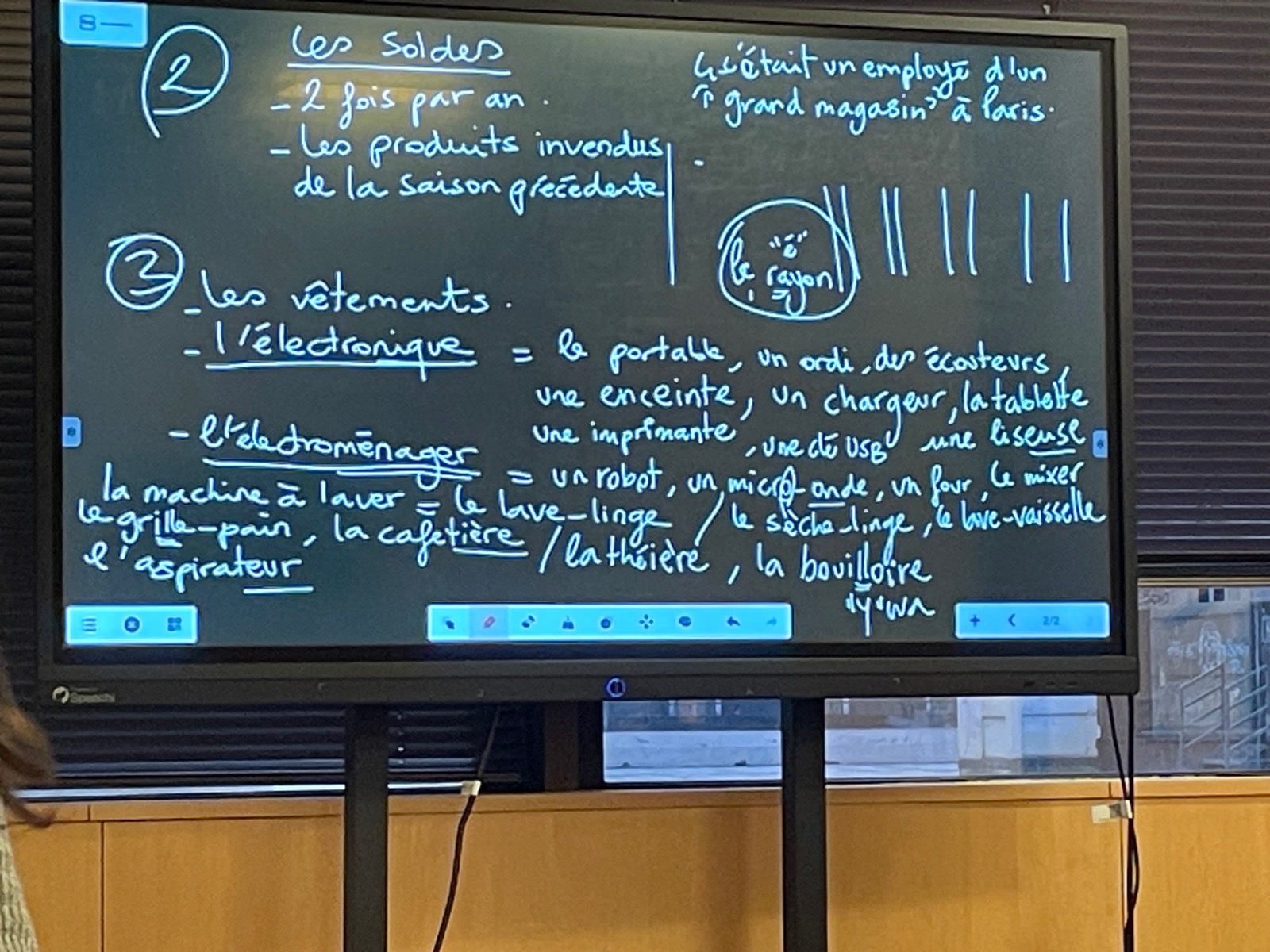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령
🥹🥹🥹너무 재밌다아!!!!
령
우정 밥도 잘 챙겨 먹고 사랑도 재밌게 잘 하구 후후🥳🥳
프란시스 다이어리
역시 연애 얘기가 재미지구만! EAT PRAY LOVE! 열심히 해볼게 고마웡! (댓글 아래에 답글 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ㅋㅋ)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