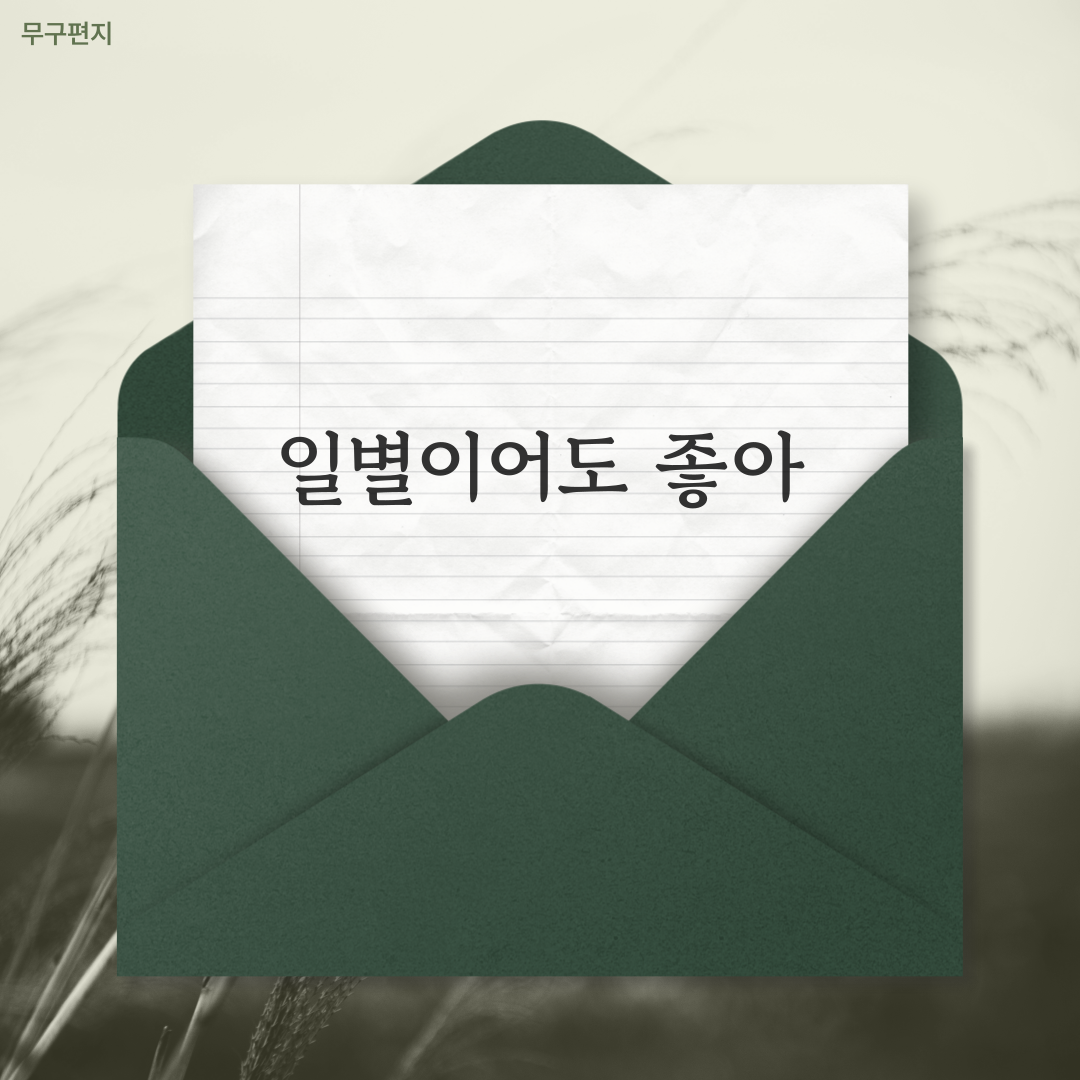
세상에는 어찌나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던지. 그만큼 사랑을 겪고 있거나, 겪었거나, 겪을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지요. 사랑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면 괜히 움츠러들고 자신 없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사랑에 대해 꽤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사랑이 무엇이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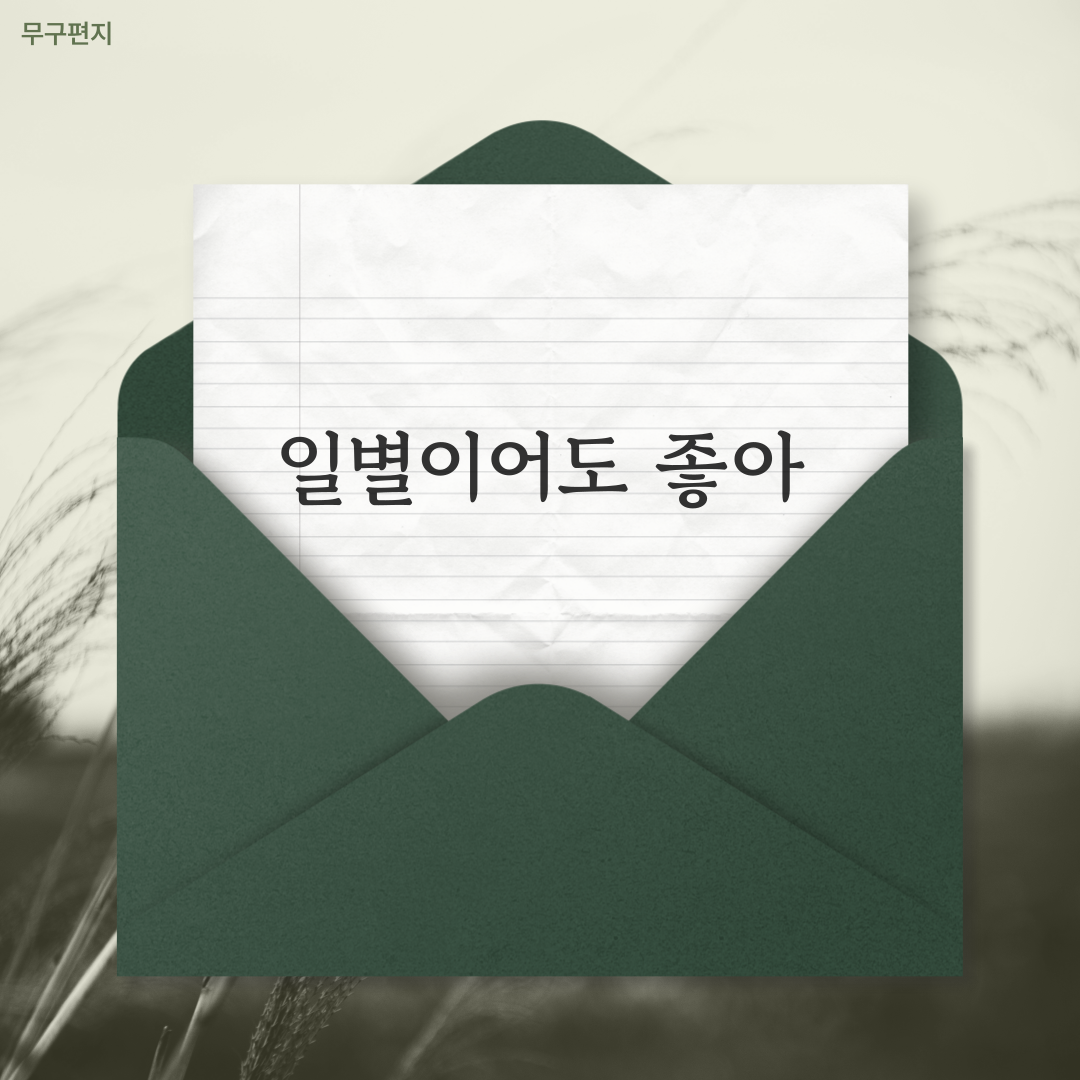
세상에는 어찌나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던지. 그만큼 사랑을 겪고 있거나, 겪었거나, 겪을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지요. 사랑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면 괜히 움츠러들고 자신 없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사랑에 대해 꽤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사랑이 무엇이라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오해하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입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별이어도 좋아] 알던 사람 이야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308hncacrx1jghidxsbvon3ds6t3)
[일별이어도 좋아] 알던 사람 이야기
편지를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편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쓰기도 좋지만, 받는 것은
일별이어도 좋아(멤버십)
| 멤버십![[일별이어도 좋아] 의도한 적 없는 이별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308hncacrx1jghidxsbvon3ds6t3)
[일별이어도 좋아] 의도한 적 없는 이별
이별을 의도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나? 일단 제목을 지어두고, 소개할 영화를 나열해 두고,
일별이어도 좋아(멤버십)
| 멤버십![[일별이어도 좋아] 좋은 어른을 만나는 행운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308hncacrx1jghidxsbvon3ds6t3)
[일별이어도 좋아] 좋은 어른을 만나는 행운
相識滿天下(상식만천하) 知心能幾人(지심능기인)
일별이어도 좋아(멤버십)
| 멤버십춤추는 거북이 무구가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