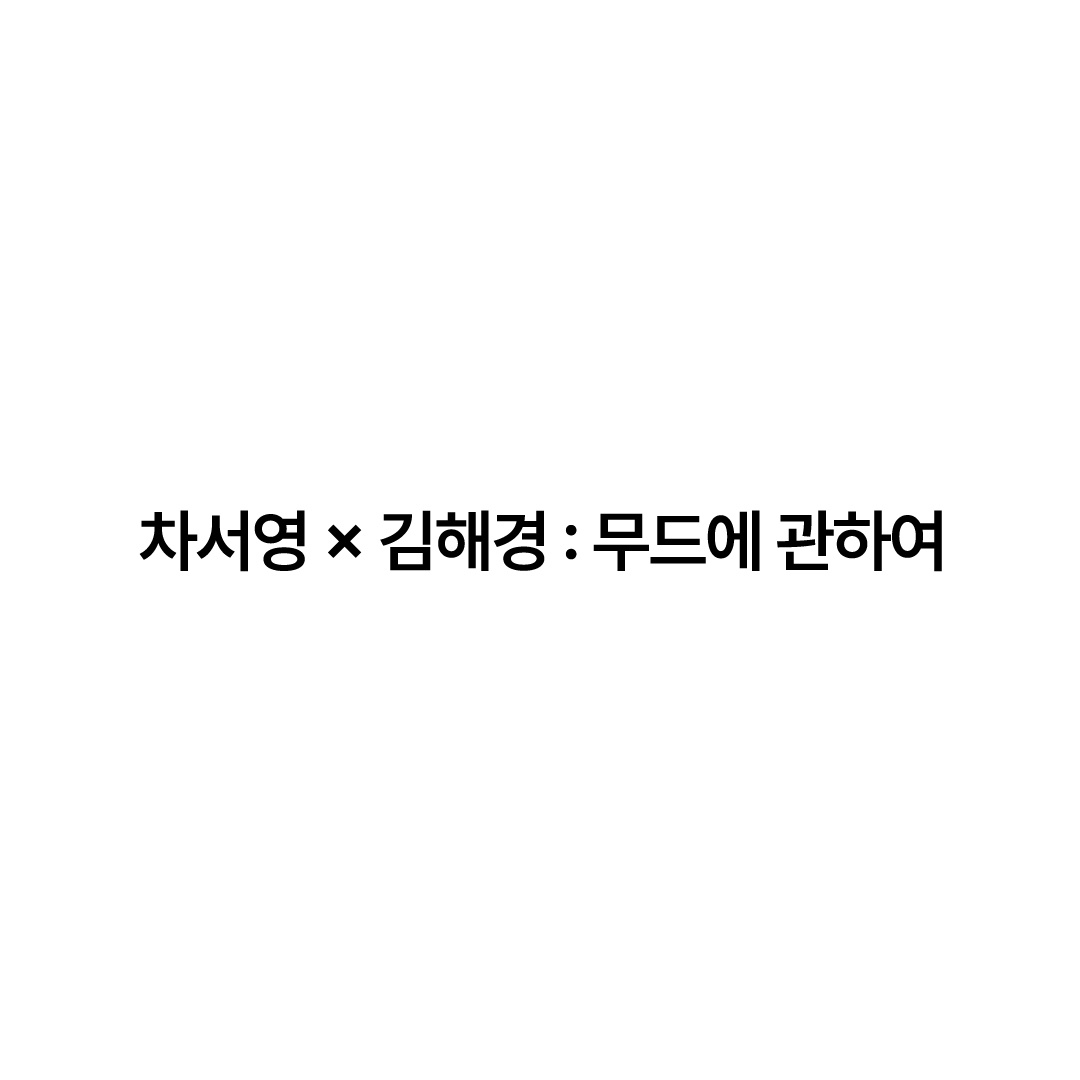
야간행 열차와 하늘과 오렌지

나에게 답이 있다면, 그 답을 꺼내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답이 없더라도, 죄 많은 손을 잡아줄 당신이 필요하구요. 당신이 나를 떠난 지 오래였어도, 나는 언젠가 당신에게 내렸던 뿌리의 흔적으로 여전히 숨 쉬고 목 축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내 눈 앞에 나타난들, 눈 멀어버린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럴 테지만 그리움도 외로움도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했던 나의 말을 기억하나요?
병을 앓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회복이란 말도 까먹고 나는 자꾸만 잠이 옵니다. 눈을 감으면, 노을 지는 밤하늘 아래 가만히 서서 곁으로 오라는, 얼른 오라는 당신의 손짓이 희미하게 보이고. 나는 이따금 젊음을 낭비하며 그 손짓 따라 휘청거렸습니다. 가는 길이 꿈이 되고 돌아갈 표석 하나 두지 않고 이토록 먼 길을 헤매이다 나도 도착한 곳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 가득한 평원입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모두 한 번씩은 시인이었고, 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의 틈 속에서 나는 늘 이방인이었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면 격려 받고 동정 받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당신은 없지만, 봄이 오면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 따라 다시 밤길을 헤매이다 보면 어느 새 잠들어 있는 지붕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지붕 아래에는 사람들이 써놓은 시들이 발을 뻗은 채 평화롭고, 그 밑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나의 모국어는 자유도 모르고 폭력도 모르는 오렌지빛 피부를 하고는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내 인생 초라하지요? 그래도 나는 즐겁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나의 혀 끝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믿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이라 했고, 누군가는 낭만이라 했던. 그래서 마냥 좋기만 한 표정으로 글을 쓰던 때. 당신을 만나 나는 겁도 없이 외로움을 주물러댔지만, 그 일이 내게 아침이 될 때까지 깊어지는 뒷모습을 세워줬지만, 괜찮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영원히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소년이 죽고,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득한 지금이 좋아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밤, 어느 열차에 몸을 싣고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 번,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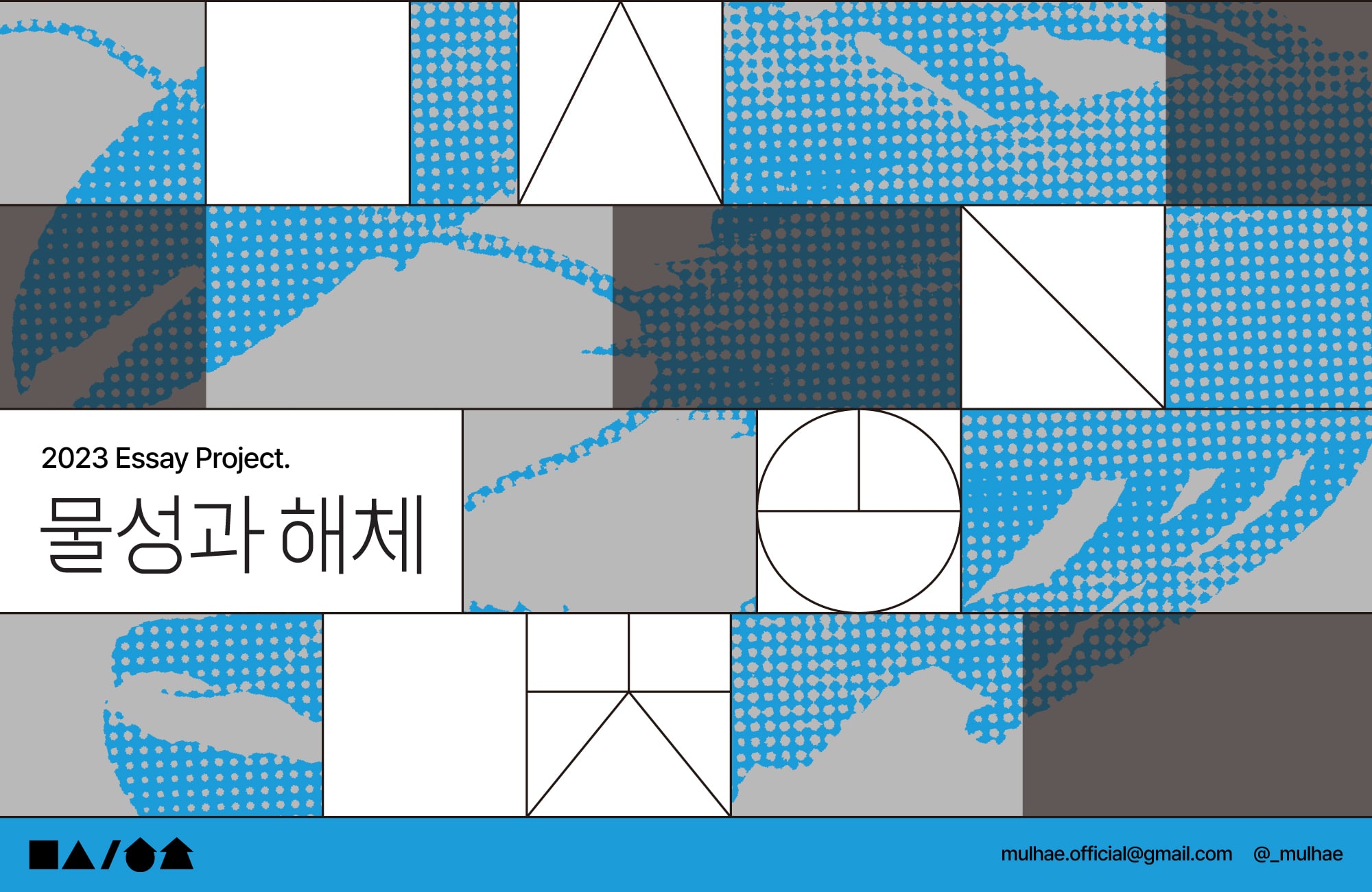
"누나의 사진과 나의 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무드에 관하여>는 차서영 작가의 사진과 김해경 작가의 글로 구성된 사진에세이 단편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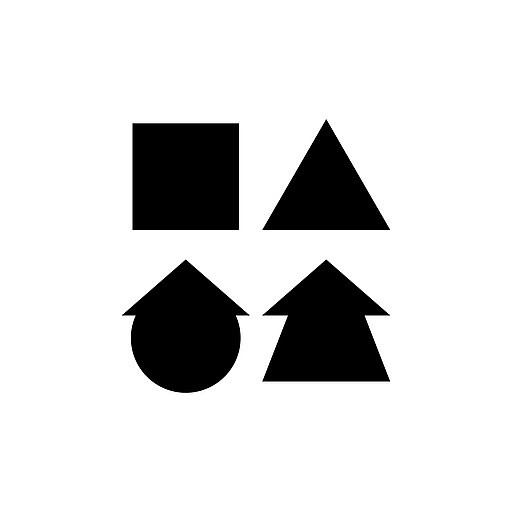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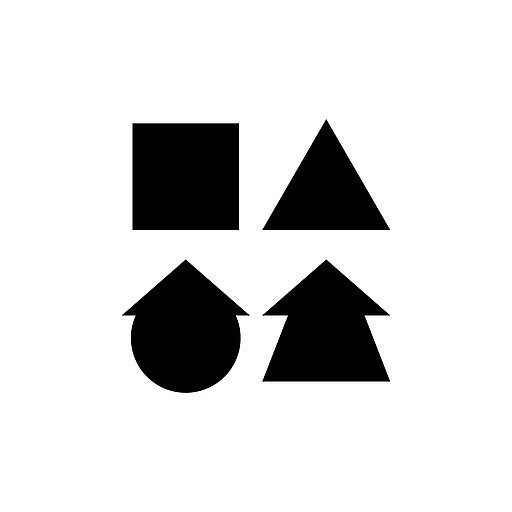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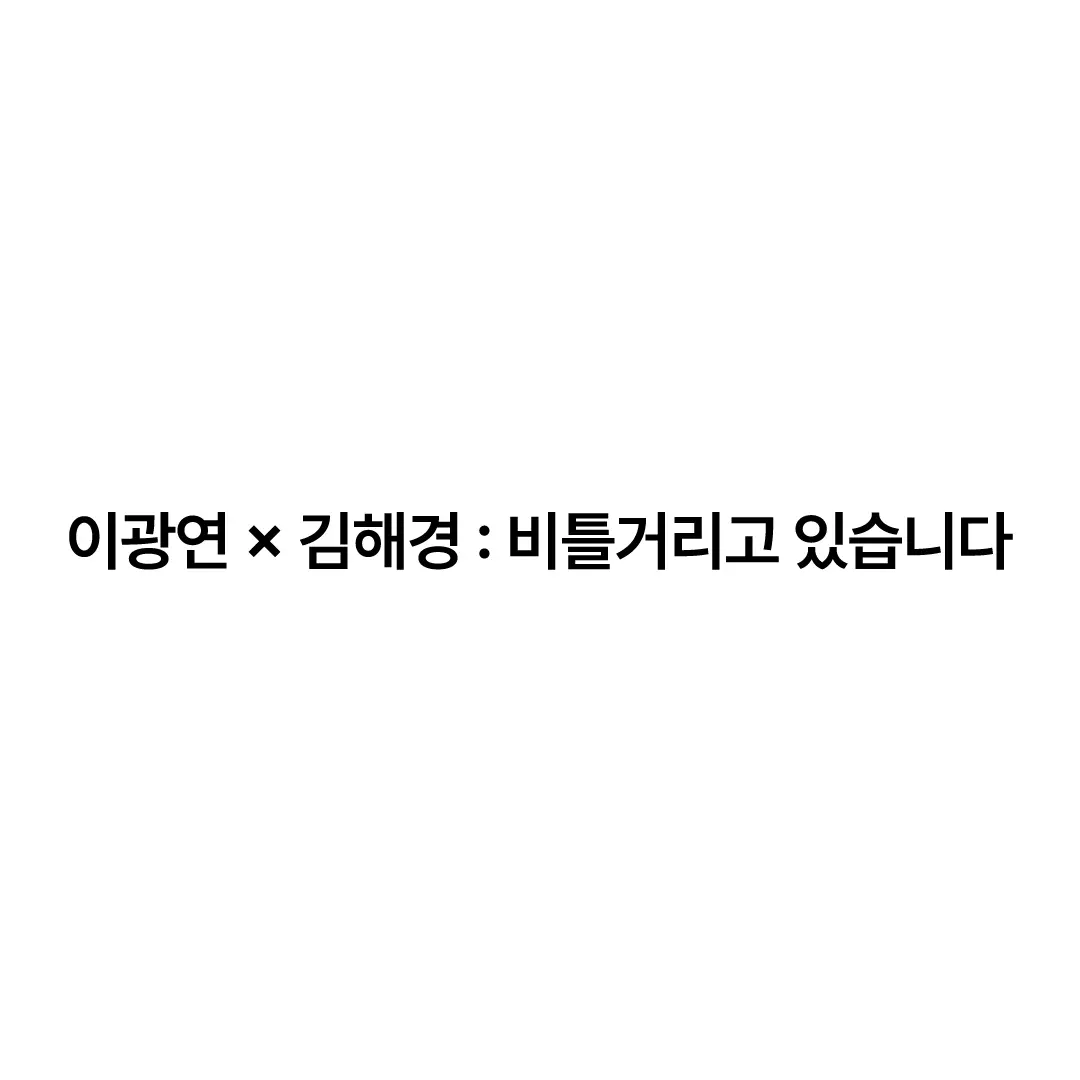



![[김해경] 라이팅룸 101호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1qyv23ad7ug60982t919d03au2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