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지난 3월, 생후 30개월 정도 되던 첫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일이었다. 아이와 온종일 붙어서 지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이의 첫 ‘사회생활’을 양육자이자 보호자로서 함께하는 일도 만만찮은 과제였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됐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이의 삶에 관한 세세한 모든 부분을 내가 알아보고 결정해야 했으니까. 예를 들면, 언제 무엇을 먹일지, 수저는 뭘 쓸지, 물컵은 뭘 쓸지, 신발은 뭘 신고, 뭐로 씻을지, 언제 잠들지도 모두 내 선택이었다. 동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웠지만, 대부분 내 기준을 따르며 돌봐줬고, 내 선택이 누군가와 즉각 갈등을 일으킬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양육 생활에 낯선 동료가 생겼고, 함께 발맞춰야 하는 때가 온 거다.
부자연스러운 첫 만남
어린이집 첫 상담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 갸우뚱했다.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분위기나 보육/교육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길 바랐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어린이집인지에 대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내게 보여줄 그럴듯한 사진을 찾는 동안 아이가 옆에서 계속 지루해했지만, 선생님은 내게 더 멋진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만 보실 뿐이었다. 선생님은 실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신, 내가 어떤 답을 원할지 맞혀가며, 그에 거스르지 않고 대화하려고 바짝 긴장 중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일순간 내가 고객이 되고, 어린이집은 선택받아야 하는 간절한 상품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다.
내가 ‘많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있을거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배움’, ‘자연 친화 교육’이라는 하나의 상품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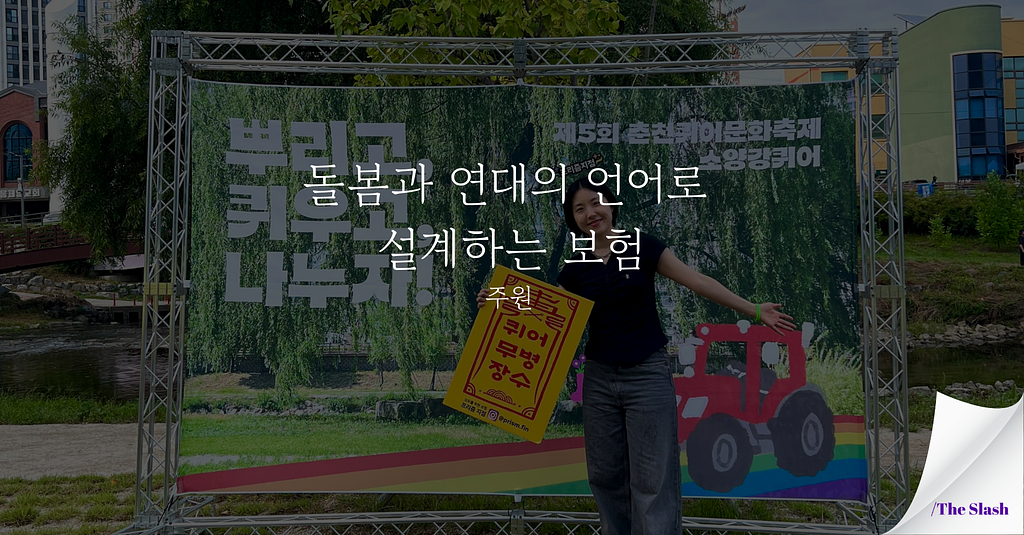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