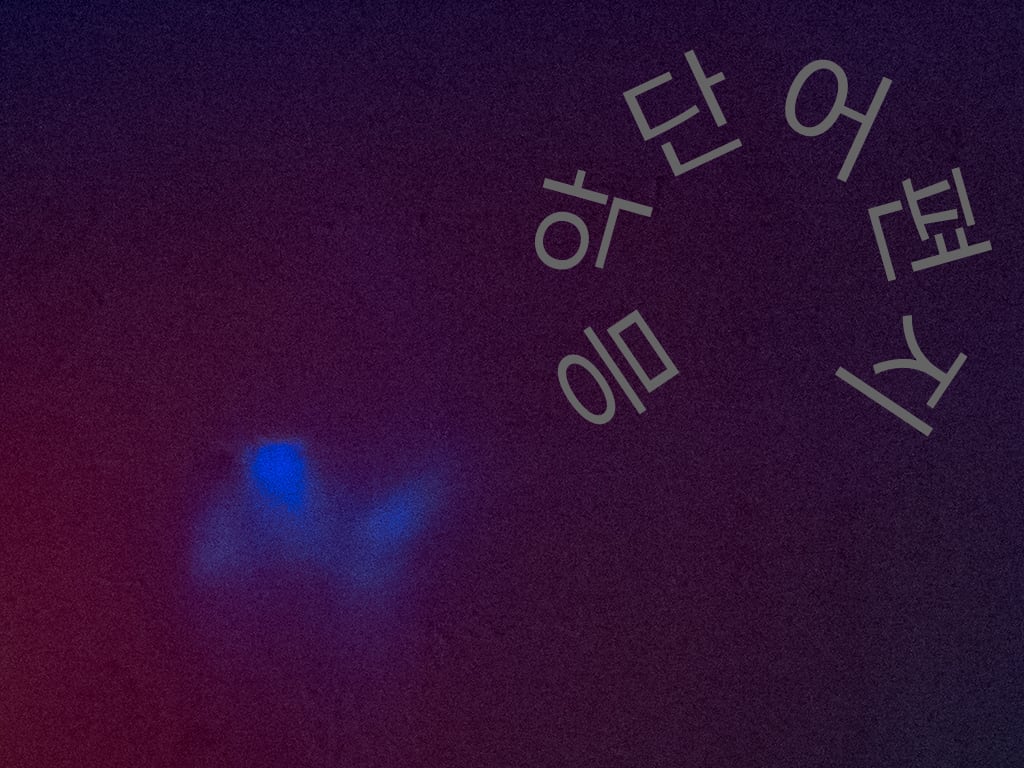
안녕하세요. 구독자 님. 어느덧 저희가 만난 지도 6분의 1년이 지났네요. 저는 영기획(YOUNG,GIFTED&WACK Records)를 운영하는 하박국입니다.
소리를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음은 어느 편일까요? 아무래도 악의 편일 가능성이 높겠죠. 소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 적혀 있습니다. 뜻부터 ‘불쾌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빌런이 선악 물의 완성도를 높이듯이 소음 역시 음악에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니, 과장법을 보태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은 소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해도 될지 몰라요.

록 장르를 대표하는 사운드는 ‘디스토션(Distortion)’이라는 이펙터가 걸린 기타 사운드입니다. ‘디스토션’은 사전 의미 그대로 물리적으로 대상을 왜곡하거나 찌그러뜨리는 걸 의미해요. 소리를 일정 이상 키우면 소리가 차지할 공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후 겹치고 찌그러져 찢어지는 듯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디스토션은 이를 쉽게 재현 해주는 이펙터예요. 왜 록커들은 굳이 깔끔한 소리를 왜곡하고 찌그러뜨려 내게 되었을까요? 멀쩡한 청바지도 굳이 찢어 입는 게 록커긴 하지만요.
다른 장르에서도 이런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힙합은 킥과 베이스 등 저음을 과하게 증폭시킨 음악이에요.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건 음악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소리였죠. EDM은 ‘컴프레서(Compressor)’라는 이펙터를 통해 음의 양을 압축해 구겨 넣어 실제 귀에 들리는 크기보다 더 큰 소리를 들려주는 음악이고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구간에서 디제이가 노브를 돌릴 때 하는 건 기존의 소리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마른 오징어 몸통처럼 찢어 점점 더 자극적인 소리가 나게 하는 기법이에요. 아차, 드디어 제가 이 표현을 쓰고 말았군요.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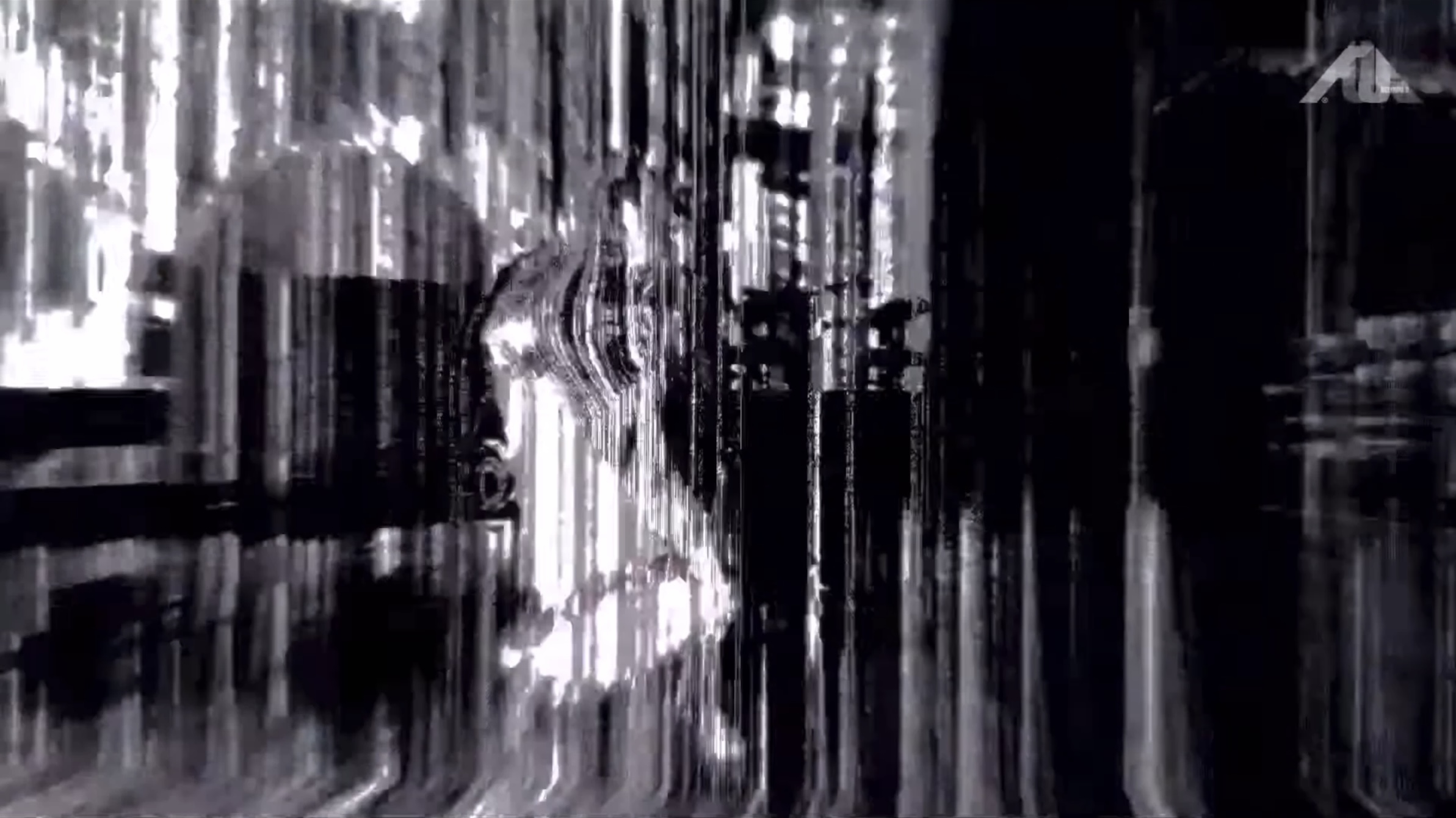
맞아요. 록에서 기타 소리를 찌그러뜨리고 힙합에서 베이스를 증폭시키고 EDM에서 소리를 구겨 넣는 이유는 청자에게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예요. 히어로물에는 빌런이 필요하고 음식에 매운맛이 필요한 것처럼 음악에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대중음악은 지금껏 여러 실험과 시도를 통해 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요. 인류가 음악을 들어온 역사는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자에 따라 더 극단적인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극만으로 이뤄진 음악이 있을 수도 있죠. 수단으로서의 소음이 아닌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그대로의 음악 말입니다. 지난 주말 3일 동안 후지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집에서도 모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FINALBY ( )’의 공연(이라 불러야 할지…)을 베스트로 꼽았어요. FINALBY ( )가 바로 그런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2) 편에서 계속
오늘 ‘소음’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를 쓰게 된 건… 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영기획의 이젠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 팝밴드 룸306(Room306)이 싱글 ‘소음’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퍼스트 에이드의 인터뷰를 읽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목은 ‘소음’이지만 실제 가사와 음악은 소음과 관련 없는 소박한 팝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가끔 나는 잊혀지길 원해’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가사와 정반대로 아침에 안 떠지는 눈을 겨우 뜨고 바라보는, 침침한 가운데 눈부신 풍경이 떠오릅니다. 구독자님에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하네요. 노래 들으며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가끔 나는 잊혀지길 원해
지저귀는 소리 책을 넘기는 소리
흘러들어와 눈동자 앞에
들이미는 그런 시시콜콜함
가끔 나는 잊혀지길 원해
몇월 며칠 몇시 나는 부럽지 않다고
다시 돌아와 귓바퀴에
걸리고 마는 그런 소모된 일상
떠나볼까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지
긴장된 삶 두 손을 꼭 모아 창을 닫고 귀 기울여
가끔 나는 잊혀지길 원해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마주 앉아
보고 싶어했던 그런 찍어나온 삶


![[음악단어편지 #8] 하이햇 (Hi-Hat)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2ddefb128babe5e0c35d8472128e8f651629089245)
![[음악단어편지 #10] 소음 (2)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c2ea0e4e77561a19aef5db1d32ee99c51630337692)
![[음악단어편지 #14] 핑계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fbf34725920f3fc30005a806b4c88ed61633340504)
![[음악단어편지 #11] 영기획 (1)🤮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5413f8c20b64b7e24821f1aead40b0331630932230)
![[음악단어편지 #13] 휴가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2dfff6c7d540c9ca177e9b1a44ee0ffa1632182406)
![[음악단어편지 #15] 싫증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3b6c7b8140da7f8d94080150ac6c2d871633994511)
![[음악단어편지 #3] 카세트테이프 (3)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70f75744b778c4c6d8f515c3d63a78ef1626096405)
![[음악단어편지 #7] 돌봄 🪢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mailybe0b1072dc067ecef9652307c80e29e01628516742)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