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첫 학기. 매일, 하루 종일 연구실에 모여 같이 공부를 하던 동기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 "공무원들이 기록관리를 잘 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록연구사가 될 게 아니라 행정고시를 봐서 사무관이 된 다음 기록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해야 하는거 아니야?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 때는 씁쓸하게 웃고 넘겼지만, 지금 일하는 곳이 첫 직장이었다면 진작 관두고 노량진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주1). 영구보존 대상이어야 할 기록은 상당 부분 공공기록물법 밖에 있고, 기록연구사의 역할과 권한은 제한적인 현실. 다른 직원들과 같이 공채 신입으로 들어왔다면 부서장이 된 이후라도 노려볼 수 있을텐데, 많은 일들을 그저 목도하고 있자니 매일 자괴감이 밀려온다. 사회 초년생이었다면 이리 저리 부딪치다 상처 받았을텐데, 이제는 의미도 변화 가능성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1n년차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랄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 죄책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봐야 하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는 저 무의미한 업무의 파도를 피하지 말아야 하나? 차라리 '기록관리'라고 부르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다 집어 치우라고 하고 업무를 거부하는게 스스로에게 떳떳할까? 지금은 어렵다면, 퇴사 후에 정보공개청구라도 해보아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 메모해 놓는건 어떨까?
그러던 어느 날, 2023년 EASTICA 컨퍼런스에서 아드리안 커닝햄(Adrian Cunningham)과 로라 밀러(Laura Millar)가 했던 기조 연설문을 읽다가 위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디지털 시대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브의 역할(The Roles of Archivists and Archives in the Digital Age)"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의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아키비스트가 지닌 역할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끔 필요 이상의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느라 잊게 되는 사실.
밀러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2021년 대홍수를 언급하며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중대한 일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쁘게 획득하고 보존하고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각 부처는 그 시점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그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 뿐 장기보존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년 전(발표일 기준) 캐나다 주 정부의 환경 부서와 일했을 때, 그녀는 재난 대응 데이터의 장기 보존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를 했지만 '그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에서 인기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뻔한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당연한 말을 하고 , 미움을 받는다. 얼마나 친숙한 상황인가.
커닝햄은 30여 년이 넘도록 '싸워 온',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완전히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발표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이 초반부 단락이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기록 생산자가 아니라 기록 관리자(keeper)이다. (중략) 그들(기록 생산자)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고, (중략)우리가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훌륭한 전략과 도구와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중략) '사람들이 좋은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데 그저 흥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연설 당시의 표정과 말투는 알 수 없지만, 텍스트로만 보면 자책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다정한 어르신의 조언으로 느껴진다. 여기까지 보고 접었어도 되었을텐데, 굳이 더 읽다가 좌절도 같이 떠안은 게 내 문제다.
먼저, 밀러는 '기록 생산자들이 기록(archives)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키비스트는 그 기록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며,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환경 부서와 일을 할 때 '아키비스트들이 '창고(storeroom)'에서 한 걸음만 나와서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했어도'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내비친다.
커닝햄도 밀러와 마찬가지로 아키비스트들은 디지털 기록에 대한 전략 수립보다도 전략적인 포지셔닝과 옹호(advocacy)에서 더 크게 실패했다고 말하며, (1) '완벽한'이 아닌 '충분히 괜찮은' 전자기록관리를 추구하기를, (2) 기록관리에 필요한 '빈틈없는 지식'을 갖추기를, (3) 'born digital' 기록은 'stay digital'하게 관리할 것을(여기에서 또 살짝 동질감을 느낀다. 전자기록을 전자기록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라니), (4)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이 주는 가능성을 주시하기를 촉구한다.
종합하면 첫째, 두 연설문 모두 'advocacy'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건 너무 뒤늦은 소망일까. 둘째, 커닝햄의 연설문을 읽다 보면 생산자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시스템 설계와 전략과 도구와 해결책'은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대입해서 전 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좋은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일의 크기가 가늠해 보니, 그걸 할 예산과 업무 시간을 확보하려면 이 일과 내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일과 관계된 모두의, 즉, 사실상 전 직원의-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그럴 힘이 생길 수는 없는데?('나는 내 일을 좋아하고 싶다. 하지만' 참조). 역시 틀렸나?
그래도 모든 권한을 줄테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먼저 사무실 내부망 컴퓨터를 떠올린다. 전자우편함에는 'PAPER-LESS[페이퍼-레스]'(주2) TF와 관련된 이메일이 있다. 어제의 외부망 노트북 화면도 불러와 본다. 문서24(docu.gdoc.go.kr) 사이트에 전자 공문이 와 있었다. 문서 배부를 담당하는 나는 이 문서를 문서24 사이트에서 접수한 후에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해서 내부망으로 옮긴 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비전자문서'로 등록하고 배부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부결재를 다 거쳐도 등록번호는 생성되지 않는 기묘한 서식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할 수 있었던 게 기적이다. 난 이 곳에서 '디지털 시대의 기록관리'를 고민하며 머리 아파할 수 있는 호사를 바라지 않기로 한다.
그럼 '전통적인' 기록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내가 정의하는 기록관리는 있어야 하는 기록이 필요한 만큼 존재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보려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있어야 하는 기록'의 범위는 '~와 관련된 기록' 같은 문구가 아니라, 업무 절차별로 기술된 아주 구체적인 기록 목록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깨알같은 정의가 필요하니 만들라고 할 주체도, 필요하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할 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기록관리 담당자와는 너무나 멀리 있다(주3). 역시, 타임머신을 만들고 시간을 되돌리는 쪽이 더 빠르겠다.
[참고] 기조 연설의 제목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EASTICA 홈페이지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Laura Millar. (2023. 11.). 'The Heron and the Hummingbird: Recordkeeping, Slow and Fast, in a Digital Age'. A text of keynote speech at the 2023 16th EASTICA General Conference, Shenzhen, China.
Adrian Cunningham, (2023. 11.) 'New Demands and New Services in the Digital Era: Chang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Archivists Facing Digital Transformation'. A text of keynote speech at the 2023 16th EASTICA General Conference, Shenzhen, China.
(주1) 굳이 찾아보았다. <법률저널>의 2023년 기사에 따르면 5급 공채 행정직 2차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41.6개월이었다고 한다. 기록전문가로서의 첫 몇 년이 꽤 행복했었던 게 결과적으로 다행이었던걸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주2) 표기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당신이 맞다. 이 기관 내부에서만 쓰는 공식 명칭이다. 굳이 하이픈까지 넣고 [페이퍼-레스]라고 발음하게 된 데에는 길고 슬픈 사연이 있다.
(주3) 단위업무 명칭을 정할 때 조차 다른 부서 팀장에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우리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가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상사로부터 '그렇게 착착 체계적으로 관리하다가 감사원에 갖다 바치고 싶지 않다'는 임원의 말을 전달받은 기억도 있다.

![[팟캐스트] 기록과 사회, 요즘 핫한 아카이브 뉴스레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r8dhtv83s7ymljhywtl85aq140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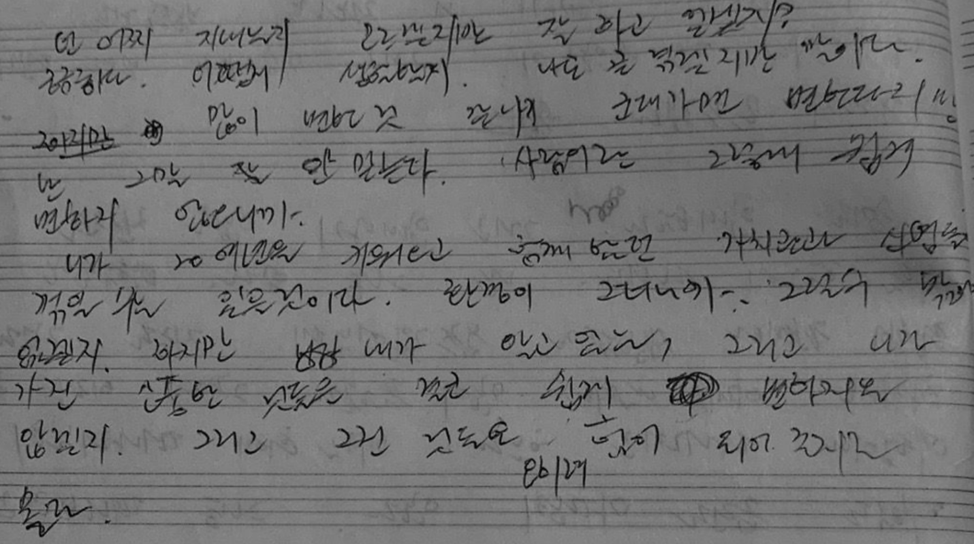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