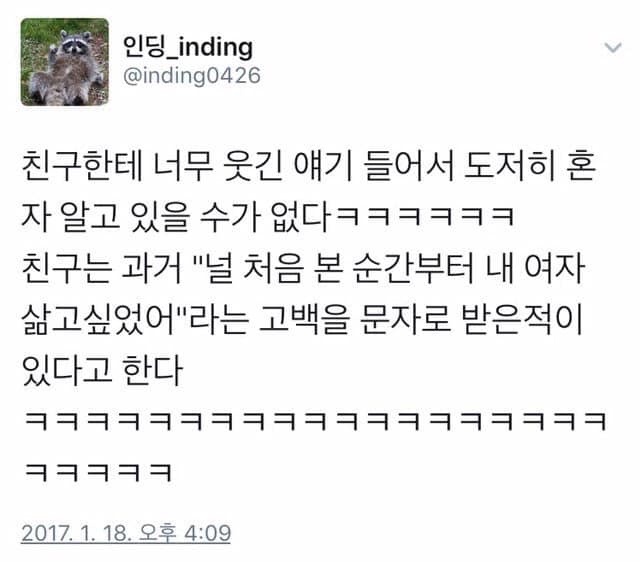
예전에 같이 일했던 편집장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편집장 돼서 뭘 틀리는 꼴을 두고 못 보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전후가 바뀐 거라고. 깊게 공감한다. 나도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 중에서도 유독 그런 걸 가만 놔두지 못하는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편집자가 된다. 일종의 정체성 문제다.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기엔 뭐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맞춤법 파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이라고 무슨 거창한 건 아니다. 페이스북에 드립과 함께 몇 번 올렸더니 사람들 반응이 꽤 좋아서 시리즈처럼 굳어졌다.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 다들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몸부림치는 걸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하다.(임 모, 박 모가 제일 나쁘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이런 맞춤법 연쇄 파괴범의 절대적인 다수가 남자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일단 틀리는 빈도가 확연히 낮기도 하고, 틀려봤자 ‘않/안’과 ‘되/돼’를 헷갈리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일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뜻이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 언어 체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싶은 경우까지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여자들은 대체로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업그레이드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게 포인트다.
실제로 몇 년 전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연인에게 가장 정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는 것’이 700여 명의 여성 응답 중 35%로 2위를 기록했다. 이 항목의 응답자 비율을 보면 여성이 무려 82%에 달한다. 남성 순위에는 비슷한 게 아예 있지도 않았다. 남자에게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여자 삶고 싶었다”는 공포체험 같은 고백을 받았다는, 듣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누군가의 실화가 떠오른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더니, 죄가 너무 무거워서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에 처하려 했나 보다. 아니면 새 여자 만나려고 구 여자를 삶아 죽이거나.
이 문제에 관해 나온 책도 있다. 제목이 <오빠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이다. 언니도 누나도 엄마도 아닌 ‘오빠’다. 저자가 쓴 기획 의도의 일부를 옮겨본다.
“지성미가 좔좔 흐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얘기를 ‘예기’라고, 원래를 ‘월래’라고, 나의 마음을 ‘나에 마음’이라고 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여자들의 이 작은 바람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대체 왜, 쓴 너는 멀쩡한데 왜 보는 나는 이토록 부끄러운가. 걱정해 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덕분에 내가 낳은 감기들은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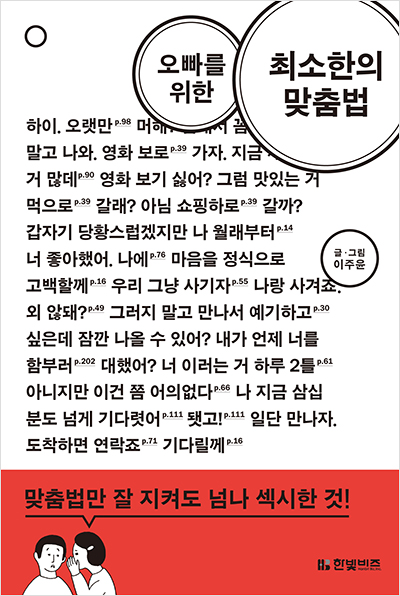
내 경험으로 보면, ‘빻은 남자’에게는 대화 도중 단어 몇 개만으로도 알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존재한다. 열댓 명 모인 단톡방 같은 곳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그게 결국 태도와 직결되며, 커뮤니티를 박살내는 ‘빌런’이 되는 사례는 몇 번이나 겪었다. 눈치 없고 맥락 파악 못하고 ‘낄끼빠빠’가 절대 안 되는 부류. 악의는 없다 해도, 원래 집단에서 ‘악의를 실어나르는 악의 없는 숙주’가 더 무서운 법이다. 그 시그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맞춤법은 증거 치고도 꽤 신뢰할 만한 증거 되겠다. 비참할 정도로 신기하게 맞아떨어진다. 너무 예상대로라서 예상 밖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걸러도 된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자주 마주칠 사람들 같으면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이 땅의 의무교육과 문맹률, 고등교육률 같은 걸 감안하면 이런 차이는 기괴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남녀의 인지적 차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 책 같은 문화적 소비를 여자들이 월등히 많이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이게 본질적으로 공감과 소통 능력의 차이에서 온다고 확신한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하고, 자신의 언어가 눈앞의 상대와 어떻게 다른지 관심도 없고, 그 이질감의 원인을 궁금해 하지도 않으며, 그런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다가 아예 관성이 되어버리는 것.
자기교정의 기본 사양은 타인을 살피는 민감성이다. 맞춤법을 끝까지 거슬리게 틀리는 사람(=남자)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게 결여돼 있다. 군대 문화 따위의 단순한 사회화 안에서 폭력적인 무심함과 둔감함이 몸에 배었다고 할까. 마치 종의 대표성이 결여된 집단유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량생산되듯 표준 규격화가 된 것이다.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을 또 쓰자면, 일종의 ‘혈연적 유사성’이자 ‘유전적 표현형’인 셈이다. 나름 오랜 세월 쌓인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니 믿어도 된다.
카페에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 무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적응한 남자들’의 전형성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내가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에 짜증과 혐오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낀다. 행여나 내가 저 인간들과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는 순간이 올까 싶은, 타인은 모른다 해도 스스로 느끼는 순간이 닥칠까 싶은 두려움도.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