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으로 가기 위해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내려 걸어갔다.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보다 시간을 들여 산책 겸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근처 책방을 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숙대 앞에 있는 책방 '죄책감'은 가게 이름부터 심상치 않다. 주인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가게 이름을 지었을까?
'책은 사놓고 읽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어쩌면 사놓기만 하고 책장에서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해 곰팡이에 망가져버린 책들, 혹은 책장도 모자라 바닥에 쌓아두다가 장판에 딱 붙어버린 책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죄책감 때문일까?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책에 대해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아서, 그 죄목들을 아무리 많은 노트에 적어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쌓였던 것일까? 집에 가득한 읽지 못한 책들, 커피와 함께 읽다가 책에도 한 모금 나눠주는 일이 빈번한 나 역시 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해본다.
그런 추측과는 달리 유리 너머로 보이는 책방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내향적 탐험가인 내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책을 둘러보는 모습이 계산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계산대 앞에 높은 나무 진열대가 있어서, 주인이 계속 나를 관찰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선의 부담 없이 책 탐색에만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진열된 책들을 한 권 한 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책장에는 주인이 강력 추천하는 책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 설득력에 끌려 한 권을 집게 되었다.
『흰 고래의 흼에 대하여』. 도서 제목부터 라임이 너무 좋았다. 흰 고래는 그냥 흰 것인데, 그 '흼'에 대해 고찰한다니 나 같은 망상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제목이었다.
책을 들고 나와 효창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읽기 시작했다. 번역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테세우스의 배가 생각났다. 원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언어라는 '부품들'이 하나씩 교체되는데, 중역을 거듭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같은 내용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한국어 성경이 여러 번의 중역을 거쳤다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전에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다시 각국 언어로 옮겨지면서 과연 원문의 '무엇'이 남아있을까? 테세우스의 배처럼 모든 부품이 교체되어도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 수 있을까?
홍한별 번역가가 말했듯 번역은 "무언가를 조금씩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원본이 새로운 언어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번역된 텍스트는 원본과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제3의 존재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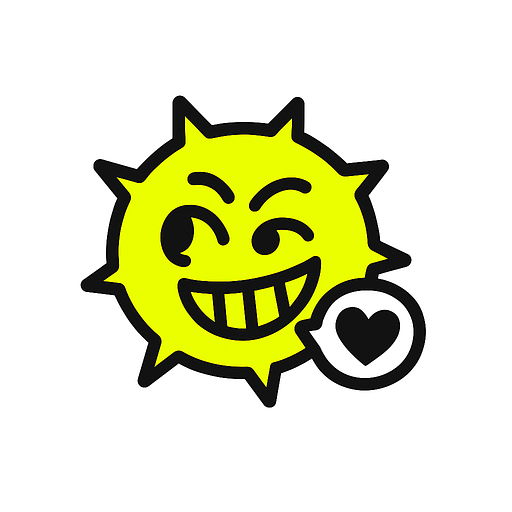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