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 달 은은히 피어오르는 불안감 중 하나는 시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1년, 작년 연말에 지역의 신문사에서 칼럼 게재 청탁이 왔다. 인적 사항 및 간단 약력을 요구해서 메일로 보냈더니 담당자분께 전화가 왔다. 문예지도 만들고 시집도 내셨네? 그럼 이름 옆에 시인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하고. 나는 ‘시인’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기도 하고 사진단상집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데 그냥 작가는 안 되나요? 하고 가볍게 물었더니 작가는 안 된단다. 그러더니 대뜸 등단하셨어요?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이 신선하게 느껴질 줄이야. 예 뭐 제가 만들긴 했지만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마뜩잖다는 느낌을 계속 풍기면서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한다. 지금 어떤 일 하세요? 네? 뭐 이것저것 하는데요. 저,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은요? 문창과를 부전공했다고 하니 그제야 아…. 하면서 내 이름 옆자리는 시인,으로 하겠노라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칼럼이 게재되고 나서 보니 내 이름 옆에 적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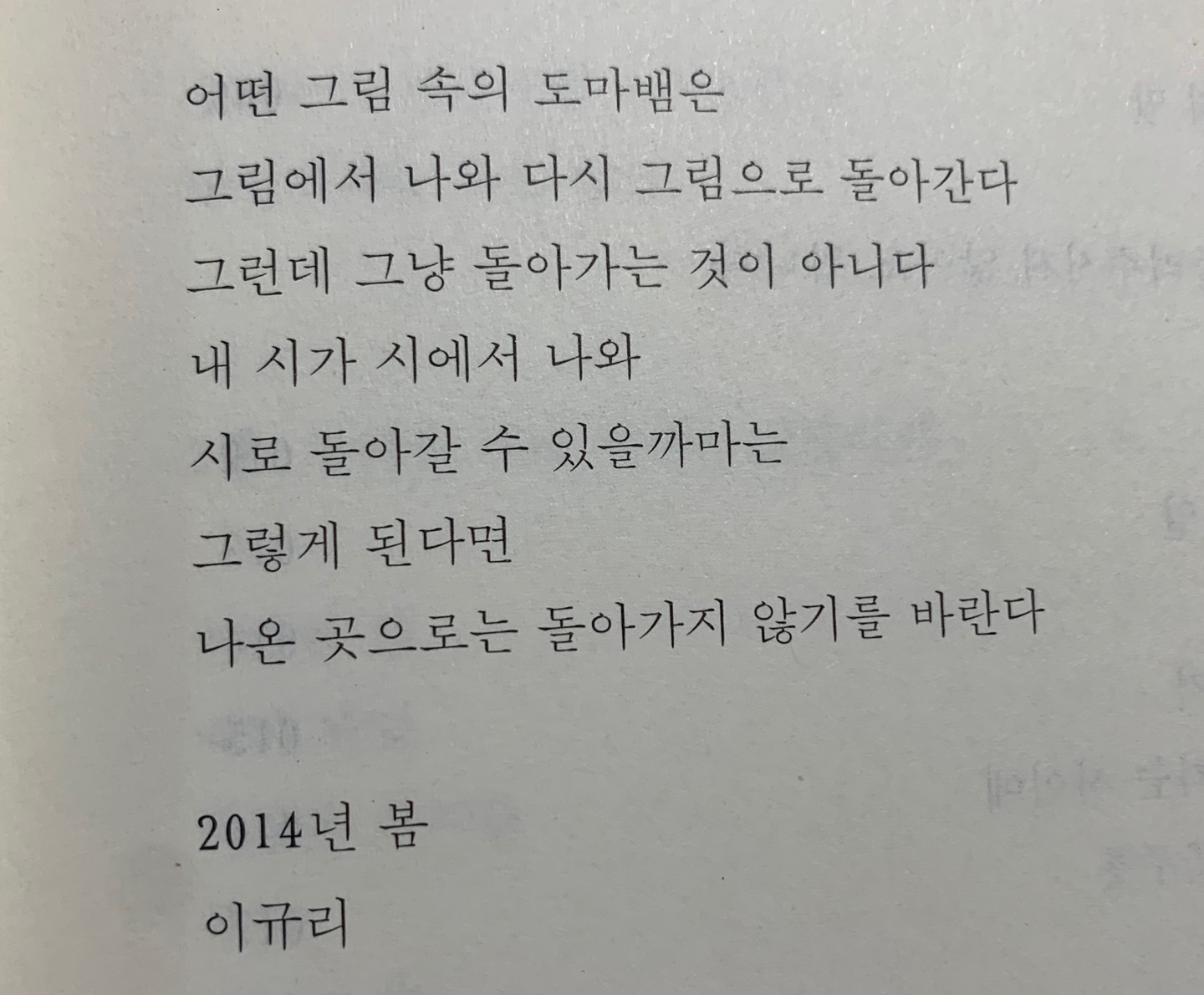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