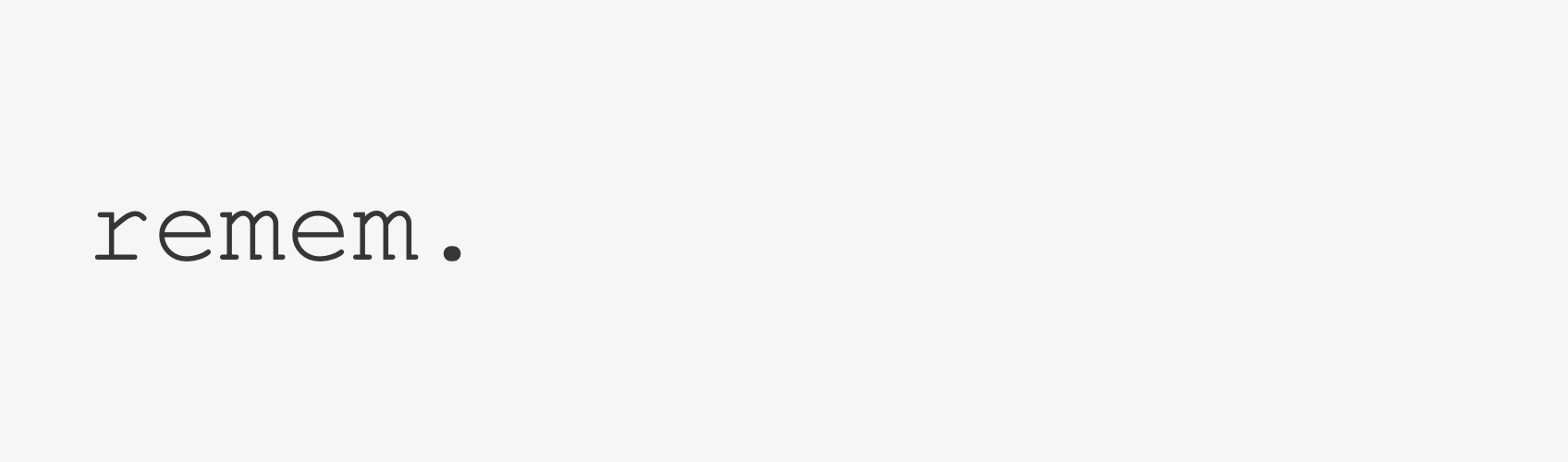
# 죽음을 준비하며 깨닫게 된 것들
데이비드 린든은 미국의 신경과학자다.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하다. 심장암 판정을 받고 6-18개월 시한부 삶을 앞에 두고 쓴 에세이를 애틀랜틱에 기고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정신은 겉보기에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닥친 치명적 암에 격분하면서도 삶이 내게 준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한다. 그전까지 신경과학은 뇌가 한 번에 한 가지 상태만 가능하다고 봤다. 그렇지 않다. 우리 뇌는 그보다 미묘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인지적 감정적 상태를 모두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인간 존재의 깊은 진실은 객관적인 경험이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뇌는 어떤 것이든 절대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자신의 기대와 비교 그리고 그때 환경에 의해 착색된다. 친구와의 30분과 대기 줄 속의 30분이 다르고, 연인의 터치와 낯선 이의 접촉은 같을 수 없다.
셋째, 내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나는 죽음의 전모나, 내가 죽고 난 후의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뇌의 한계다. 그전까지 신경과학은 우리 뇌를 수동적 반응적으로 이해했다. 지금은 뇌가 세계에 반응만 하는 데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 예측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측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 우리 뇌는 늘 가까운 미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사망의 전모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동서양의 거의 모든 종교가 내세를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뇌는 늘 예측할 미래를 찾고, 자신의 의식은 지속될 걸로 믿는다. 나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종교의 내세에 대한 믿음과 그 신경학적 뿌리를 다시 생각한다. 그런 믿음은 인간 인지의 특장일까 결함일까. 결함이라 해도 이제는 공감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 꾸준함의 미덕
사람들은 성실함의 미덕을 과소평가한다. 아마도 ‘성실’이라는 단어가 주는 재미없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이 말에는 뜻한 바를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주위의 누군가가 자신의 주된 인생 목표가 성실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이지 답답하고 야심도 없어 보이지 않나. 그러나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 항상 자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한 자세다. 동시에 위험 부담이 크고 중대한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성실성은 일과 인간 행동에 대해 높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기대치를 설정한다. 그럼에도 의료계에 몸담은 사람들 몇몇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대치를 달성해 왔다. 인도에서 목격한 소아마비 근절 캠페인 역시 그런 경우였다.
아툴 가완디 <어떻게 일할 것인가>
# QUOTE
변화는 느리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고민하고 매일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느껴요.
배우 산드라 오
# 이전에 없던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
앞으로는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을 창출하는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언젠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한 걸로 평생 먹고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예순에도 여든에도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21세기에는 있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수집·큐레이션하고 결국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거창한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니다. 지식 자체보다 내게 맞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