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홍보 8년 차가 됐을 무렵, 회사가 미국 법인을 설립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 난 해외 매체에 기사를 내야 할 텐데?’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그간 국내 언론 홍보만 해봤지, 글로벌 PR은 해본 적 없었다.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어쩌겠나. 닥친 일은 해내야 한다. 월급 생활자의 삶은 그런 거니까.
오늘은 해외 매체에 첫 기사를 내는 데까지 걸린 1년 간의 글로벌 PR 분투기를 공유합니다. 별안간에 글로벌 PR도 맡게 된 언론 홍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처음엔 글로벌 PR을 얕잡아 봤다. 언론 홍보만 8년 했으니까. ‘해외 매체라고 다를쏘냐?’ 기자에게 메일 몇 통 보내고, 온라인 미팅 좀 하면 몇 개쯤 기사를 낼 수 있을 줄 알았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줄 상상도 못했다.
3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1) 외신 기자 이메일 주소를 찾을 수 없었다.
해외 매체는 한국 매체와 달리 *바이라인(by-line)에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질 않았다. 이름만 써 놓을 뿐. 이메일 주소를 구할 수 없다면 글로벌 PR *미디어 리스트도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후 수소문 끝에 해외 매체의 한국 특파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기자님, 회사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언제 시간 한 번 내주세요”라고 연락했더니 몇몇 기자님께서 시간을 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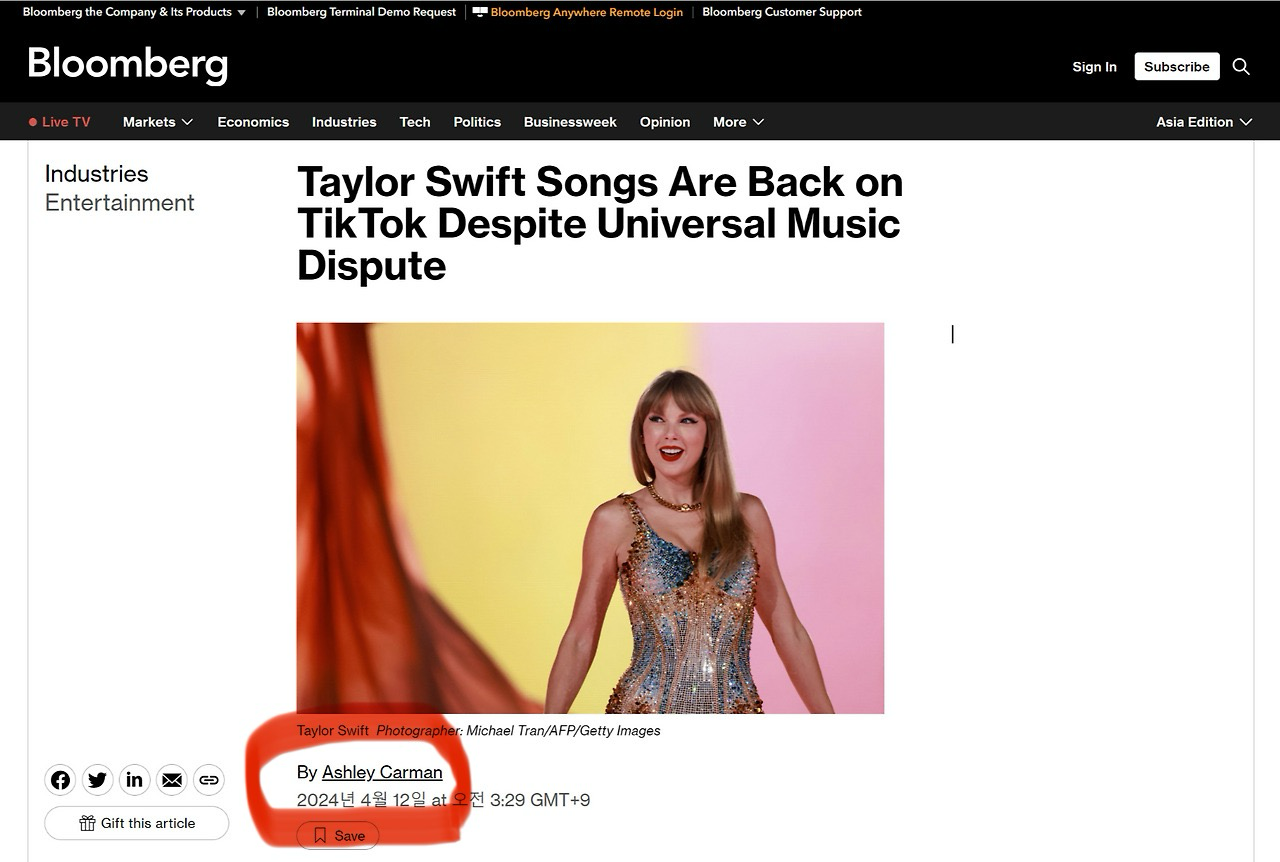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2) 한국 스타트업 소식은 잘 다루지 않는단다.
한 유력 해외 매체 특파원은 “스타트업 소식은 저희 기삿거리가 아니에요. 특파원은 보통 삼성, 북한, 오징어 게임 같은 큰 소식 아니면 더 중요한 속보를 다루거든요.”라는 말을 내게 해줬다. 듣고 보면 맞는 날. 해외 매체의 한국 지사도 보통 취재 기자는 10명 남짓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소식만 다뤄도 손과 발이 모자랄 테다.
이후 나는 *콜드 메일링을 시도한다. 해외 매체 기자의 트위터, 링크드인을 탐색하면 어렵사리 이메일 주소를 구할 수 있었다. 100여 개의 이메일 주소를 구했을까. 나름대로 글로벌 PR 미디어 리스트를 만들고, 콜드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영문으로 번역한 회사 소개서도 함께 보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3) 답장을 1통도 못 받았다.
이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했다. 사실 화도 좀 났다.
이후 나는 주변 글로벌 PR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회사의 투자사(CJ ENM) 홍보팀도 만나 물었다. 글로벌 PR 방법을 좀 알려 달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대행사 구하세요. 대행사 없이 글로벌 매체에 기사 1개 내기도 어려울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함부로 대행사를 구하고 싶진 않았다. 대행사를 운영할 만큼 글로벌 PR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대행사가 능사는 아니니까. 이후 20곳 넘는 국내/외 홍보 대행사에 미팅 요청 메일을 보냈다. 대행사 직원들을 만나 이것저것 좀 물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적은 예산 탓에 줄곧 거절 답장만 받았다.
다행히 3곳의 미국 현지 홍보 대행사(아래)와 연락이 닿았다.
이들은 내게 4가지 결정적인 글로벌 PR 관련 팁을 일러 줬다.
(1) 모르는 사람의 이메일은 열어 보지 않는다.
해외 매체는 자료의 출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메일은 신뢰하지 않는 게 보통 해외 매체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콜드 메일을 해외 매체 기자가 열어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2) 첨부 파일도 함부로 열어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의 이유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속 첨부 파일은 열지 않는단다.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글로벌 PR 대행사 직원들은 입을 모아 첫 메일은 첨부파일 없이, 회사 소개는 줄글로 간결하게 적어 보내라고 조언했다.
3곳의 미국 현지 홍보 대행사 직원들은 이어 ‘개런티드’ 기사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 매체에 기사화를 ‘담보’해 준다는 뜻일까? 3번, 4번 팁이 핵심인데,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규봉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블랙버드 퍼블리시티
멤버십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