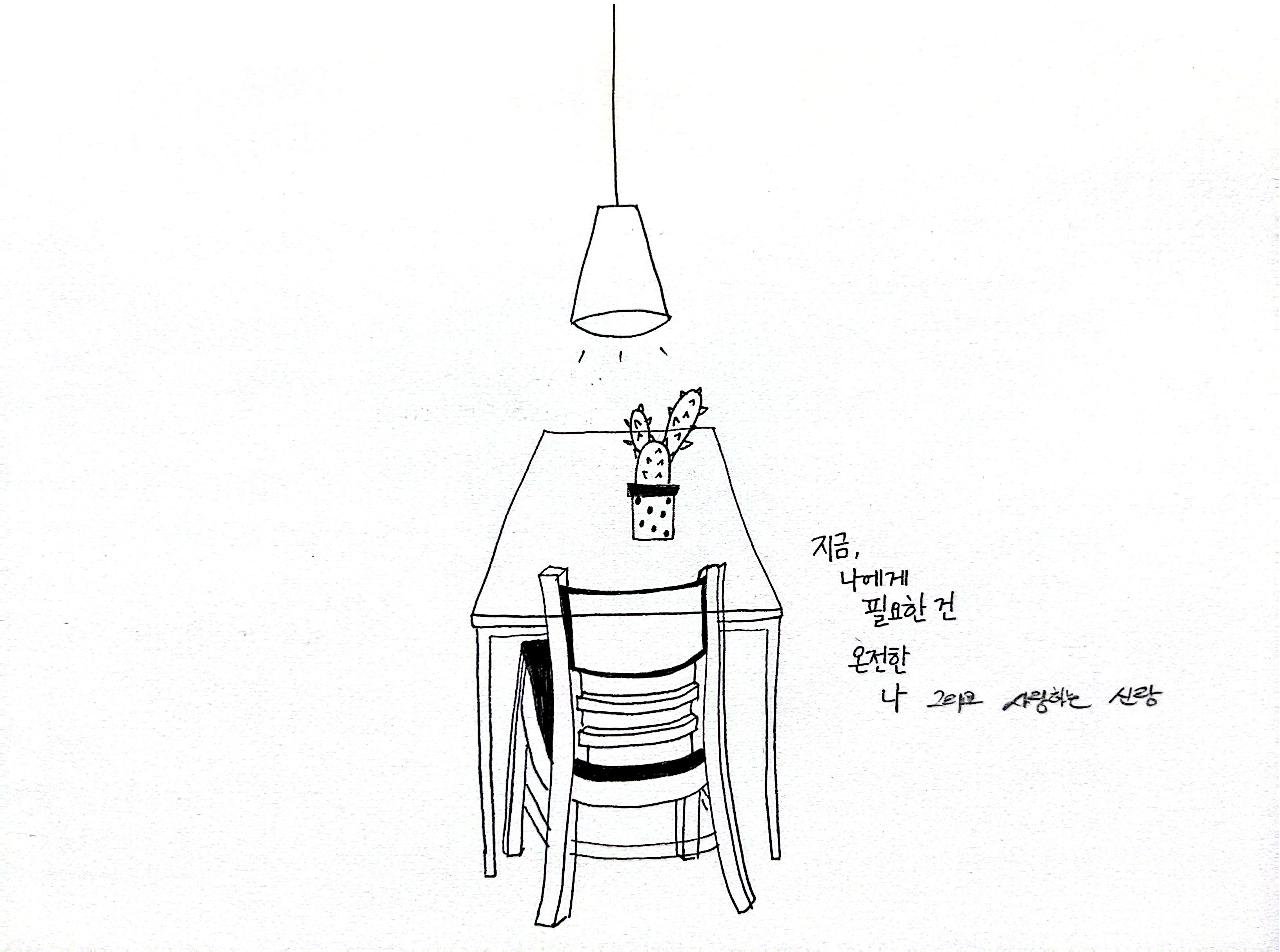
창밖에 타닥타닥, 보슬비가 내린다. 아이들은 겨우 잠에 들었다. 나는 물통을 챙기고, 신랑과 눈인사를 나눈 뒤, 봄 점퍼 모자의 끈을 조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잔걸음을 내딛는다. 운동장은 이미 빗물을 머금고 있었다.
아이 셋을 키우려면 체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막상 뛰어보니 체력보다 먼저 스트레스가 풀렸다. 조금만 달려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나는 숨을 내쉴 때마다 쌓인 것들을 세상에 뱉어내는 기분이었다. 헐떡이면서도 실실 웃음이 났다. 달리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글쓰기 역시 그랬다. 쓰다보니. 공허함이 채워졌다. 잘 쓰지 않아도 괜찮았다. 다시 읽고 싶지 않은 글도 많았지만, 뱉어내고 나면, 기분이. 나아졌다.
빗속을 달리면 시원하다. 빗방울이 내 어깨를 토닥이고, 빗소리 사이로 마음이 움직인다. 그때마다 마음을 내주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그리고 문득 내 숨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흙은 물을 머금어 말랑했고, 나는 뛰다 걷다를 반복했다. 걸음을 늦추면 생각들이 밀려왔다.
세상도 그랬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내 마음을 알아보고 다독이며 가꿀수록 나는 나에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멀어지는 일도 많았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건 어릴 적부터 금지된 일이었다. 잘해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했다. 숨이 막혀도 모른 척하는 법부터 배웠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했다. 마음을 뱉어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길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깊어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을 뱉어내어 방 한켠에 넣었다.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
현실은 쉽지 않았다. 집을 지어도 문 앞에 서는 일은 막막했다. 시간이 없었고, 해야할 일이 먼저였다. 문 앞에 서더라도, 그게 어떤 마음인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았다. 그래도 나는 알아차리고 싶었다. 그 문을 열고 싶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아이들을 위해 내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아이들이 커갈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했다. 숨이 찰만큼 달려야 했지만, 그 길은 아이와 나를 위한 길이었다. 마음을 살피니 아이와 대화할 수 있었다. 물론 과거에 밟히고 미래에 치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을 살았다.
그렇게 내 마음의 집에는 방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첫째는 ‘화'방이다. 불꽃같은 화. 세상에 대한 포효이자, 한사람에게서 시작된 불이었다. 그 불이 잦아들기를 기다렸고, 믿기 어렵지만 결국 잔잔해졌다. 이제 이 방은 숲처럼 무성하고 촉촉하다.
둘째는 ‘슬픔'방이다. 집에서 가장 넓은 거실이자 모든 방으로 이어지는 길목.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방. 크고 깊어 많이 담을 수 있는 이곳은 아마존 숲처럼 축축하다.
셋째는 ‘불안'방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불안은 아이를 낳으며 더 깊어졌다. 그래도 잘 숨기고 다니는 능력은 있었다. 이 방은 예쁜 꽃과 나무가 많아 산뜻하다. 놀기에도 좋다.
마음의 집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풀과 나무가 저절로 무성해질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공간만 마련해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내 마음에 자라는 것들, 나조차 처음 보는 것들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집이 있다는 것. 함께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행의 끝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 역시 이 글을 쓰며, 무사히 내 마음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저자 소개]
작년 연말, 세 아이를 키우는 일에 홀로 던져진 날, 우연히 <한끝차이>를 만났습니다. 52일 동안 이어진 글쓰기 여정은 저를 흔들어 깨웠고, 그 후 글쓰기 공동체 ‘쓰고 뱉다’에 합류하면서 제 글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그나마 조금 압니다. 그래서 겨우 ‘나’에 대해 씁니다. 하지만 이 글이 ‘나’와 함께 ‘우리’에게로 닿아 읽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나’를 곰곰이 들여다보며, 마음의 집을 쓸고 닦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집의 문을 엽니다. 불안은 여전하고 때로는 더 커지지만, 곁에서 용기를 건네는 분들이 있어 한 걸음씩 걸어가 봅니다.
평소에 잠을 잘 못잤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잘 잡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읽는 누군가가 따뜻한 이불을 덮은 듯 편안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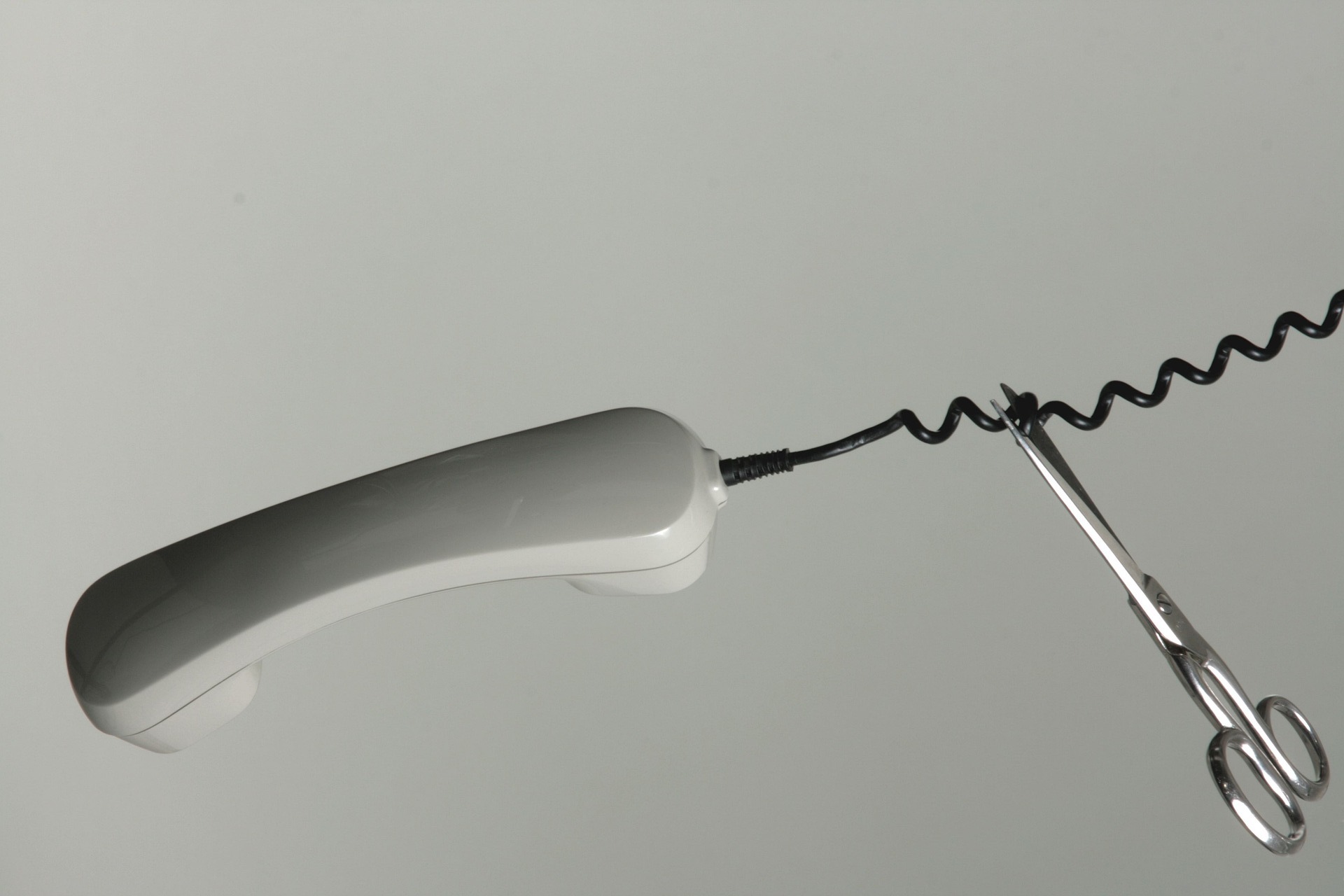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