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의 일이다. 아는 선배의 요청으로, 여성 CEO들의 성공전략에 관해 인터뷰를 하고 기록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여러 시간 인터뷰한 것을 한두 장으로 압축해서 각각의 리더십을 뽑아내는 콘셉트였는데, 대상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풀고 정리하고 서로 다른 리더십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요약하는 것은,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정독하고, 또 정독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그때 나는 나의 체력과 역량에 비해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 수십 장의 자료를 읽고 또 읽던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마치 뇌 정지가 오는 느낌이랄까. 그때 나는 ‘아, 이런 게 과로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무서웠다. 그 길로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무조건 쉬었다.
시간이 더 들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그 일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그 일을 하자고 제안받았을 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의미 있고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마감’ 있는 직장을 다녔던 나는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만큼, 또는 육체노동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했었다. 그 경험 중에 유독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포클레인 때문이었다.
어느 한 날이었다. 마감은 다가오고, 글은 안 써지고, 머리는 엉키고, 도저히 한 글자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일하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었다. 새벽녘이었다.
그때 우리 회사 건물 옆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포클레인들이 땅을 다지는 일을 하던 때였는데, 마침 그날 새벽까지 일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는 포클레인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정신노동에 지쳐 회로가 멈춘 상태에서 물끄러미 포클레인을 쳐다봤다. 그 이전까지 포클레인의 움직임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포클레인의 움직임은 참으로 정교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포클레인의 팔(암)과 삽(버킷)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포클레인은 마치 장갑을 빼듯 자기 팔에서 삽의 연결고리를 빼더니, 옆에 놓여있는 다른 삽 쪽으로 다가가 삽의 고리에 구멍을 정교하게 맞추고는 한 번에 끼웠다. 그리고는 그 삽을 들고 공사장 한 쪽 끝으로 가서 살포시 내려놓았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이번에는 그 옆에 남아있던 다른 삽도 천천히 한 번에 끼운 다음, 다시 공사장 한 쪽 끝으로 가서 방금 전에 갖다 놓았던 삽 위에 잘 포개놓았다. 삽들을 정돈하는 모양이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포클레인은 원래 제 것이었던 삽의 고리를 정확하게 맞추어 한 번에 끼웠다.
마치 발사되었다 돌아오는 ‘로켓 주먹’처럼, 잘 합체한 포클레인인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다시 접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한 다음, 그 상태로 아까 정렬해 둔 삽들 옆에 줄 맞춰서 주차를 하는 것이었다.
이쯤 되니 도대체 저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졌다. 얼마나 저 일을 오랫동안 하면 저렇게 자기 팔처럼 포클레인을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의 노동의 ‘세월’에 새삼 고개가 숙여졌다. 운전수가 드디어 포클레인에서 내렸다. 운전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실루엣에서 한 번에 연륜 있는 나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내려서는 포클레인 주위를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았다. 제 자리에 잘 정돈되어 주차되었는지 확인을 하고는 오늘 일은 다 되었다는 듯 포클레인에 걸터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포클레인의 마무리 작업을 넋 놓고 보았다. 마치 한편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의 뇌리에는 ‘사람은 저렇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반반씩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깨달음처럼 스며들었다. 이렇게 정신노동만 주야장천 하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이 뻔하다고, 인간은 누구나 저렇게 멋진 노동을 절반은 하며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생각했던 것이다.
정신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이 포클레인을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일의 ‘정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정신노동을 줄이고 적당히 육체노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노동의 비중이 조금씩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사고에서 벗어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몸을 움직이며 현재의 감각을 느끼는 일이 ‘나이 든 몸’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보다 먼저, 전체 노동이 나이에 맞게 줄어들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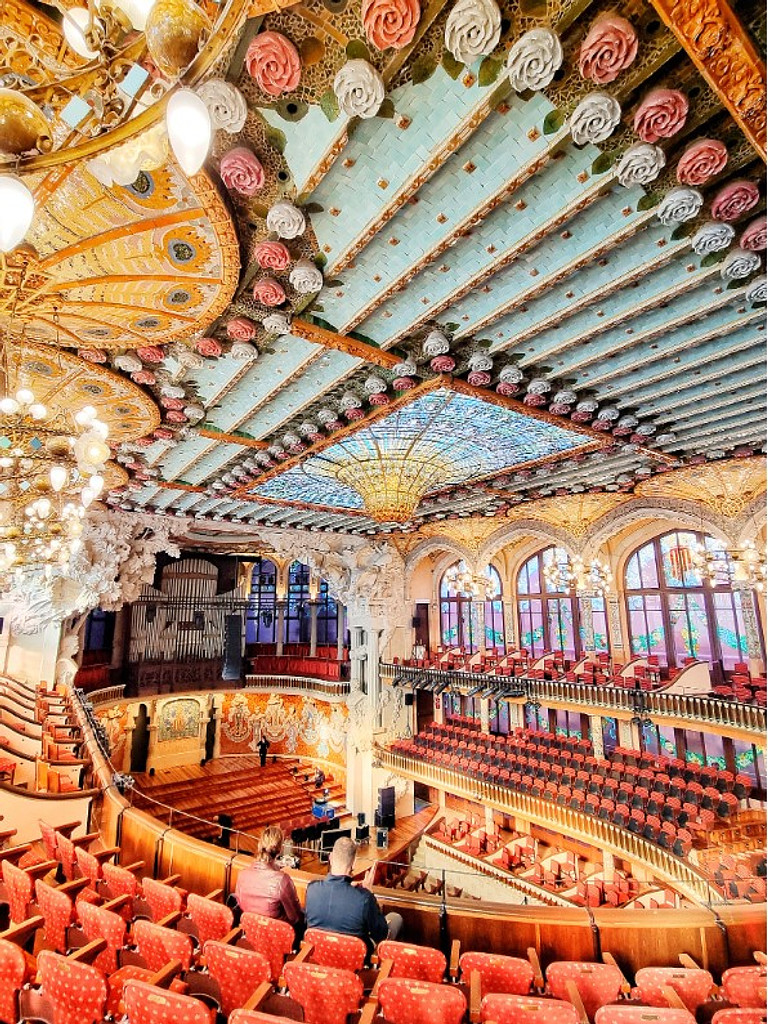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