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같다. 산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옮겨 놓지 않는 이상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터널이나, 도로를 낸다고 밀어버리지 않고서야 평생 그 속에서 나무들은 한결같이 살아간다. 나무들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옛날에는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지만, 이젠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시대라 산을 찾을 때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덜컹 들곤 한다. 그만큼 고령의 주름진 나무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는 거다.
경주에서 어느덧 아이들이 생태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게도 숨통이 좀 트였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온몸과 마음을 내맡긴 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인 우리는 할 일을 덜은 것만 같았다.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서 늘 누구누구의 엄마였다. 돌봄과 살림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삶이란 단란한 동시에 내가 닳아 없어지는 불안을 견뎌야만 한다. 그럴 때면 온 가족을 끌고 부랴부랴 산으로 갔다. 우리들은 삼릉 숲에 추억이 많다. 금오봉까지 오를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막상 정상까지 오른 적은 몇 번 안된다. 그 주변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사라지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오래된 것들과 조우했다.
삼릉 숲에 들어서면 허리 굽은 수많은 소나무들이 내뿜는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 당하고 만다. 우리는 어느새 작은 동물이 되어 거대한 무덤 주위를 배회했다.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무덤이 모여 있어 삼릉이라고 불린다. 얼굴도 모르는 옛사람들의 거대한 무덤 앞에서 아이들은 아랑곳 않고 놀이를 찾아냈다. 산딸기도 따먹고 나무 미끄럼도 타고 있었다. 죽어 있음과 살아 있음이 공존하는 이곳이 묘하게 편안했다. 나는 나의 얼굴을 찾고 싶었다.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들인데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을 듯이 사랑한다고 만난 남편인데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지, 이 궁핍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질문이 질문을 낳았다.

오늘은 숲을 지나 계속해서 올라가 보기로 한다. 아무리 말 수가 적은 사람도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다"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좋네", "눈이 시원해지네" 하며 입을 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어느덧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나이가 되자, 산에 오르면서 재잘 재잘 새들 소리가 다 안 들릴 정도로 떠들어 댄다. "숲에 들어오니 너무 상쾌하고 좋아!", "초록색이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니야!", "엄마 이것 좀 봐! 너무 귀여워. 여기가 토끼들 집일까?", "저것 좀 봐!" 하고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나누고 싶어한다. 나도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이들은 더하다. 매 순간 감탄하는 아이들 덕분에 세상이 살아 있다고 느낀다. 남편과도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삼릉계곡이 나왔다. 떡갈나무 아래 바위에 걸 터 앉아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아이들이 노는 걸 바라보는 게 퍽이나 즐거웠다. "위험해! 내려와!" 하고 이름을 몇 번 번갈아 부르고 나자 어느덧 아이들의 눈빛도 자연에 푹 빠져 있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홀려 나의 질문을 잊을 뻔 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아 문제, 온갖 일상적 고민들을 걷어 차고도 남아있는 본질적인 질문 가까이 가닿게 된다. 개구리처럼 바위에 딱 붙어서 안정감 있게 기어오르고, 흐르는 물이 반가운지 얼굴이 연신 신나 보였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인데 본래 여기서 생겨난 아이들 같아 보였다. 이 생기 넘치는 아이들은 자연과 닮아 있었다. 나도 덩달아 발을 좀 담궜다. 그제야 엄마라는 겉옷을 잠시 벗을 수 있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남편과도 우리가 함께하는 장소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다. 산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진 사회적 이름을 자연스레 떼어 놓고 일상을 벗어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인간으로 사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더 우리 다운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긴 물음들을 놓을 수 없는 것이지?" 서서히 말이 사라지고 만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놀면 숲의 평화가 찾아온다. 나뭇잎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산짐승이 내려와 말을 걸어도 놀라지 않을 만큼 숲이 환상적으로 변한다.
나무에 베인 바람 자국, 햇살을 머금은 도토리, 물방울을 수집하는 바위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소리 없는 대화, 맨몸으로 노는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돌아간다. 삶의 본질을 향한 질문의 씨앗을 늘 지니고 살고 싶다. 그걸 잊는 순간, 내 영혼이 궁핍해질 것만 같다. 어느덧 산에 들어서면 그윽한 숲의 정령들의 수호를 받는 것 같다.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나 또한 연결되어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찬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만 같다.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얼굴 위로 출렁거렸다.

*
글쓴이 : 윤경
생태적인 삶과 자연농 농부로 사는 게 꿈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며, 보다 나다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덟 살 여자아이, 여섯 살 남자아이, 남편과 시골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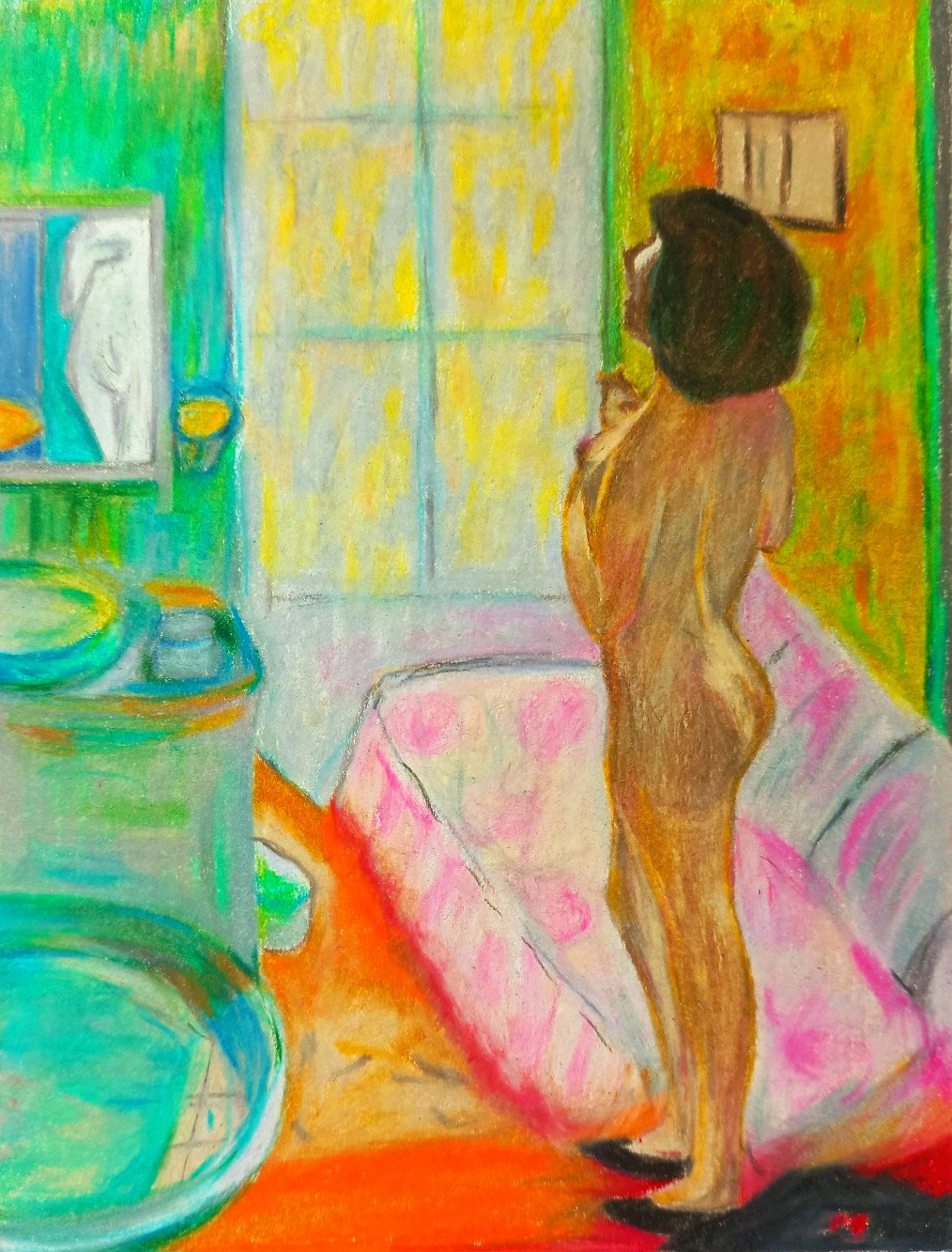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