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며칠 바람이 많이 부는 사월이다. 겨울을 지나 봄에도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분다는 걸 잊고 살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다.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한 우리 집에서 보이는 저기 저 아래, 키 큰 은사시 나무의 둥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새삼 걱정스러울 정도다. 볼 때마다 여전히 끄떡없는 걸로 봐선, 집 짓는 솜씨가 뛰어난 까치둥지인가 보다. 한번 정교하게 지은 집은 태풍이나 폭우에도 끄떡없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저 나무에 멧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걸 자주 보았기 때문에 까치집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내 집 살이에 급급해 저 아래 나무에 앉은 집이 누구의 집일까 하나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까치가 집 짓는데 약 800 ~ 1300개의 나뭇가지를 사용한다면, 멧비둘기들은 약 100여 개 나뭇가지를 이용해 다소 허술한 집을 짓는다고 한다. 게다가 까치 말고 대부분의 다른 새들은 자신들의 둥지를 포식자를 피해 은밀한 곳에 만든다고 하니, 저렇게 높은 곳에 눈에 띄게 지은 건 까치 집인 것이 분명하다. 자연과 어울려 조화롭게 살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한눈에 저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아보았을 텐데, 다 커서 시골 살이를 시작한 나에게는 뭇 생명 하나하나가 새롭고, 모르는 것, 배울 것투성이다.

이른 아침부터 동네 주민보다 더 자주 보는 이웃은 곤줄박이, 참새, 박새, 물까치, 직박구리, 동박새들이다. 언젠가 한번은 오색딱따구리가 정원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 신기했다. 어디서 날아온 걸까, 이게 다 마을 뒷산 덕분이었다. 아니 그러고 보니 경주에 살면서 남산 좋은 것만 알았지, 바로 우리 집 뒷산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뜨끔했다. 꼬박 일 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뒷산을 산책하게 되었다. 여태껏 우리만 몰랐지 동네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게 오르락내리락했을 것이다. 꿩도 지나다니고, 들고양이도, 고라니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름 없는 산을 처음 들어설 때의 낯선 긴장감이 있다. 이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의 흔적을 보고 싶어서 오르는 내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매일 아침 우리 집 정원으로 내려온 새들이 살고 있는 둥지가 이 숲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탐정놀이인지, 소풍놀이인지 아이들이 뭔가 잔뜩 챙겨온 무거운 가방은 결국 우리가 들고 걷게 되었다. 찔레나무길을 지나고 대밭을 지나면 소나무가 많은 자그마한 동산 자락이 이어진다. 까치들이 유선형으로 둥지를 지을 때, 소나무 가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여기서 물어 갔을지도 모르겠다.


탱자나무가 심어진 곳을 지나자 동산 꼭대기 정도에 도달한 것 같았다. 그 주변에 문중 묘소가 있어서 놀랐다. 작고 아담한 무덤들이 노을빛 이불을 덮고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아이들은 탱자 열매를 주워 들고 그 주변을 맴돌며 마을 아래를 관찰했다. 제비꽃이 묽게 번진 것 같은 하늘 아래 부드럽게 넘실대며 흐르는 강을 보았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고, 어느 길로 가야 어린이집이 나오는지 제법 똘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산에 둘러싸여 있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다. 아이들은 이내 친구들이 사는 아파트도 찾아내었다. 논밭 사이에 불뚝 올라선 아파트에서도 우리처럼 지금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자 강 건넛마을과도 함께 살아간다는 묘한 연대감마저 들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마음도 변한다. 작년부터 마을 초입부 오르막 길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죄다 베어진 일이 있었다. 주민조차 모르고 진행된 일이라 몹시 충격적이었다. 까치집은 높은 나무에 짓기 때문에 땅 아래 포식자들에게 안전한 반면 바람에 취약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만 한다. 따라서 까치 둥지는 윗 부분도 덮어 쌓아서 마치 비어 있는 공처럼 생겼다고 한다. 참 지혜로운 새들이다. 나는 베어진 오래된 소나무 숲길이 동산을 넘으면 마법처럼 나타나는 우리 마을을 감싸주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차들이 활주하는 도로로부터 작은 마을을 보호해 주고, 소음과 미세먼지도 막아주었던 거다. 다시 조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은색 가드라인만 번쩍대고 있다.
이제 우리 시골 마을 안 곳곳에도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촌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이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마을 경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건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씁쓸해진다. 어느새 동산 자락 한 부분이 사라졌다. 우리가 산책하던 길은 잘려 나갔다. 찔레나무는 없어졌다. 언젠가 대밭을 밀어대고 있던 포클레인을 멈추고 소나무만은 제발 남겨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조경을 또 한다길래 용기를 쥐어짜 낸거다. 그곳에 살던 말 못 하던 이웃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오로지 저기 까치집만이 겨우 멀쩡하다. 저 나무들마저 베어진다면...

시골 마을의 동산들은 이런 식으로 사라졌었고, 또 사라질 것이다. 멧비둘기들은 자신의 얼굴과 몸이 훤히 다 보일 정도로, 간신히 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둥지를 지어서 살아간다고 한다. 반면 까치는 비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래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암컷과 수컷이 힘을 합쳐 집을 짓기 위해 약 40일 동안 2000번은 넘게 땅과 나무를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반복했을 거란다.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집을 지어 사는 새들은 우리보다 더 월등한 생명체로 느껴진다. 느리더래도 정성스럽게 집을 짓는 이 슬기로운 생명들과 잘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상상이 잘 안된다. 그래도 한 가족의 집, 마을 아니 이 나라가 까치집 같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다. 어리고 약한 새끼를 지키기 위한 강한 집념은 자기 생명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일처럼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보다 긴 호흡으로 지어진 정교한 집이면 좋겠다. 집도 미래도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 지금 우리네 삶의 모양새가 온 생명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록 자본의 힘이 지구를 집어 삼키고 있어도, 끝내 굴하지 않고, 숙련된 까치처럼 모두가 지혜를 맞대어, 보다 생태적이고, 약자를 먼저 돌보는 온기 있는 보금자리를 함께 짓고 싶다.
*
글쓴이 : 윤경
생태적인 삶과 자연농 농부로 사는 게 꿈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며, 보다 나다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덟 살 여자아이, 여섯 살 남자아이, 남편과 시골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yooni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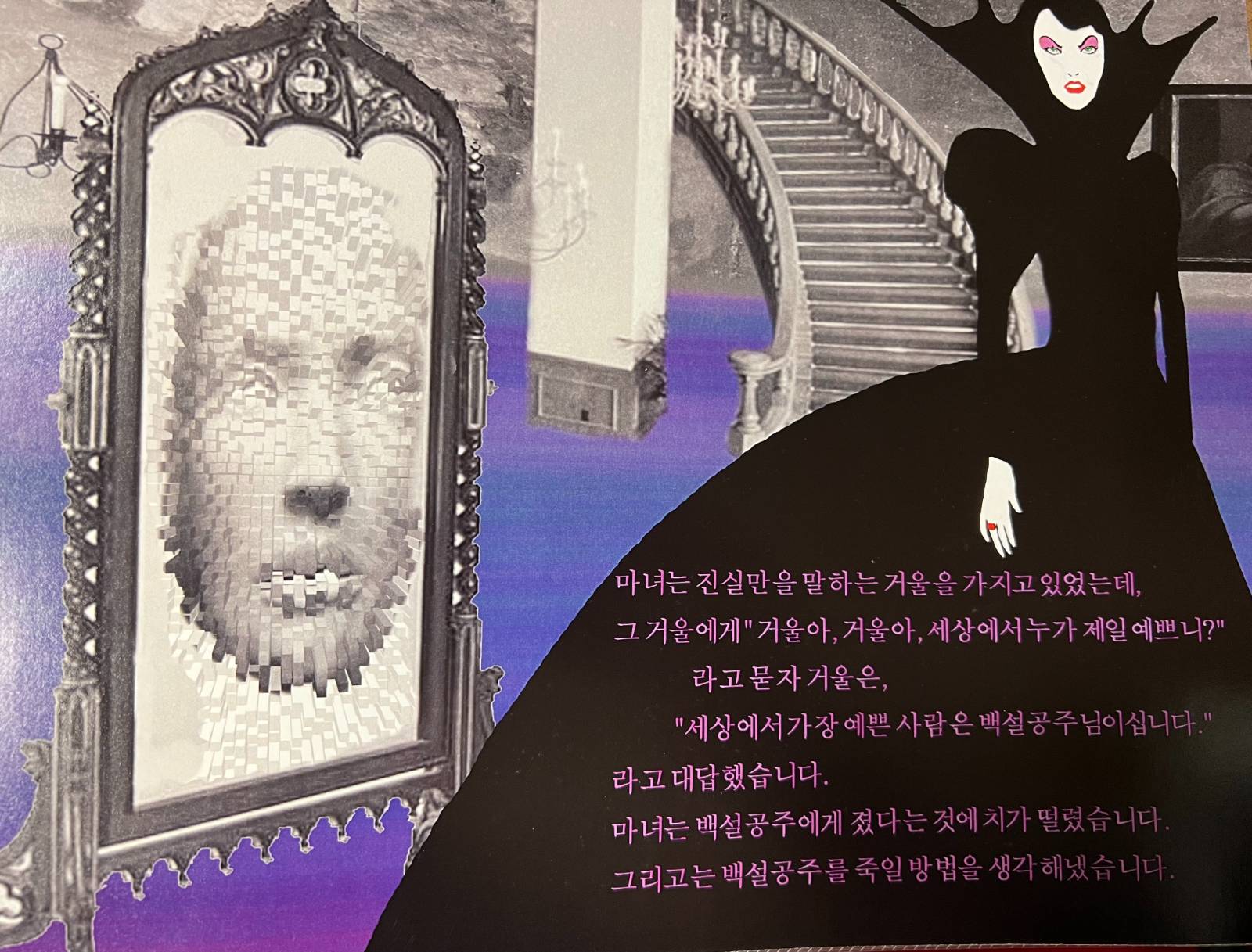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dhosor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면 돈으로 무너지는 우리들 집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꿈들이 모이고 모이고....함부로 베지 못하는 오래된 나무가 연상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