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일. 나는 꼭 친정에 가서 삼겹살을 구우면 혼자서 한 근 이상을 먹곤 했다. 그런 나를 보곤 가족들이 모두 대단하다며 고기를 참고 사냐고 할 정도였다. 이상한 일은 남편과 아이, 그리고 내가 고깃집에서 외식하면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세 명이 먹어봐야 3인분. 아빠가 구워주는 삼겹살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지 않았다. 삼겹살의 기억은 초등학생 때로 거슬러 내려간다.

초등학생 시절, 아빠가 다니던 회사는 정남에 있는 농약 연구소였다. 아빠가 숙직이던 날 우리 가족은 여행 가듯 아빠 회사에 가곤 했다. 일정은 주로 근처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동네 이웃분들과 수박을 따거나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들을 보는 일이었다. 곳곳에 피어 있는 식물과 나무, 꽃의 이름을 아빠에게 물으면 마치 네이버 지식백과처럼 척척 답을 해주는 게 신기했다. 그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알은 채를 하지 않는 아빠였다. 동생과 나는 연구실에 있는 비커나 메스실린더, 현미경을 가지고 놀았다. 밖에서 잡은 개미는 우리의 첫 번째 연구 대상이었다.

아빠가 숙직이던 날 저녁엔 꼭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연구실 앞마당엔 늘 얇은 돌판이 준비되어 있었다. 아빠가 돌판 아래에 불을 피우면 엄마와 세 자매는 그 주변으로 빙 둘러앉아 아빠 구워주는 삼겹살을 먹었다. 아빠의 삼겹살은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아빠표 삼겹살. 나는 도심에서 컸지만 시골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아빠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다. 아빠를 따라다니면 늘 푸른 밭이 주변에 있었고 나무들이 즐비했다. 지금은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1980년대 당시만 해도 보통리 저수지엔 연꽃이 한가득 피어 저수지를 온통 덮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과 친분이 있던 아빠 덕에 반 친구들이라도 데리고 가는 날이면 저수지에서 함께 배를 탈 수도 있었다. 그런 날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빠를 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아빠는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하셨다. 우리 가족은 모두 입이 짧은 편이다. 아빠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늘 맛있는 재료를 구해 오셔서 가족들과 나누고 주변에 친한 지인들, 친척들에게 나눠주길 좋아하셨다. 아빠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나는 그런 아빠의 성향과 정반대 성향인 엄마를 반씩 닮았다. 엄마는 나를 보고 아빠를 더 많이 닮았다 하고 아빠는 나에게 엄마를 더 닮았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반반씩 똑같이 닮은 셈이 된다. 참 공평하게 닮은 나는 나이가 들수록 엄마의 편에서 아빠를 보곤 했다. 우리 집은 사람 좋아하는 아빠로 인해 집안에 사람이 끊일 날이 없었다. 그 덕에 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특별히 낯선 감정을 갖지 않는 편이다. 대신 금세 친해지는가 싶다가도 나름의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곤 한다.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 너머의 선 같은 거다. 내가 줄 수 없는 어떤 감정 앞에서의 선 말이다. 그렇게 나는 아빠도 엄마도 참 공평하게 닮은 딸이다.

아빠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우리 가족을 자주 부르곤 했다. 일주일에 두 번을 봐도 얼굴 본 지 오래되었다고. 삼겹살 먹을 때 지난 것 같은데 왜 오지 않느냐고. 아빠가 맛있는 삼겹살을 사 놓을 테니 언제든 오라는 전화에 나는 자주 바쁜 척을 했다. 오늘은 이런 일로 바쁘고 이번 주는 또 다른 일로, 그러면서 이 정도면 참 자주 간다 싶은데 늘 안 온다고 서운해하는 아빠에게 종종 짜증도 냈었다. 아빠의 목소리엔 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손주들이 하나둘 생기고는 손주들을 데리고 텃밭에 나가는 걸 좋아하셨다. 마치 직장엘 다닐 때처럼 새벽마다 텃밭에 나가 매실이며 마늘, 사과까지 심어 수확하곤 했다. 감자도 캐고 매실나무에 열린 매실도 따게 해주고 싶은데 다들 바쁘다고만 하니 서운함이 쌓였을지도 모르겠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든 하나를 해냈다 싶은 날엔 꼭 아빠에게 전화했다. “아빠, 나 오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가도 돼?” 그러면 아빠는 양손은 가볍게 그저 아이와 함께 얼른 오라고만 했다. 생각지도 못하게 도슨트를 두타임이나 하면서 두어 시간 내내 목을 써서 내심 기특하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과 남편이 회사에서 기획안 발표를 하고 1등을 했던 날도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 아이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엄마, 나 할아버지네 먼저 가 있을게. 아빠랑 엄마랑 준비하고 와.”
“왜? 엄마, 아빠 금방 준비할게. 같이 가. 왜 먼저 가려고?”
“지난번에 할아버지랑 옥상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했었는데 엄마, 아빠 바빠서 못 했잖아. 내가 먼저 가서 할아버지랑 준비해 둘 테니까 엄마는 아빠랑 이따가 와. 알겠지?”
“엄마 준비 거의 다 했어. 같이 가.”
“아니야, 내가 가서 준비할 게 있어.”
“그럼 가는 길에 신호등 없는데 거기 조심해서 건너야 해. 알겠지? 금방 따라갈게”
“응. 사람들 건널 때 같이 건너갈게.”

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텃밭에 가거나 산에 가는 걸 좋아했다. 힘 있게 바깥 활동을 함께해 주는 할아버지와 낚시를 가는 일도 즐거워했다. 그렇게 아이는 먼저 가서 할아버지와 파티를 준비해 두겠다고 집을 나섰다.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손깍지를 끼고 집 앞 장다리 천을 건너가며 그간 발표 준비하느라 근 4개월가량을 온통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봄으로 접어드는 2월의 마지막 주, 친정으로 가는 길엔 따사로운 햇살과 아직은 매운바람이 함께 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덧 어린 시절의 동네 슈퍼에 다다랐다. 맥주와 아이의 주전부리, 큼지막한 딸기 한 소쿠리를 사 들고 친정집 문을 열었다. 바람이 거세지는 한낮의 친정집 옥상에선 숯불 냄새가 났다. 깨끗하게 씻은 딸기와 갖은 야채들을 커다란 그릇에 담아 옥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옮겨 놓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낸 성실한 시간을 아빠의 삼겹살로 보상받곤 했다.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수고했다고 느낄 때, 칭찬받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아빠의 삼겹살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 ㄷ자 하늘을 품은 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안아주는 곳에 늘 아빠가 있었다. 그런 아빠가 구워주는 삼겹살을 한 근도 넘게 먹어 치우던 일. 내게 아빠의 삼겹살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도 같은 거였던 게 아닐까. 받을수록 좋은,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사랑의 맛이 아빠의 삼겹살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는 자주 전화를 걸어오는 아빠도, 삼겹살을 먹으러 오라는 아빠도, 매실 따러 가자는 아빠도 없게 되었다. 늘 곁에 있을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없게 되었다. 있다가 없어진 그 빈 자리를 조금씩 알아간다.

칼 라르손
스웨덴의 국민화가
아버지로 인한 불우한 어린시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만든 좋은 아버지의 표본을 보여준 칼 라르손. 함께 미술을 했던 아내 카린 베르게와 결혼해 8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칼 라르손 작품의 행복한 모델이 되었죠.
'브리타'라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에 대한 애정이 담긴 작품이 여럿 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알게 해 주는 작품입니다.
아빠에게 전화 해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날, 제게는 아빠의 사랑이 그리운 날이 아닐까 싶네요. 칼 라르손의 집은 이케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 글쓴이 - 김상래
도슨트, 문화예술교육 강사. 학교와 도서관에서 창의융합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 대상으로 미술 인문학, 미술관 여행강의 및 강연을 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예술로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를 알차게 살아내고 있다. 현재 여러 권의 미술서적을 집필 중에 있다.
저서 <실은, 엄마도 꿈이 있었어>, <나의 시간을 안아주고 싶어서(공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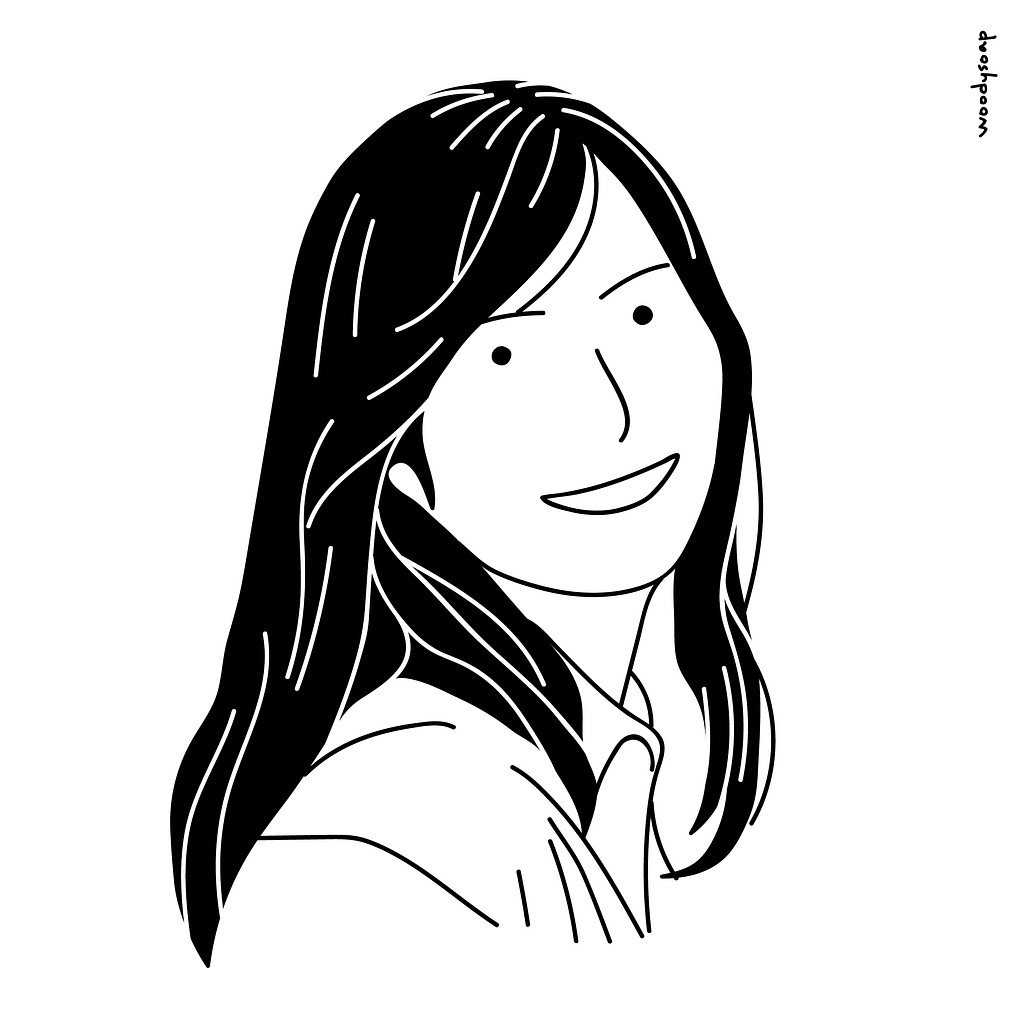


!['바다를 찾는 이유' [당신의 이야기가 한 점 그림이 될 때]_김상래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305/allculture/1684790851480267.jp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