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란 세계 안의 우리들의 구석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중에
큰아이가 막 두 살이 되었을 때, 우리 세 가족은 멀리 이사를 했다. 남편의 일 때문에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였다. 그 특별한 이주를 나는 머리와 몸으로는 받아들였고, 몇 달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서 무사히 이사를 마쳤다. 이제 천천히 적응을 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더이상 집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러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도,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서 낯을 가렸다.
남편이 정식으로 출근을 시작하자 나는 어린 딸과 둘이 남아 하루하루를 보냈다. 보살펴야 할 아이가 있고 가족들을 위해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해야 했기에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나는 그곳에 속해 있지 않은 것만 같았다. 두발도 내 몸도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헛헛한 마음을 달래보려 우리는 일정을 다소 무리하게 조정해서 여행을 떠났다. 셋이서 일주일 정도 지낼 짐들을 차 트렁크에 넣고 미 서부를 달렸다. 차 한 대에 의지해 집에서 500km넘게 떨어진 곳으로 가니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대륙의 스케일이 만들어내는 장관에 감탄하며 여행을 했다. 한국에서 지인들이 먼 길 떠난다고 건네준 노잣돈을 출국 6개월 만에 그렇게 쓴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다섯 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동네에 도착하니 오후 네 시쯤이 되었다. 집으로 가는 골목 마지막 코너를 돌 때였다. 서쪽 방향에 있는 집을 향한 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해는 대지와 하늘 중간쯤에 걸쳐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의 햇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한 건 아니었다. 적당히 권태로웠고 적당히 안온했다. 그 배경 속 저멀리에 우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올라왔다.
'이제 집에 왔구나!'
그때였던 것 같다. 나의 마음도 이제 그곳을 나의 집,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단순히 먼 길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느낀 감정만은 아니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 그 귀가歸家의 길목이 생각난다. 마침내 그곳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거주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살고 있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부모님이 터를 이루고 거주하던 곳이 나의 집이 되었던 것이다. 아주 어릴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내가 집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독립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한 것은 여러모로 기묘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처음 그 집을 만난 후 6개월 동안 그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180여번의 하루들을 살았다. 오래된 아파트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유일한 방에서 매일 셋이서 함께 잠을 잤다. 아침을 맞아 오른편 창으로 들어오는 해를 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하나씩 채워 넣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밥을 해먹었다. 남편이 출근한 낮 시간에는 아이와 둘이었는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를 배변훈련 겸 화장실 변기에 앉혀 두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매일 셋이서 저녁을 먹었고, 어떤 밤에는 근처 도너츠 집에서 아주 달디 단 도너츠를 사오고, 또 어떤 밤은 내가 구운 빵을 먹었다. 매일 밤 아이를 씻겨 내복으로 갈아입히고 잠자리에 누워 책을 읽어주었다.
새로움이 주는 활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주민으로서의 외로움과 불안이 더 컸던 시기였다. 하지만 우리는 몸으로 그런 매일을 살아냈다. 그때 생긴 습관이 하나 있다. 그후로 이사를 하고 새 집에 살게 될 때마다 집에서 아주 구석진 곳에 나만의 은신처를 마련해두는 일이다. 수시로 찾아오는 일상의 괴로움은 어쩔 수 없이 일상 안에서 급히 털어내고 가야한다. 그럴 때 부엌 싱크대 한쪽 끝의 코너나 베란다 세탁기 앞의 목욕의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조금 나아지곤 한다. 엄마로 아내로 살면서 나는 그 집에서 그런 구석의 효용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오래된 아파트는 그렇게 나에게 ‘조개껍질 속’ 처럼 아늑하고 안전한 집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현대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런 고독의 공간, 피난처로서의 공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들의 지난 고독들의 모든 공간들은 우리 내부에서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들의 존재가 그것들을 지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 지붕 밑 방, 다락방이 사라졌어도, 우리들이 어떤 지붕 밑 방을 사랑했으며 어떤 다락방에 살았다는 사실은 남을 것이다. 그 초라한 작은 방들은 조개껍질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공간과 시학> 85p
그에게 있어서 집이란 내밀함의 가치를 가진 곳이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오래되고 낡은 수식어 속에 그려지는 집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아주 어린 존재와 집에 대해 상상을 해본다. 갓 태어난 존재에게 세상은 온통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겠지만, 집은 그를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호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호받은 추억들은 우리의 내면과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후의 삶에서 필요할 때 '기운을 되찾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바슐라르는 말한다.
사실 이렇게 집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는 일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대이기는 하다. 요즘 주위에서 집이라는 말에 바로 따라 연상되는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내 집 ‘마련’, 집 ‘값’ 폭등, 재벌집, 집수리, 오늘의집, 집스타그램 등이 있다. 그 외에 전월세, 임차인, 임대주택, 청약, 금리, 대출, 부동산 등의 말들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를 찾아보고 싶어한다면, 그건 아마도 내게 맞는 조건에서 조금 더 나은 집을 구한다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 또는 집을 좀더 쾌적하게 꾸미는 방법 같은 것일 거라 생각한다. 누구나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하게 아니 그럴수록 집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인류는 정주의 시대를 떠나와 이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하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면 으레 따라 나오던 '가족', '화목' 같은 말들과도 멀어져 가고 있다. 1인 가구 수의 가파른 증가가 이를 말해준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집에서 홀로 또는 함께 살아간다. 화려하거나 깔끔하고 고급진 집스타그램 속 이미지를 벗고 프레임 밖에 남아 있는 집들을 그려본다. 그곳에는 우리들의 일상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권태와 고독과 고통들을 간직하고 있는 구석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석에서 웅크리고 견디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간다.
옛날에 우리들은 물론 그 다락방을 너무 좁다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와서 몽상을 통해 되찾은 추억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이한 융합으로 그 다락방은 작으면서도 크고, 더우면서도 시원하고, 언제나 기운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85p

<빨강머리 앤> 스틸컷
글쓴이 김근영
대학원에서 문화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30대와 40대 초 타국과 타지역에서 거주하며,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가족의 주부로 살았습니다.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 지금, 다양한 공간을 넘어 다니며 의문을 품었던 것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글을 씁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사람들, 장소들과 친밀한 경험을 나눕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소중한 경험들과 그로부터 배운 삶의 가치들을 글로 쓰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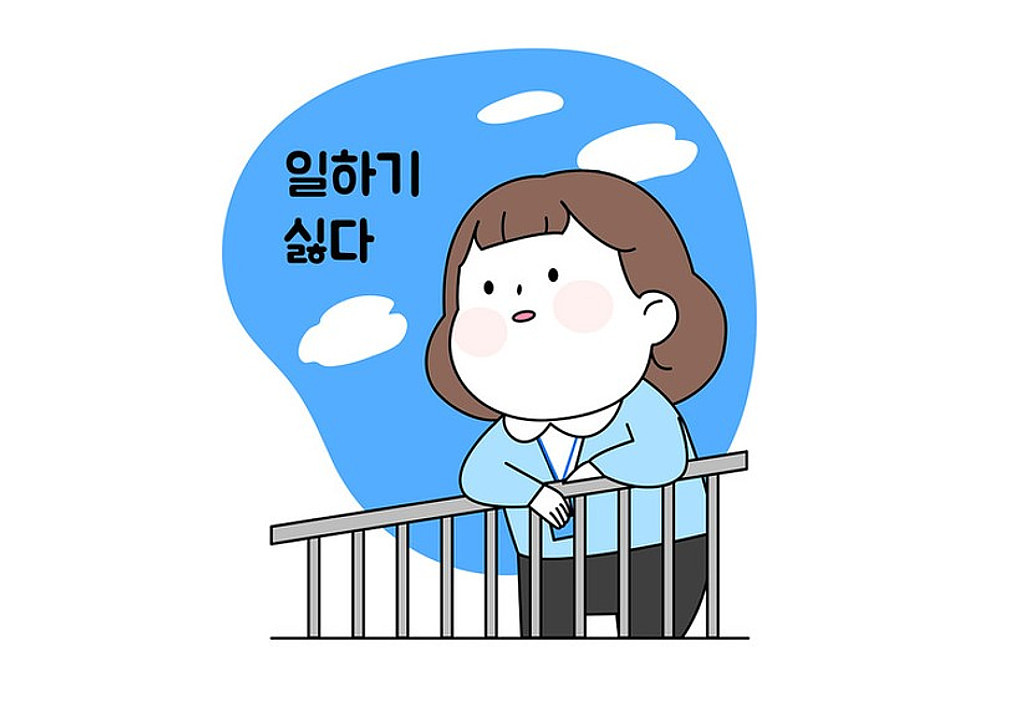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