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다합에 도착하자마자 한 건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였다. 지구를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냥 현지 사람 만나기 좋은 기회인 거 같았다. 한국도 이집트도 발에 채이는 게 쓰레기라 그걸 주워 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준비해 간 봉투들을 한 시간만에 다 채우고 다 같이 해변에 드러누웠다. 이슬람 국기에서 보던 초생달처럼 얄쌍한 칼로 수박을 잘라 먹고 스노클링을 했다.

뿌옇고 인간과 그들이 만든 쓰레기밖에 안 사는 한국 앞바다와 달리 홍해는 총천연색이었고 나와 닮은 구석 하나 없고 자기네들끼리도 다 다르게 생긴 동식물들이 와글와글 살고 있었다. 땅 위보다 넓고 깊은 물속 세계에 감동보다는 겁을 먼저 먹었다. 얕은 물에서만 놀았는데도 픽사 주연 배우들을 여럿 만났다.
뭍으로 나와 다시 드러눕는데 옆 사람이 손수 잎담배를 말고 있었다. 수제냐고 아는 채를 하는데 하쉬시라고 했다. 하시시가 뭔지 물었더니 마치 ‘커피가 뭐냐?’ 고 물은 사람 보듯 얼띠게 쳐다봤다. 긴장을 늦춰주는 풀이라고 했다. 추운 유럽 사람들은 알콜을 마시지만 이집트는 태양의 사람들(진짜다. 태양이 죽여주게 뜨겁다), 피가 뜨겁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고 했다. 한국은 그런 담배가 없다, 우리도 다혈질인데 술밖에 없어 온 나라가 성격이 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시가 없을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집트의 더위를 믿을 수 없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머나먼 나라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가만 두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 더위 한가운데 있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다'를 관용어구로 그냥 두면 좋았을 것을. 다행히 끔찍하게 건조해서 내게 가축 냄새가 나진 않았다. 사막의 여름에는 자비가 없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도 35도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백색가전의 나라에서 나고 자란 나는 에어컨에 ‘성능’이라는 게 있으며, 이게 딸리면 실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쌍팔년도 혼수품처럼 생긴 다합의 에어컨들은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순 있었다. 이걸 신체 어느 부위에 쏘이냐가 관건이었다. 머리라도 식혀볼까 얼굴에 찬바람을 맞고 있으면 코가 꽉 막히고 콧물이 줄줄 흘렀다. 머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채로. 일사병과 냉방병을 동시에 앓는 기상천외한 경험을 했다.

이집트에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원색의 히잡이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공항에는 바둑돌뿐이었다.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돌, 남자는 목부터 발끝까지 흰돌이었다. 그런데 카이로에 내리니 여자들이 형형색색의 스카프를 패션 아이템처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었다. 두건처럼 묶어서 머리카락만 가리는 사람도 있었다. 발걸음마저 통통 고무공을 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집트는 성범죄로 악명이 높다. 인권이라는 게 없다가 싹이 움트면 먼저 피어난 것들의 노리개가 되나 보다. 밥 먹는 내내 자기 나라 욕을 한 이집트 남자에게 난 성희롱을 당한 적은 없었다 했더니 ‘다합은 이집트가 아니다. 다른 도시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내가 머리가 짧아서 남자로 아는 것 같긴 하다’ 고 덧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껄껄 웃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되돌아보는 걸 좋아하는 그와 달리 다합에서 만난 대부분의 남자들은 내게 ‘헤이 브로’ 라고 인사했다. 계속 볼 사이도 아니고 귀찮아서 굳이 ‘헤이 시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테이블 건너 앉은 사람들의 인지 속 나의 ‘상(像)’ 이 성별이 뒤바뀌어 맺혀 있다는 게 신기했다. (변성기가 미처 오지 않은 밀레니얼 아시아 남성) 한국보다도 좁다랗게 ‘여성상’이 정의된 나라를 여행하며 남자들끼리만 하는 악수인지 손뼉인지 모를, 팔씨름 준비자세 같은 인사법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고 살포시 하이파이브를 건넸는데 이제는 덥석덥석 잡으며 나의 상(像)에 부응하고 있다.
쓰다 보니 길어져서 뚝 끊습니다. 다음에는 '상(像)' 에 이어 두개골에 갇힌 뇌가 식스센스를 구사하여 만들어 낸 상상의 공동체가 가진 주술적 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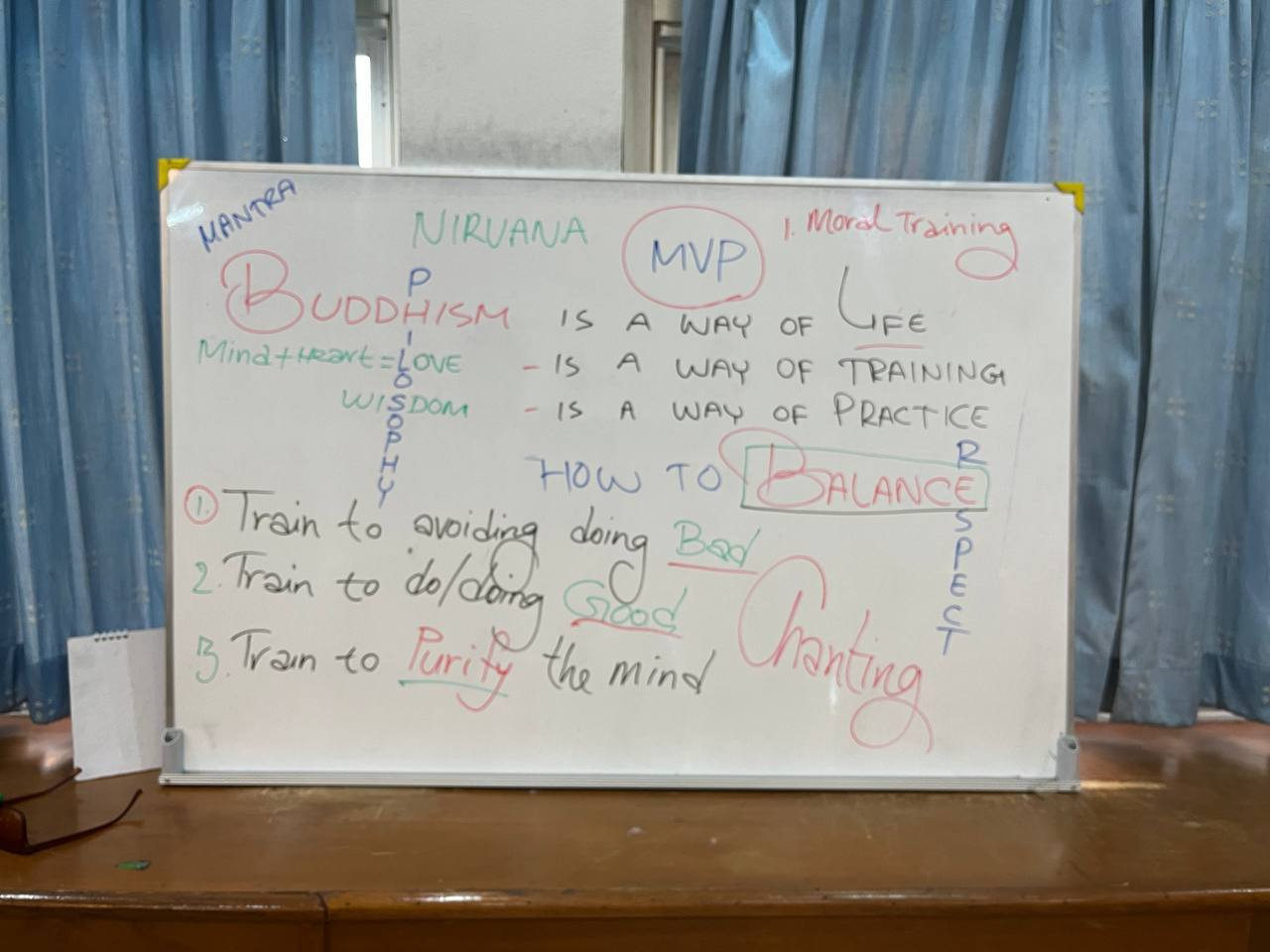




![[직장인 전상서] 월 200 벌기 첫 달성!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407/1720422424665201.jpeg)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