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의 시네마 분더카머
민감한 마음이 당신을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괴인>은 <너와 나>와 비교할 만한 영화입니다. <괴인>에는 기홍(박기홍)이라는 중심축과 같은 인물이 있긴 하지만, 주인공이 타인들과의 맺는 관계를 특정한 단어로 규정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홍과 친구 경준(최경준)의 관계는 우정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까끌거리고, 기홍이 사는 월셋집의 주인인 정환과의 관계 역시 너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그리 친밀한 것도 아니죠. 정환의 아내 현정(전 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 자체가 기홍이 타인과 맺는 관계입니다. 영화의 시간성도 짚어볼까요. <너와 나>에는 미래의 비극적 암시가 현재까지 그늘을 드리우면서 시간과 시간을 포갠다면, <괴인>에서 겹쳐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형형한 현재만이 영화를 타고 흐르는데, 그러다보니 관객은 기홍의 행동과, 대사, 또 타인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가 시시각각 변화,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변화, 생성하는 현재 속에서 기홍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의 내면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이 영화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깊이에 무심한 <괴인>은 대신 한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감지되는 어떤 무드, 공기, 결과 같은 표면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미세한 파동에 훨씬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홍이 현정과 함께 차에 탄 장면에서는 둘을 아직 어떤 관계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도 미세한 감정이 둘 사이에서 교류되고 있다는 것은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동의 흐름을 남편 정환이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애정도, 우정도 아닌, 어떤 친밀한 정서가 허공에서 부유하는 것을 감각할 때, <괴인>의 인물들은 그 정서를 파헤치려 하거나, 명확하게 하려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표면의 층위에서 감각할 뿐이에요.

그 표면의 층위에서 감지되는 감각을 영화적 형식으로 구현한 것이 곧 카메라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의 카메라가 누군가의 시점쇼트를 자주 사용한 것과 달리, 이 영화에서 시점쇼트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점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쉽게 인물의 시선과 일치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보다, 그 인물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모처럼 가족을 만났다가 홧김에 기홍이 아파트 현관으로 나왔을 때, 먼저 차에 탄 카메라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기홍을 담는데요. 롱테이크라 기홍이 차 밖에서부터 운전석에 앉기까지의 시간을 카메라는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기홍이 그 순간 느끼는 감정과 미세한 떨림을 그대로 포착합니다. 현재 그가 어떤 기분인지, 그의 내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은 표면의 층위에서도 고스란히 전달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요.
이런 것을 알아차리려면 감각이 무척이나 예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감한 감각으로 타인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에 내가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고정된 형태로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거예요. 그러니 <괴인>의 기홍을, 정환과 현정을, 하나(이기쁨)를 어느 특정한 캐릭터라고 규정하기 난감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모두 타인이 일으킨 어떤 파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민감함은 <너와 나>가 보여준 ‘당신과의 겹쳐짐’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사랑과 달리 수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태도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괴인>의 인물들이 저마다 타인의 신호에 어떤 식으로 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기홍은 하나가 갈 곳 없는 처지라는 것을 외면하지 못했고, 하나 역시 우연히 기홍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이내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면은 단지 그들의 심성이 착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차 지붕만 구부러졌으니, 망가진 부분만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하나의 물음에 수리센터 직원은 황당해하며 말합니다. “지붕만 어떻게 바꿔요? 기둥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대사는 <괴인>이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하는 일은 어쩌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응답은, <너와 나>의 경우처럼 너를 향한 절실한 사랑은 아닐지 모릅니다. 애정이나 신뢰, 기대와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이 감정은 처음부터 감정화되지 않은 상태, 즉 ‘민감한 감각’ 그 자체에 머무릅니다. 심층을 향하지 않고 표층에서 머무르려는 이 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나쁘게는 볼 수 없을 것도 같아요. 주디스 버틀러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그 민감함은 (타인을 향한) ‘책임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은 타자에 반응하게 되기 위한 자원으로 무의지적 민감성을 사용하는 문제다.” (주디스 버틀러,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옮김, 인간사랑, 2013, 160쪽)
책임감으로 내가 너와 연루될 때, 그때 언어는 뒤늦게 우리의 관계를 해명하는 낱말을 찾느라 허둥댈 거예요. 이토록 민감한 감각은, 아직은 너를 향한 사랑도 애정도 신뢰도 아니지만, 언제라도 신뢰와, 애정과, 사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너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꼭 너의 서사를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 당신 주변에서 배회하는 공기의 미세한 떨림, 당신이 입 밖으로 내쉬는 숨, 고요하게 흔들리는 눈빛에 당신의 편린이 담겨있으니까요. 당신을 알기 위해 내게 이것만이 허락되었다 해도 좋습니다. 이토록 민감한 마음이 당신을 해석합니다. 저는 부지런히 당신의 표면을 응시할 테니, 당신의 심연은 그리스도께서 헤아려주시기를.
![▲ 필자의 다른 글 보기 [이미지 클릭]](https://cdn.maily.so/202301/cff4every1/1674824649090388.png)
[모기영X러빙핸즈 "다문화영화상영회"]

모기영과 러빙핸즈가 콜라보하여 준비한 '다문화영화상영&강연회' 그 첫 시간을 알차게 마쳤습니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를 함께 감상하고 최은 부집행위원장의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는 영국 북동부의 폐광촌, '올드 오크'라는 이름의 펍을 운영하는 주인공 TJ가 마을로 들이닥친 난민 이웃들을 만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영화의 이야기가 깊어지며 곳곳에서 웃음과 탄식, 훌쩍이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다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상영회와 강연회는 9월까지 매월 1회 이어집니다. 참여 신청은 여전히 열려있고,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사랑하는 일은 곧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시간과 물리적 공간마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내가 사랑하거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홀로인 사람이 누구도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새삼 드네요. 그 사랑을 모기영은 건넵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타인의 표면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이 아무리 속 깊은 말을 꺼낸다 해도, 그것은 결국 언어라는 질서로 포획되어서 수면 밖으로 꺼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타인에게 연루되고 연결되기를 금하는 알리바이로 쓰여서는 안 될 겁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타인을 해석하고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모기영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과 영화와 지구, 세계와 타인을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연결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글 : 이정식
편집 디자인 : 강원중
2024년 06월 15일 토요일
모두를위한기독교영화제 주간모기영
주간모기영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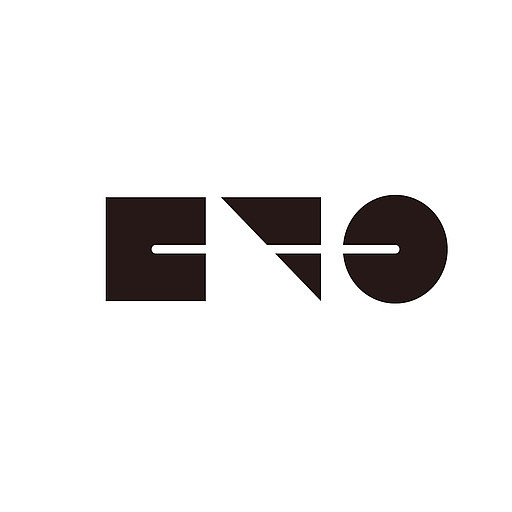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