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모든 서재
jiwoowriter@maily.so
정지우 작가가 매달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뉴스레터
68
구독자
3.11K
마지막 편지
구독자님, 마지막 편지 보내드립니다.
2024.12.31
|
조회 1.84K
[세상의모든서재] 뉴스레터 잠정 종료 및 브런치 연재 안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2024.12.26
|
조회 1.55K
스물네 번째 한 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2024.11.26
|
조회 1.46K
스물세 번째 한 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2024.09.27
|
조회 2.06K
|
1
스물두 번째 한 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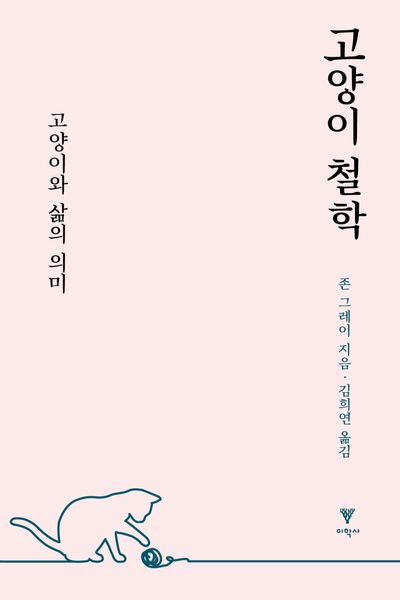
2024.08.16
|
조회 2.75K
스물한 번째 한 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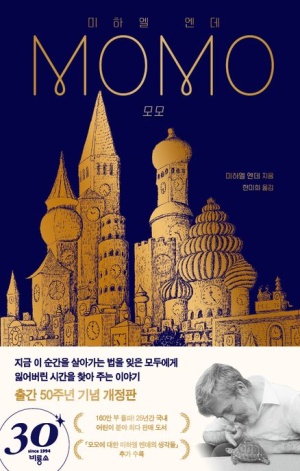
2024.06.28
|
조회 1.31K
스무 번째 한 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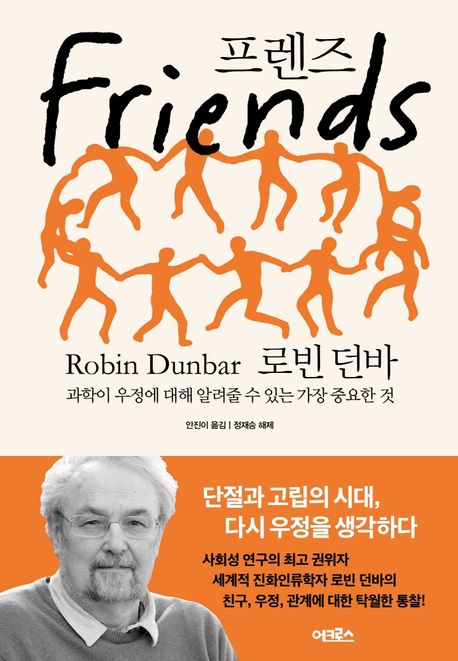
2024.04.30
|
조회 1.54K
|
1
열아홉 번째 한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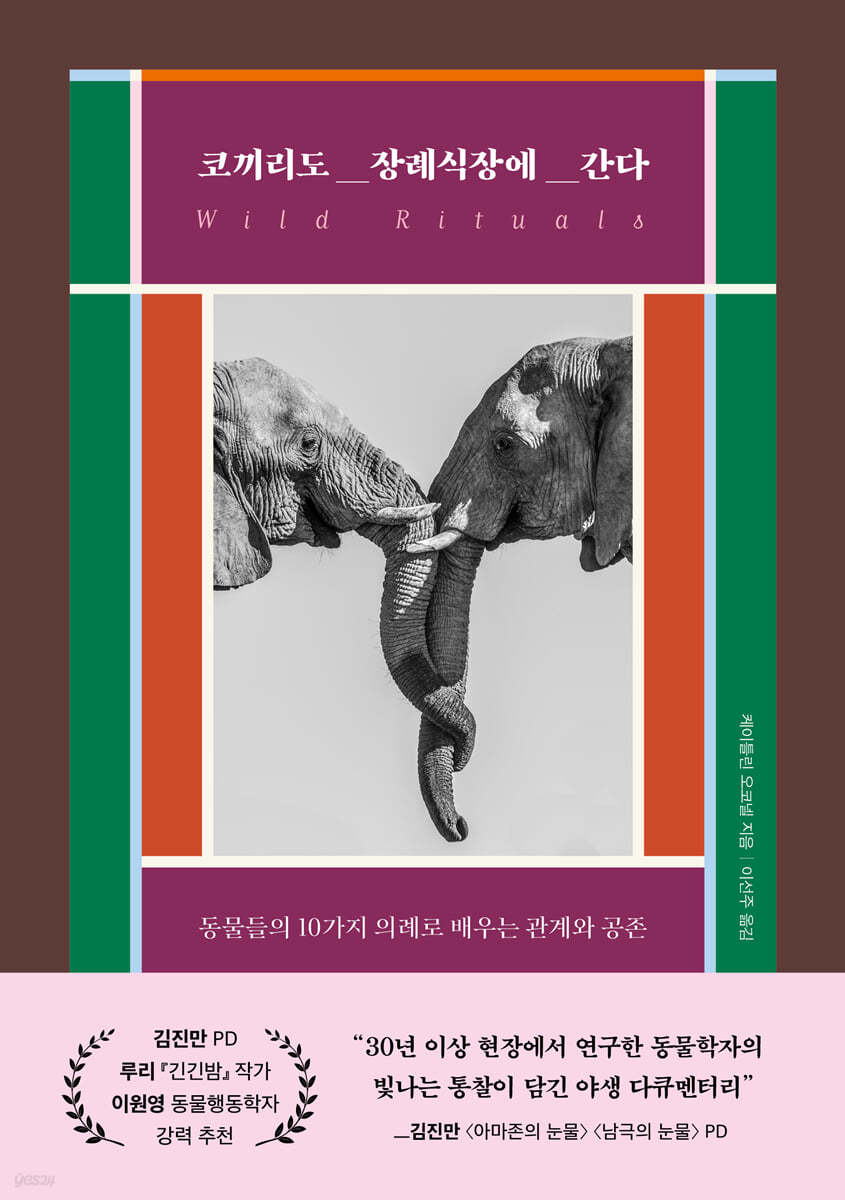
2024.03.29
|
조회 1.35K
열여덟 번째 한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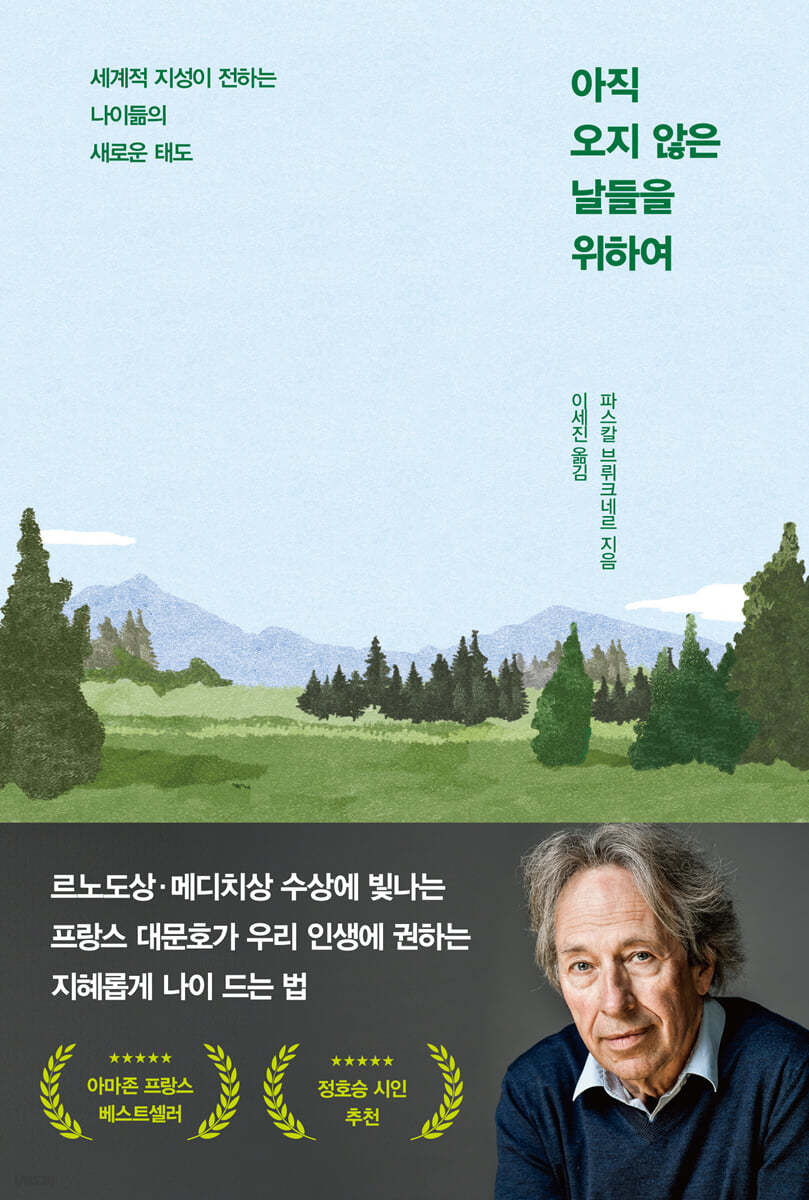
2024.02.08
|
조회 3.17K
|
1
열일곱 번째 한권, 소개 편지.
구독자님,

2023.12.31
|
조회 2.22K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