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를 겪어야만 그 존재를 지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있을 때 잘해라’라는 흔한 말이 일러 주듯. 늘 곁에 있어 그 존재를 모르고 살다가, 부재를 계기로 비로소 그리워지는 대상. 부재는 언제나 공백을 남긴다. 그것은 한때 존재했던 대상의 선연한 흔적이다. 부재는 결여의 감각을 가르쳐 주며, 그 감각에 차차 나를 길들인다.
그것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 같은 파란색과, 인조 잔디 같은 초록색. 두 알의 약을 충분한 물과 함께 삼킨다. 아침을 열 때는 반드시 약 두 알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한다. 약의 유효기간이 24시간에 불과하니 내 몸은 24시간마다 공백을 만들고 또 메우는 셈이다. 이것은 장기에 대한 일종의 작별 의식이다.
나에게는 갑상선이 없다. 나의 갑상선은 호르몬을 미친듯이 뿜어내는 고장난 기관이었다. 마치 탈선을 목표로 씩씩거리며 선로를 질주하는 증기 기관차처럼 감속을 모르는 아이였다. 보통 고장난 것이 아니라서 그걸 떼어 내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했는데, 사실 떼어 내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매한가지였다. 그럼에도 그걸 내 몸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 스무 살 겨울이었다.
처음 내 몸에서 그걸 떼어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는 말을 그 나이에 병원에서 들을 줄은 몰랐기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것은 곧 이제부터 당신은 환자입니다, 라는 때 이른 선고였다. 진료실에서의 5분 남짓한 시간을 사이에 두고 나는 정상인에서 환자로 변했다. 한순간에 환자가 된 것에 이유 모를 머쓱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교복을 입는데 맨 윗단추가 잠기지 않았다. 억지로 잠갔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5초를 겨우 견디고는 단추를 풀고 긴 숨을 내쉬었다. 거울을 보니 웬 혹처럼 둥글고 무거운 것이 내 목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호르몬의 변덕에 따라 눈알이 주기적으로 튀어나왔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양쪽 눈이 짝짝이가 되어 멀리서 보면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다. 목도 눈도 툭 튀어나온 게 딱 낙타 같이 생겼다는 짓궂은 말을 종종 들었다. 좀 과장하자면 해리포터의 '매드아이' 무디 같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안타깝지만 내 눈은 마법을 부리는 법을 몰라 360도로 마구 회전을 할 수도 없었고 투명 망토 속을 꿰뜷어보는 투시 능력 같은 것도 없었다. 한껏 튀어나온 눈을 밀어넣어 보려고 주변 근육을 살살 달래보고 엄지에 힘을 주어 누르기도 했지만 끄떡 없었다.
스무 살 겨울, 대학 합격 발표가 나자마자 수술 날짜를 잡았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돌보았기에 미련은 없었다. 다만 수술 흉터를 남기고 싶지는 않아 꼭 로봇 수술을 하고 싶었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이 정상 크기의 열 배 가까이 커져 있어서 로봇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단 시도는 해볼 테지만, 입안으로 로봇 팔을 넣는 대신 목을 절개하게 되면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나는 의사가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술 전날,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미안한 말이지만 예정했던 수술은 어렵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겠어요. 주변 혈관이 두껍게 자라 있어 과다 출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뒤에 이어질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직 어려서 흉터가 남을 것이 걱정되지만, 안전을 위해 절개해야 합니다.
의사가 자리를 뜬 후, 간호사실 모니터 앞에 앉아 허옇게 염증이 차오른 CT 사진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양손으로 눈을 가린 채 암흑 속에서 울었다. 손을 떼고 다시 모니터를 봤을 때, 눈물이 끝없이 차올라 여전히 앞이 깜깜했다. 내 목 정중앙에 기다란 흉터가 남을 거란 사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걸 지울 수 없을 거란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수술 준비 절차를 안내받고 오른팔에 주삿바늘을 꽂았다. 힘을 주면 팔이 아파 일기를 절반만 쓰고 잠에 들었다.
수술은 무탈히 끝났다.
병실로 옮겨져 폐 속에 남아 있는 마지막 마취제를 뱉어내고 있을 때, 의사가 찾아와 갑상선이 깨끗하게 잘 제거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갑상선이 기도까지 누르고 있어 수술 전 예상했던 8cm가 아닌 12cm를 절개했다고 했다. 이왕 생살을 찢은 마당에 4cm를 더 찢었다는 것이 그다지 슬픈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간호사가 거즈를 제거한 후, 침대에 누워 손거울을 들고 시뻘건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거울 속에는 아픔을 말끔히 닦아낸 선명한 칼 자국 한 줄 박혀 있었다. 그걸 내 처음이자 마지막 문신으로 여기기로 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것이 어떤 색인지, 얼마나 큰지 보고 싶었다. 연한 피부를 칼로 정교히 가르고, 주변 근육과 신경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끊어낸다. 찢긴 피부 사이로 손을 넣어 벌겋고 퉁퉁한 두 덩어리를 조각조각 끄집어낸다. 생전 처음 몸밖으로 나온 주먹만 한 두 개의 갑상선이 꿈틀거리다가 잦아든다. 끝으로, 피부과 의사가 들어와 수술 부위를 가지런히 봉합한다. 반복 재생되는 일련의 장면은 꼭 수술대에 누워 있던 나의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이 생생했다.
홀쭉해진 목을 밤새 쓰다듬었다. 내 손은 분명히 무언갈 만지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감각이 없었다. 병실 문이 열려 복도로부터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잠이 깰 때마다 목을 이리저리 만져봤다. 내 몸에서 그렇게 큰 것이 훅 빠져나갔는데도 멀쩡히 숨을 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생경했다. 쉼을 모르고 내달리던 몸이 일시에 적막해진 기분이었다.
한동안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산화탄소만 겨우 내뱉었다. 졸리다, 라고 짐짓 말하며 정신을 깨워 심호흡을 이어갔다. 비로소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도 음절과 음절 사이의 공백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은 피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호스 사이로 피가 느리게 흘러나오는 것을 종일 지켜보며 멍을 때렸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가만히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고, 목소리를 내려 하면 목이 콱 막혀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이 무서워져 점차 끼니를 거르게 되었고, 손발이 마비된 상태로 몇 시간을 버티기도 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목 근육에 힘을 주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요령을 터득해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마침내는 수술 전과 비슷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공복에 약을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두 알 모두 입안에 넣기 다소 꺼려지는 미운 색인 데다가, 그중 하나는 목구멍으로 넘기기 버거울 만큼 큼직하다.
약을 목구멍으로 간신히 넘기는 순간, 나는 한때 내 안에 뛸 듯 살아있던 장기 두 덩어리의 공백을 메운다. 두 덩어리가 남긴 흔적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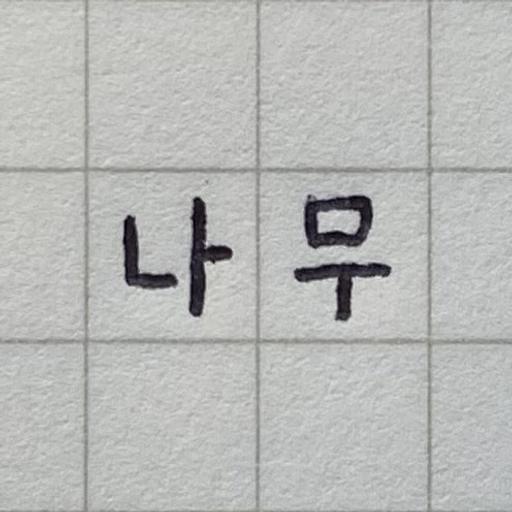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