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에는 무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주 잊고 산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입을 다문다는 것이 때로는 어떤 고함보다도 더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침묵은 거부이고, 저항이며,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2019년 2월, 한 권의 책이 세계를 침묵시켰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밤을 새워 이 책을 읽었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말을 잃었으며, 곧바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읽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읽은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 책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라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일런트 페이션트 The Silent Patient』. 당시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였던 알렉스 마이클리디스Alex Michaelides가 쓴 이 소설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고,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돼 수백만 부가 팔렸으며, 브래드 피트의 제작사 플랜B가 영화 판권을 사들였다.
하지만 보여지는 숫자 만큼 주목 받은 것은, 이 소설이 건드린 것,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막연한 공포, 즉, 우리는 결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낯선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침묵 너머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였다.

출처: Diego San on Unsplash
침묵하는 살인자
2012년 8월 25일, 런던의 어느 밤. 햄스테드. 런던 북부의 고급 주택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사는 동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엔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찢겨 있었다. 원인은 다섯 발의 총알. 가까운 거리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 한 발, 얼굴을 겨냥해 발사된 총알들.
그 옆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색 드레스는 이미 붉게 물들어 본래의 색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바닥에는 그녀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엌칼과 총이 떨어져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쏜 겁니까?”
“······.”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 그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천1백90일간. 6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알리시아 베렌슨Alicia Berenson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재판정에서도, 정신병원의 치료실에서도. 그녀는 단 한 단어도 내뱉지 않았다. 마치 목소리가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생명을 다 해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다. 사건이 있기 전 알리시아 베렌슨의 삶은 완벽했다고. 서른셋의 나이. 재능 있는 화가. 사랑하는 남편 가브리엘 베렌슨Gabriel Berenson, 잘나가는 패션 사진작가. 햄스테드의 아름다운 집. 예술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런데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총알 다섯 발을 쏘아 박았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영원히.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침묵하자 세상은 그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타블로이드는 추측으로 넘쳐났다. “침묵하는 살인자”, “말 없는 광기”, “미스터리의 뮤즈”. 살아생전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침묵에 집착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들. 살인 전에는 그럭저럭 팔리던 작품들이, 살인 후에는 수십만 파운드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녀의 침묵을 해독하려 했다.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을 그림이 대신 말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화제가 된 것은 그녀가 살인 직후, 병원으로 가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자화상이었다. 『알케스티스Alcestis』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그 그림 속에서 알리시아는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 피부는 창백하고 반투명해서 푸른 혈관이 비친다. 양쪽 손목에는 신선한 상처. 그녀는 이젤 앞에 서서 붓을 들고 있다. 붓에서는 붉은 물감이 뚝뚝 떨어진다. 그녀의 입은 벌어져 있다. 비명을 지르는 듯,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지만 소리는 없다. 그림 속에서도, 그림 밖에서도.
알케스티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여주인공. 남편을 위해 죽음을 택한 여인. 그리고 죽음에서 돌아온 후 영원히 침묵한 여인.
왜 알리시아는 자신의 마지막 그림에 그 제목을 붙였을까?

한 남자의 집착
테오 파버Theo Faber는 처음 신문에서 알리시아 베렌슨의 사건을 접했을 때부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범죄 심리치료사criminal psychotherapist였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수께끼였고, 도전이었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린 집착의 대상이었다.
테오는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런던 북부의 정신병원 더 그로브The Grove에 자리를 얻는데 성공했다. 알리시아가 수감된 곳. 알리시아 베렌슨. 침묵하는 여자. 말하지 않는 살인자.
더 그로브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자 감옥이었다. 높은 담장, 철창, 보안 검색. 하지만 동시에 치료실, 미술실, 정원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의 환자들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환자인가? 의사들은 치료자인가, 아니면 간수인가? 그 경계는 언제나 흐릿하고 불편했다.
테오가 처음 알리시아를 만난 것은 정원에서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흔 초반.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생기 없는 얼굴. 그녀는 담배만 천천히, 기계적으로 피워 물었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알리시아. 저는 테오 파버입니다. 새로 온 심리치료사입니다.”
“······.”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답하는 대신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대화는, 아니, 일방적인 독백은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테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테오의 집착은 단순한 전문가적 호기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알리시아와 그 사이에는, 그가 말하지 않는 어떤 연결 고리가 있었다.

키프로스에서 할리우드를 거쳐 런던까지
소설을 쓴 알렉스 마이클리디스Alex Michaelides는 1977년,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지중해의 작은 섬.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역사의 균열선 위에 놓인 땅.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이었고, 어머니는 영국인이었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계 사이에서 자란 소년. 그는 추후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말한다.
“나는 항상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안과 밖 사이에. 그것이 작가가 서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애거서 크리스티Agatha Christie, 마거릿 애트우드Margaret Atwood, 안젤라 카터Angela Carter. 어린 알렉스는 특히 크리스티의 책 표지에 매혹되었다. 검은색과 빨간색. 의문과 죽음의 색깔. 그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And Then There Were None』를 집어들었다. 그 책은 그의 인생을 바뀌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철저히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의 충격. 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독자가 책을 덮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해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그곳에서 그는 연극에 빠졌다. 너무 깊이 빠져서 학업을 소홀히 할 정도로. 하지만 케임브리지의 아름다움, 그 중세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안개 낀 아침의 강, 고딕 양식의 도서관은 그의 상상력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그의 두 번째 소설 『메이든스The Maidens』는 케임브리지를 배경으로 한다.)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였다.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American Film Institute에서 시나리오 석사를 취득한 후 할리우드에서 몇 년간 시나리오 작가로 일했다. 하지만 영화계는 그를 실망시켰다.
“영화는 너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감독이 바꾸고, 프로듀서가 간섭하고, 배우가 대사를 바꿉니다. 작가는 통제권을 잃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온전히, 왜곡되지 않은 채로, 내 목소리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기 전에, 그는 다소 이상한 선택을 한다.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심리치료psychotherapy를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간 정신건강 관련 현장에서 일했다. 추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회고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지, 어떻게 말할 수 없게 되는지. 심리치료는 침묵에 관한 학문입니다. 환자가 말하지 않을 때, 치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다리는 것밖에. 그 기다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경험은 소설 『사일런트 페이션트』의 토대가 되었다. 더 그로브의 분위기, 철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 소독약 냄새와 담배 연기, 환자들의 무표정한 얼굴, 직원들의 피로와 냉소, 치료실의 고통스러운 침묵. 이 모든 것이 소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 마이클리디스Alex Michaelides 출처: The Bookseller
침묵이라는 무기
이 소설이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서는 이유는, 그것이 침묵에 대한 깊은 탐구이기 때문이다.
알리시아가 침묵하기 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만 했다. 심리치료사는 그녀를 진단하려고만 했지 경청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그녀는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한데 그녀가 침묵하자,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녀에게 주목했다. 언론이, 경찰이, 의사들이, 대중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듣게한 것이다. 역설적이지 않은가?
침묵은 권력의 역전이기도 하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노출한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한다. 알리시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추측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수수께끼가 되었고, 미스터리가 되었고, 신화가 되었다.
마이클리디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침묵은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침묵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했고, 자신의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수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는 이 소설을 함께 읽을 것이다. 이번 주(1주차)에는 서문부터 1부까지 읽어보자.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고, 테오와 알리시아를 만나고, 더 그로브의 분위기를 느껴보자.
그림 『알케스티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만약 알리시아였다면? 내가 만약 테오였다면?
1.이번 주에 생각해볼 질문들
- 당신은 살면서 크게 배신 당한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말로 표현했는가, 아니면 침묵했는가?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 침묵이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침묵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을 정말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내면에 당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알아야 할까?
-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돌봄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인가?
2. 읽으면서 들으면 좋은 음악
- 막스 리히터Max Richter의 “On the Nature of Daylight” – 현악기들의 느리고 슬픈 선율. 침묵과 상실의 음악. 알리시아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자.
3. 다음 주 예고
- “말없는 분노 – 고대 그리스 비극 『알케스티스』의 현대적 부활”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신화적 토대를 탐구할 것이다. 알케스티스는 누구인가? 왜 그녀는 침묵했나? 그리고 그것은 알리시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배신과 희생,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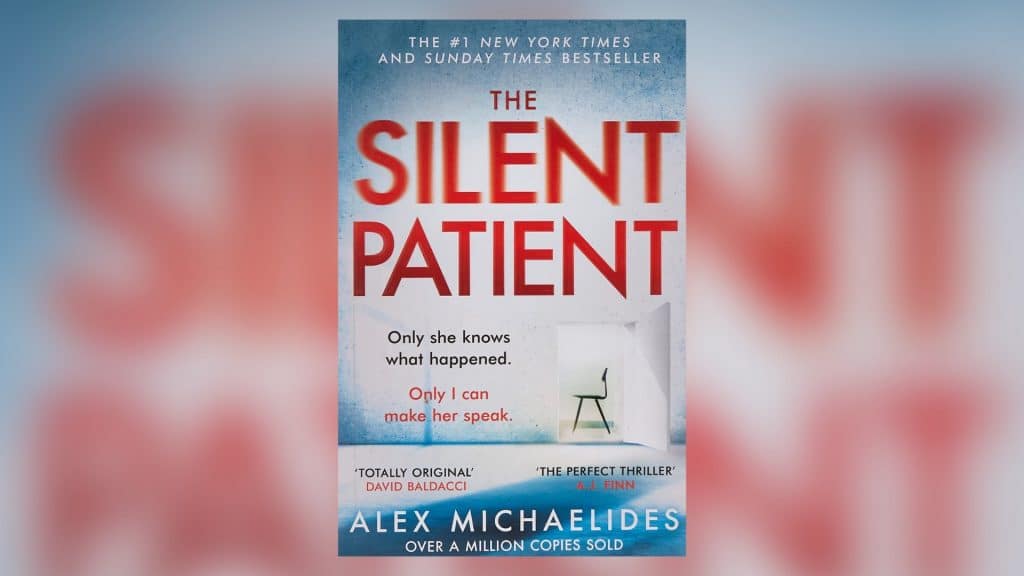
‘추리소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뉴스레터 제목에 ‘추리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영국에서는 범죄를 다루는 소설을 범죄 소설(crime fiction 혹은 crime novel),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중심에 두는 작품을 스릴러(thriller)로 구분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탐정의 추리 과정만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detective fiction’은 전체 범죄 서사의 한 하위 장르로 인식된다.
한국의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근대에 형성된 번역어로, 서구 범죄 서사를 동아시아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 표현은 범죄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적하고 추론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말로, 한자어 ‘추리(推理, 밀 추推, 이치 리理)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을 밀어 올려 이치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정착됐다. 메이지 시대 이후 에드거 앨런 포, 아서 코난 도일 같은 서구 작품이 번역되면서, 영어의 detective fiction을 옮기기 위해 推理小説(すいりしょうせつ) 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 표현이 그대로 한국에 유입됐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거치며 ‘추리소설’이라는 말이 장르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 명칭으로 굳어졌다.
다만 이 명칭은 장르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다. 살인, 폭력, 사회 구조, 인간의 심리와 공포를 다루는 많은 작품들은 반드시 ‘추리’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는 동아시아 독서 문화에서 오랫동안 장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기능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로 이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도 편의상 영국의 범죄, 스릴러 소설 등 더 넓은 장르를 지징할 때도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