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하이를 임신했을 때였다. 햇살이 커튼에 가려진 네모난 창 틈을 따라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새벽녘, 밤새 느껴온 포근함을 단번에 깨뜨리는 고통에 놀라 잠에서 깼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뾰족한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고통이랄까. 침대 밑에 압정이나 바늘이 있었던 건 아닐까, 손전화기 플래시를 켜고 침대 바닥을 살폈다.
찬찬히 살펴보아도 압정이나 바늘은 보이지 않았다. 대체 뭐지? 잠이 홀라당 깰 만큼의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찰나 이불을 들쳤더니 검지손가락 길이만 한 지네 한 마리가 나왔다. 아, 깜짝이야. 지네를 보다니, 와 시골이 맞긴 하구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무젓가락으로 집어 빈 생수병에 넣고 마개를 있는 힘껏 꽉 잠갔다. 나를 공격한 지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 같은 것이리라.
나를 문 지네 녀석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네가 언제까지 사나 한번 보자. 공기도 차단되고 먹을 것도 없는, 꽉 잠긴 생수병 안에서. 내 생각을 읽었나, 지네는 보란 듯이 일주일 넘게 잘 살고 있었다. 지독한 지네 같으니라고. 일주일 동안 생각날 때마다 녀석을 봤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졌다.
집 한구석에 있지만 어디서든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지네가 든 생수병을 보며 내가 왜 이럴까 싶었다. 내 마음 불편한 일을 굳이 왜 사서하고 있는 걸까. 결국 방생도 살생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하다가 쓰레기를 모아 둔 종량제 봉투에 생수병을 깊숙이 찔러 넣곤 매듭 끈을 단단히 묶어 내놓았다. 지네에게 물린 이후 한동안 잠을 쉬이 들 수가 없었다. 지네는 쌍으로 다닌다고 하던데 남은 한 마리가, 내가 잠들길 기다렸다 찾아와 물 것만 같아서.
한밤 중에 두세 번은 깨어났던 것 같다. 플래시를 켜 침대 주변을 촘촘히 확인하고 자기를 몇 날 며칠을 했다. 그러다 보니 낮이 되면 잠에 취해 풀린 눈으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문득 내가 굳이, 또,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었다. 물리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 하곤 그 뒤로 그냥 잤다.
불쑥 은영(가명)이 떠올랐다. 물론 은영이 지네라는 건 아니다. 우리는 종종과 이따금의 경계의 횟수만큼 만나던 사이였다. 우리는 상황적으로 공통점이 많았고, 내면의 말들을 꺼내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 마음의 가시를 뿌리째 뽑아낼 순 없어도, 은영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안의 가시가 조금은 뭉툭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그 당시 대나무숲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은영과 언젠가부터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나면 마음 한편이 꽤 불편했다. 추수 후 알곡이 다 사리진 논을 보듯 허하고 기가 빨린다고 해야 하나.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보니 별생각 없이 던진 그의 작은 말들이 날이 선 칼날처럼 내 마음을 수시로 찔러댄 것 때문이리라. 그가 던진 칼날 같던 말들 중 여전히 흉터가 되어 남은 말이 있다.
유산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엔가 은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는데 대화 도중에 그가 이런 말을 건넸다. “유산해도 좋으니까, 나도 너처럼 임신해 봤으면 좋겠어.” 둘 다 임신에 대한 고민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던 그가 내게 던진 말이었다. 그의 마음도 말도 머리론 이해가 되었지만,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충분한 애도도 못한 상황에 들은 그 말은 너무 쓰라렸다.
나는 수분이 날아가 시들 거리는 상추잎 마냥 지쳐갔다. 어느 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남자에게 이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는 은영과 거리를 두어 보라 했다. 연락을 잠시 멈춰 보라고. 하지만 오는 연락을 막을 수도 없고 대꾸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끌어안고 어려워도 연락도 만남도 차츰 줄이려 노력했다.
몇 개월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은영과 자연스레 만남도 연락도 뜸 해져 있었다. 은영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생기고 나니, 마음 불편할 일도 기가 빨릴 일도 사라졌다. 가끔 나누는 연락이나 만남에 그저 반갑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일상을 기꺼이 응원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여전히 날이 선 칼날이 대화 곳곳에 있었지만, 그와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니 한결 대화의 호흡이 잘 쉬어지는 내가 보였다.
적당한 거리 두기는 꽤 좋은 선택이었다. 마음의 가시는 되려 은영과 이야길 나누지 않다 보니 생각주머니 자체가 커지질 않아 따끔거리지 않았다. 칼날이 아닌 따듯한 온기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들이 곁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큰 발견도 있었다. 지네에게 물리고 난 이듬해엔 지네약을 집 밖 곳곳에 쳤다. 지네약이 잘 들었나 그 후론 집 안에선 지네를 볼 수 없었다. 가끔 밭에서 만나는 정도랄까. 지네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자 소개]
초록, 하늘, 나무, 들꽃. 자연의 위로가 최고의 피로회복제라 믿는 사람. 퍽퍽한 서울살이에서 유일한 위로였던 한강을 붙들고 살다, 시골로 터전을 옮긴 지 8년 차 시골사람. 느지막이 찾아온 줄줄이 사탕 5살 아들, 4살 남매 쌍둥이, 3살 막내딸과 평온한 시골에서 분투 중인 어설픈 살림의 연연년생 애 넷 엄마. 손글씨와 손그림, 디자인을 소소한 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고’라는 인생 주제를 이마에 붙이고, 주어진 오늘을 그저 살아가는 그냥 사람. 소박한 문장 한 줄을 쓸 때 희열을 느끼는, 쓰는 사람.
그대여.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쓰고뱉다]
글쓰기 모임 <쓰고뱉다>는 함께 모여 쓰는,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글쓰기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존재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닉네임을 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존재의 언어로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글쓰기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로 발송되는 글은 <쓰고뱉다> 숙성반 분들의 글입니다. 오늘 읽으신 글 한잔이 마음의 온도를 1도 정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보러 가기’를 통해 본문 링크에 접속하여 ‘커피 보내기’ 기능으로 구독료를 지불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뉴스레터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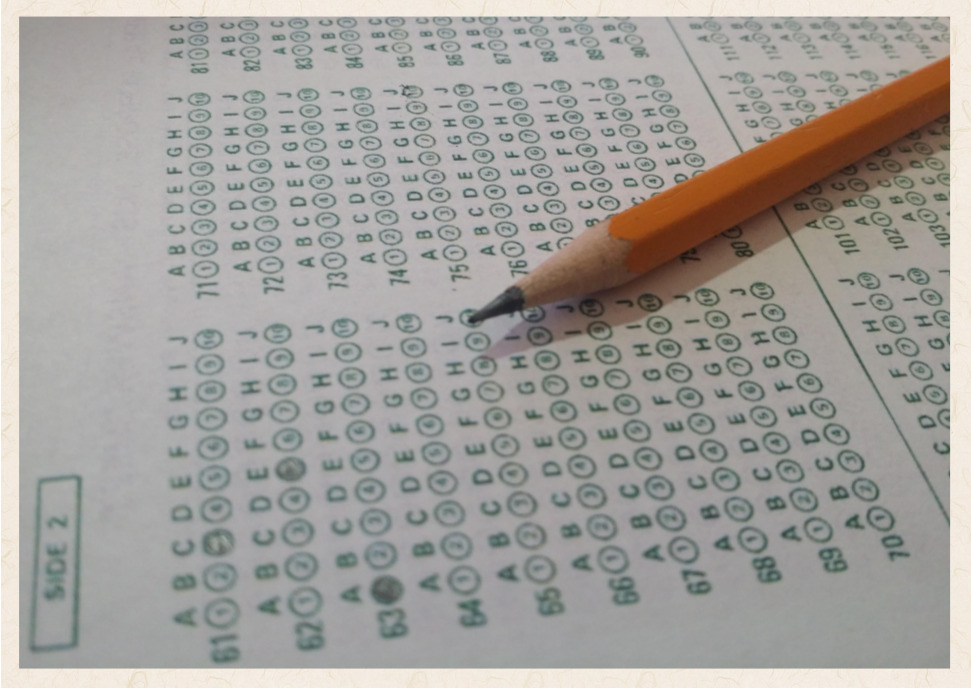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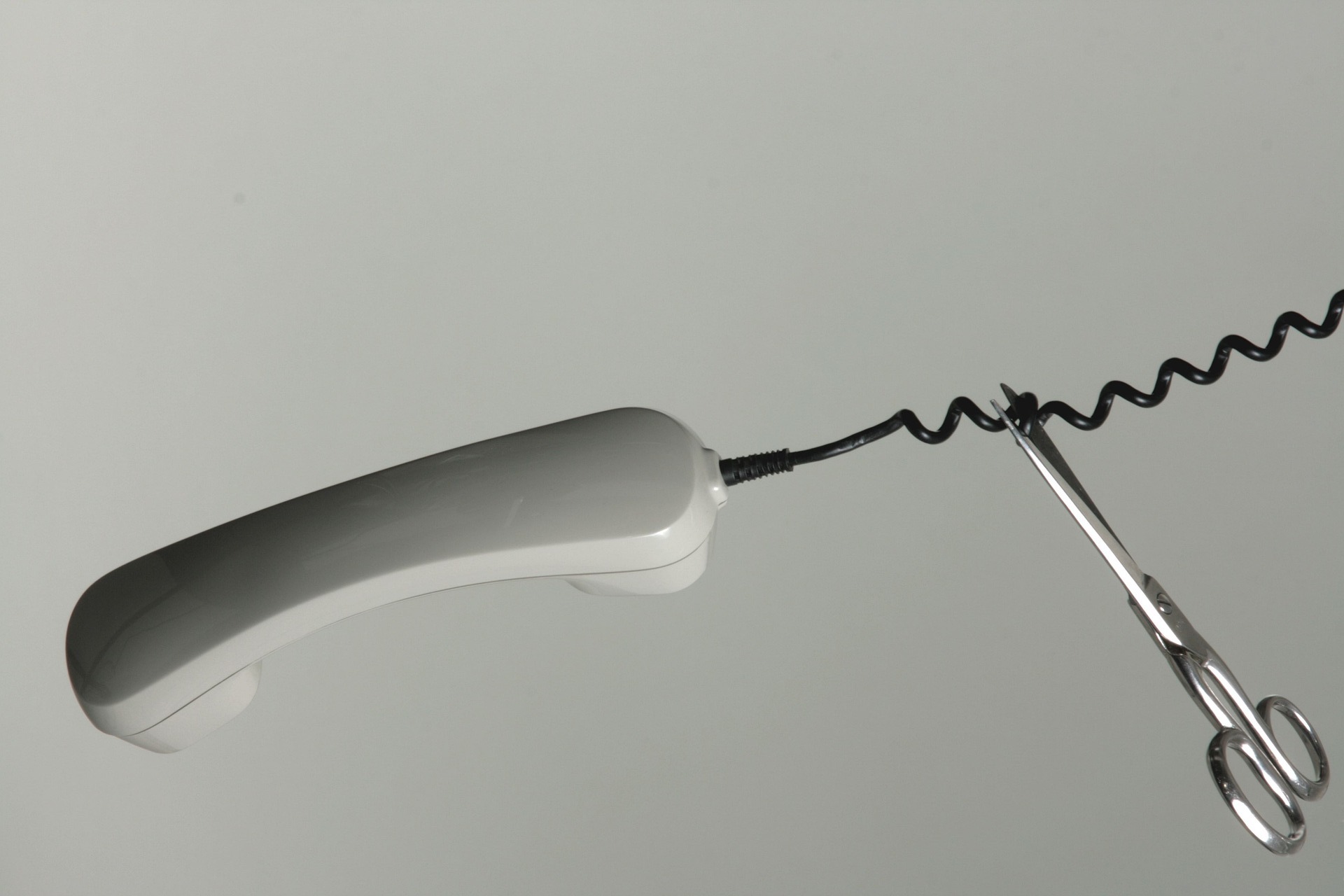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쓰니신나
적당한 거리... 마음에 새겨야겠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