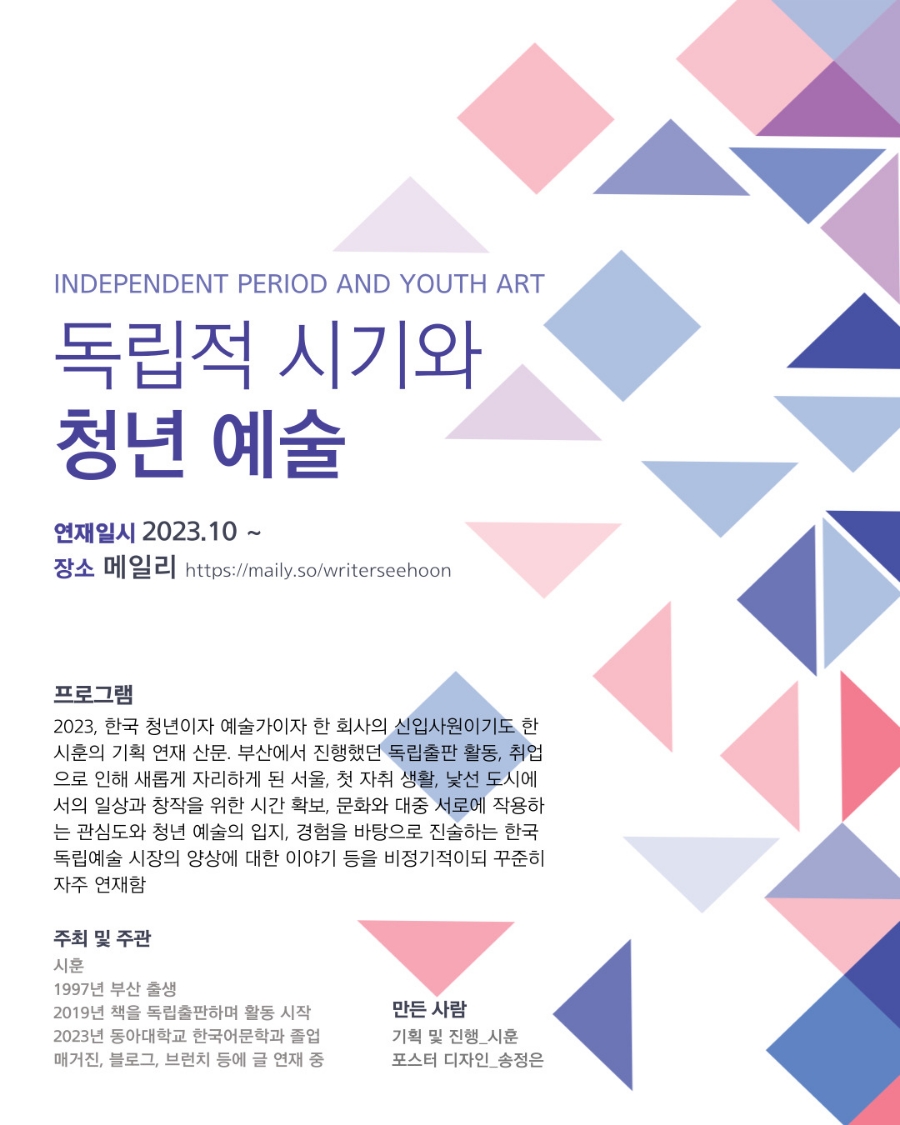
*
내가 살고 있을 동네에 놀러 와.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을 알릴 때 잘 지낼게라는 말보다 놀러 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네를 잘 알아놓아 누군가 오면 구경시켜주겠다는 약속 같았다.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울살이 첫째 날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이 동네에서 잘 지내야겠구나. 괜히 친구들이 지금쯤 내가 어떨지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듯 막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낯선 곳에서의 불안을 감추는 웃음이었다. 군 입대 혹은 중요한 경기를 앞둔 누군가가 잘 다녀오겠다며 주변에 애써 보이는 그런 웃음. 놀러 오라는 말은 그 웃음 같은 것이었다. 방에 정적이 감돌았다. 창밖은 그런 정적과는 무관하다는 듯 사람과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다음 웃음은 친구들을 환영하며 지어 보이자고.
*
타지에서 처음 지낼 때 우리는 지도 앱을 켜고 보면서 길을 다닌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지리에 밝아지면 지도를 끄고 풍경을 더욱 보게 된다. 못 보고 지나쳤던 가게들을 알게 되고, 길을 찾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선이 확립될수록 좀 더 삶의 여유를 갖게 되는 셈이다.
- 2019년 여름. 이탈리아 몬차에서.
유럽 여행 도중 일기에 그렇게 썼다. 당시 여행자의 입장이었던 나는 서울에서도 비슷한 처지였다. 전입 수순을 밟았지만 아직은 여행자에 가까웠다. 아는 길이 적었고 지도 앱을 켜서 돌아다녀야 했다. 반면 고향에서는 유유자적이 돌아다녔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까지 아는 전문가였다. 동네에 관해서는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우리 동네, 나의 동네라는 표현은 그 자신감에 기인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동네에서 살아야 하고 자신감도 다시 키워야 했다. 앞으로의 서울살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었다. 언제부턴가 당당히 부산을 나의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훗날 서울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건 마치 지역을 옮겨 다녀온 예술가들의 사고방식 같았다. 그들의 작품 속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었고 묘사하는 주체는 당연 본인들이었다.
*
다큐멘터리가 있다.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 등 그들의 일생을 다루는 영상에는 그들이 지낸 방, 훈련장, 연구실 뿐만 아니라 동네가 다뤄진다. 카메라맨은 그 동네를 다니면서 영상에 담아낸다. 시청자는 그 시선을 공유하며 동네를 걸어 다니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지는 인물은 주민이, 시청자는 여행자가 되는 셈이다. 여행자는 산책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체험해 보게 된다. 그 사람이 걸었던 길, 자주 갔던 카페, 애정하던 풍경. 따라 거닐어 보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네보다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지냈나. 어떤 취향과 동선을 나타냈는가. 동네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는가.
*
해가 지자 가로등에 불빛이 들어왔다. 퇴근한 사람들이 보였다. 몇몇 오피스텔 창문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동네가 낮과는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동네는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내어주고 있을까. 세븐 일레븐, 빵집, 맥줏집 등이 나란히 놓여있는 길가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공원에는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연인은 음식을 포장해서 들고 사이좋게 걷고 있었다. 강변에서는 조깅을 하는 무리가 박자에 맞춰 뛰어가고 있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네를 누비고 다닐 내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빵과 커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을 수도 있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식재료를 사러 갈 수도 있겠지. 퇴근하고는 영화관에서 시간을 때워도 좋겠다. 동네에 적응하고 난 후 여유를 부려 볼 생각에 설렘이 일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마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는 어떤 각본을 쓰게 될까. 잘 살아보고 싶다.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
*
친구들은 어떨까. 나는 그들이 사는 동네로 종종 놀러 가곤 했다. 맞이해준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그 동네를 구경했다. 특정 장소에 자신감 있게 데려가는 그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맛이 아주 좋은 식당이라던가, 자신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던가, 타지에 온 내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고른다던가. 그 유유자적한 모습들은 안부와도 같았다.
여행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나는 동네보다는 그들이 잘 지내는가를 더 궁금해했다. 적응은 잘 했는지. 그들답게 잘 지내고 있는지. 최근에 나온 그 영화는 봤는지 등. 새로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취향과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의 삶이 여기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동네를 제법 알게 된 것만 같았다.
여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생각해 봤는데 네가 있어서 그렇구나.
서울에서 산 지 약 1년이 지난 여름, 나를 보러 온 친구들이 동네를 거닐다가 한 말이었다. 부산에서 자주 모이던 세 명이 눈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 오피스텔과 식당들이 내뿜는 불빛들 사이에서 걷고 있는 그 모습은 이색적이었으나 이내 우리는 금방 익숙해졌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친구들은 나의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직장은 어떤지, 동네에서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등.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말하던 나는 생각했다. 우리의 존재감은 서로에게 저 빌딩보다 큰 게 확실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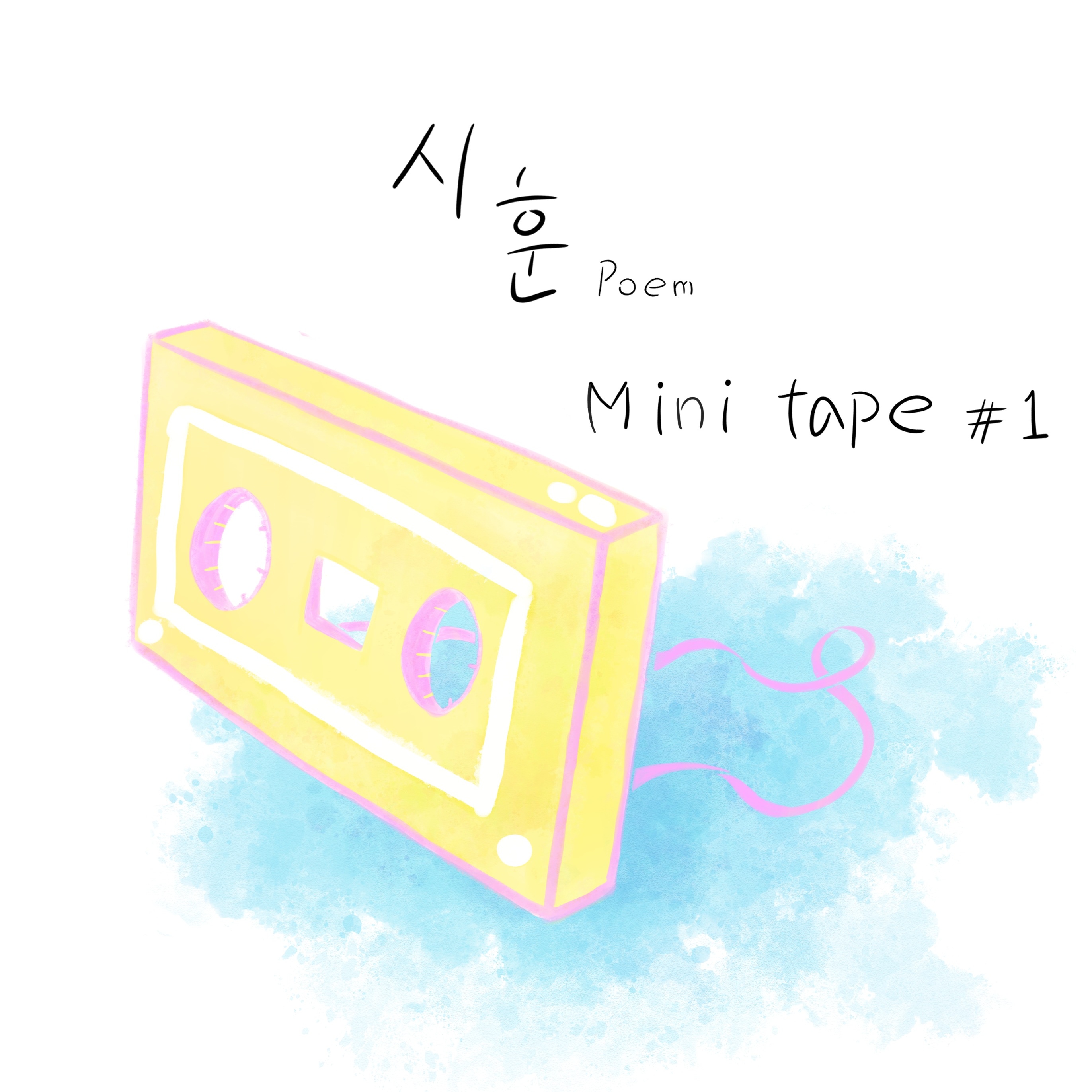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