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잠이 많다. 움직이는 것 보다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 이불 속에서 엎드려 그림을 그리거나 베개에 비스듬히 기대어 그림 그릴 때도 많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그림에 반영되기가 쉬워 그런지 내 그림들 중 잠자는 모습이나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꽤 있다. 아홉 번째는 무슨 얘기를 써볼까 고민하며 잠에 들던 밤, ‘잠’에 대한 그림들을 모아 봐야 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여러 장의 그림을 파일들 속에서 찾았다. 꽤 오래된 그림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 그림들도 있다.
![[보름달 뜬 밤] 2016](https://cdn.maily.so/zh0s7kb0uiidsjrkeby7drjole97)
2016년이라니 세월이 놀랍다. 거의 초창기의 내 그림이다. 인공 조명이 없는데도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와 봤더니 보름달이 떠있었던 옛 기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꽤나 자유롭게 그린 흔적들이 보인다. 예쁘게 잘 그려야지 하는 마음도 없이 정말 순수히 즐겁게 그린 시절이었다. 지난 얘기에서 썼던 얘기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잠에 든 내 옆에 노트와 펜이 있다. :) (여덟 번째 글을 확인해 주세요.)
![[잠이 안 와서] 2017](https://cdn.maily.so/2703my96pjfnxrklmb9y8m1ap3j1)
당시의 나는 무슨 노래를 들으며 잠에 들길 기다렸을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어폰을 꽂고 잠들길 기다리다가 영 잠이 안 와서 베개에 기대어 앉아 아이패드를 켜고 그런 내모습을 그렸던 밤이다. 오래된 그림들은 어설프지만 또 그래서 풋풋해 보인다. 남들 눈엔 어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린 나만 아는 어떤 애틋함이 있어 아끼는 마음이 든다.
![[아침에] 2018](https://cdn.maily.so/5zyccrab65r4ui4ygmsd0nfhn0fs)
지금은 내 옆에 없는 고양이. 몸이 아파서 일찍 내 곁을 떠난 고양이지만 그림 속에는 함께 한 그 시간들이 그대로 있다. 나는 동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고양이만 그린 것 같다.
![[아침해가 깨울 때까지] 2021](https://cdn.maily.so/vhmp8xf44134ydjfupcslpdneuvb)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던 어느 여행지의 숙소 풍경에 자는 사람을 그려 넣었다.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건 늘 어렵다. 하얀 침구가 햇살을 받으면 어떤 색인지, 그늘진 부분은 어떤 색으로 채워야 하는지 아직도 어리둥절해 질 때가 많다. 다채로운 색을 결합해 기가 막히게 현실을 현실보다 아름답게 재현해 낸 그림을 보면 놀랍고 부럽다.
![[낮잠] 2021](https://cdn.maily.so/2iy8eizwqmnocpyildswxs0jh98q)
햇살이 실내로 들어오는 시간이 참 좋다. 따스한 햇살은 하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은총 같아서, 그 따스함이 집 안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하고 싶어 커튼을 열어 둔다. 따스한 햇살이 이불 위로 내리쬐던 날 평온한 낮잠을 자던 모습을 그렸다. 디지털인 다른 그림들과 달리 이건 수채물감으로 종이에 그렸다.
![[잠결에 들은 빗소리] 2021](https://cdn.maily.so/3rb68oyt9lj981372v6zng00zdv0)
대학 앞에서 자취하던 어느 여름날, 창문을 삐끔 열어 두고 자다가 들은 빗소리를 그린 그림이다. 밤 빗소리 하나로 행복감을 느끼던 소녀 감성이 내게도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세상 모든 일에 무덤덤해 지는 건 좀 별로다. 별거 아닌 일에 기쁘고 행복해 하던 마음을 간직하며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나를 향한 지겨움을 딛고] 2021](https://cdn.maily.so/axrvalhwix1sc7voyri8lgz74yy3)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다. 나 자신의 맘에 안 드는 고질적인 부분이 또 문제가 되어 내게 찾아올 때. 나 자신이 지겨워 지는 날.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싶어 무기력에 빠지는 날. 이불 속으로 숨어 버리고 싶은 날. 그런 감정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 상태로 이 그림을 그 속에 가두면 다시 이 그림이 보기 싫어 질까봐 제목은 다르게 정했다. 열린 결말처럼 ‘나를 향한 지겨움을 딛고’ 라고. 딛고서 언젠가 이불 속에서 나와 성큼성큼 걷는 주인공을 상상하면서. 그런 나를.
비슷한 주제로 그린 그림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봤어요. 서로 다른 시기에 그린 그림들을 모아본 적은 별로 없는데 제 나름대로는 꽤 재밌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던 시기의 제가 기억에 떠오르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해온 그림 스타일을 볼 수 있기도 했어요. 구독자님은 오늘 글과 그림 어떠셨나요, 부디 좋은 잠에 드는 밤 되시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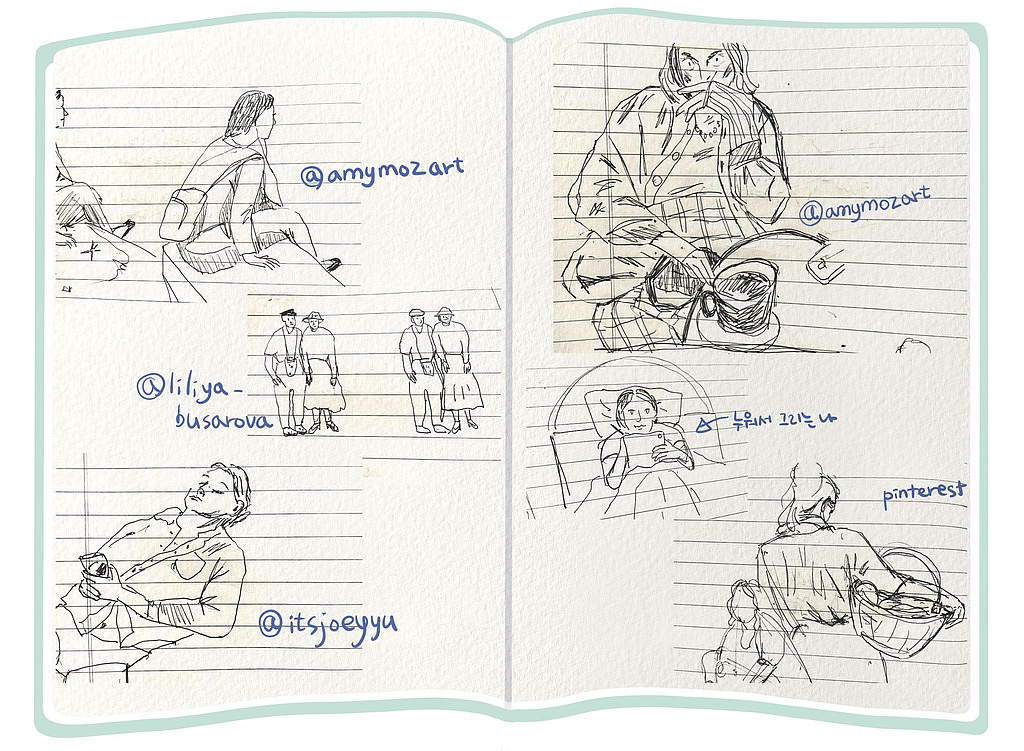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