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필름 카메라. 하프 카메라여서 36장 필름 한 롤을 사면 72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흐릿하고 눅눅한 색감이 날 때도 있었지만, 빛이 적당하고 피사체가 좋을 때 가끔 참 예쁜 사진을 얻을 수도 있었다.
아마 학교 가던 길이었나 보다. 자취방에서 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방향에 보이는 풍경이니까. 붉은 대문과 풍성한 초록 나무가 대비되며 늘 보던 풍경이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다. 구름이 살짝 무거운 하늘이라 땅의 색이 더욱 짙었다.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겠지. 그리고 한 쪽 눈을 찌푸리고 조그만 뷰파인더로 풍경을 내다본 후 딸깍. 장난감 버튼 같던 셔터의 가벼운 딸깍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리고 지익지익 필름을 돌려놓으며 다시 가방으로 카메라를 넣고 가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며 그림을 그렸다. 보는 이들은 사각 프레임 안에 담긴 풍경만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 골목을 매일 거닐던 나는 사진의 좌우앞뒤로 확장된 기억들이 뻗어나간다. 이 길을 지나면 횡단보도가 나오고 길을 건너면 후문이 나왔지. 건널목 앞 작은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되었을까, 큰 길가에 있던 마트는 아직도 장사 잘 되려나? 양을 듬뿍 주던 빙수가게와 동네 피자집, 문구점.. 잊고 있던 사소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정을 붙이고 살았던 동네라 애틋한 마음이 있다. 졸업할 때, 정들었던 도시와 이별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 내게 기억에 남는 장소와 사람들을 하나하나 꼽아보기도 했던 곳. 아마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 너무 휘황찬란해지진 않았겠지.
다시 가볼 날 있겠지. 골목의 작고 예쁜 동네 카페 하나 찾아서 커피 한 잔 하고 싶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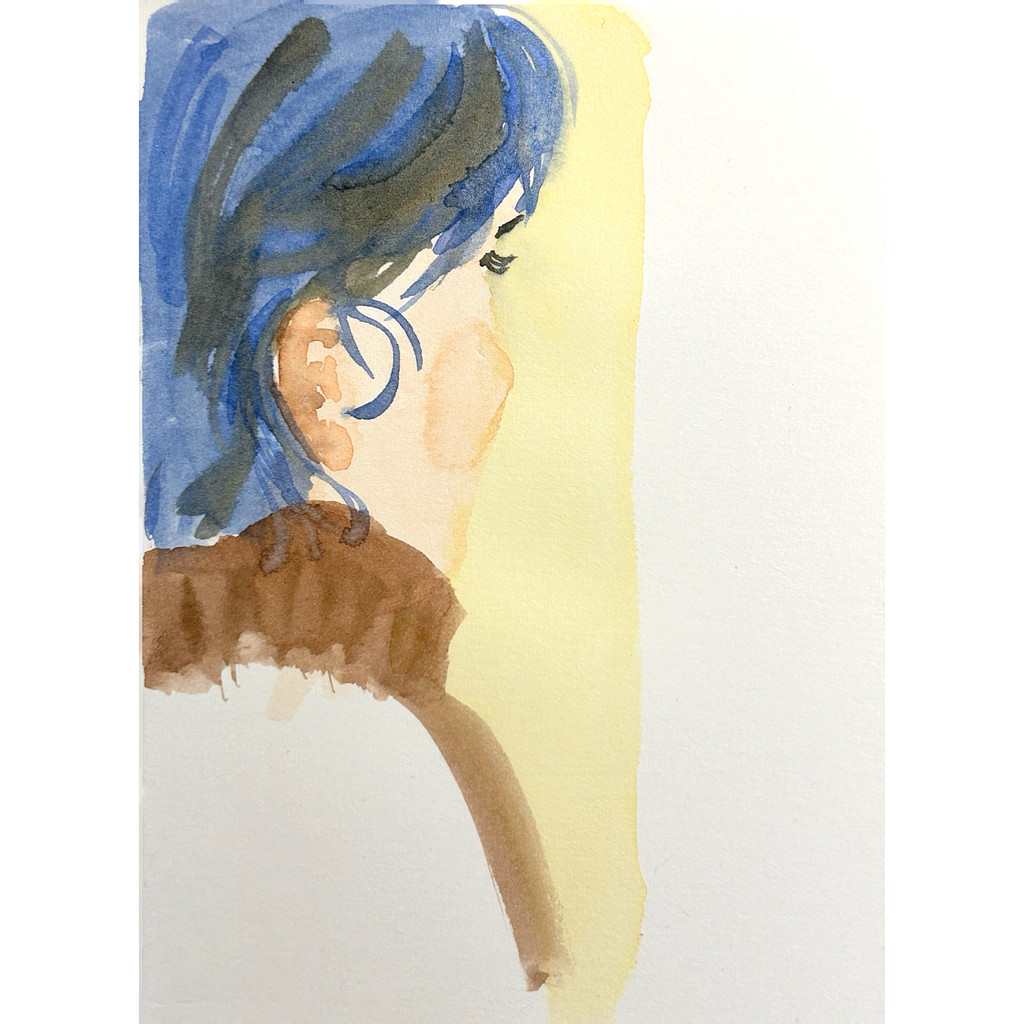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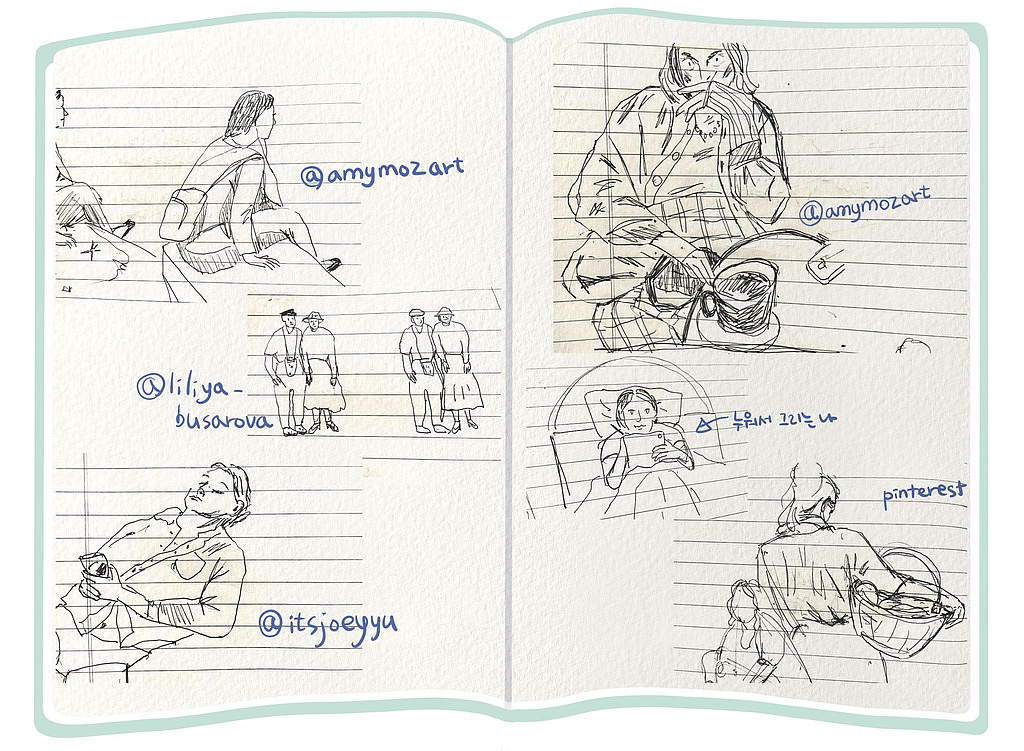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