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요일들> 필진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한 일련의 글을 써보자, 도서관에서 이름만 보고 믿고 책을 집을 수 있는 작가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고 계획을 했었다. 이번 달, 내게 C.S. 루이스가 찾아왔다. 교회 성경공부 모임에서 만난 한 자매에게 나니아 시리즈 중 한 권을 선물로 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모임에서 독서 숙제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The Screwtape Letters>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둘 다 C.S. 루이스의 걸작으로 꼽히는 책이다.
1898년에 태어나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평생을 살았다. 무신론자였으나 후에 기독교에 귀의했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의 기독교적 색채 소설들과 <네 가지 사랑>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의 기독교 변증적 작품들을 썼다. 그의 작품 세계는 북유럽 신화(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와 우주 공간(우주 3부작)까지 넘나들었다. 이렇게 책 제목을 나열하다보니 다시 모두 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나의 작가 리스트에 처음부터 포함된 작가는 아니었다. 물론 좋아하고 또 즐겨 읽지만 내가 감히!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는 너무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다.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본조차 다 읽지 못했고 루이스가 애정했다는 우주 3부작 중 하나인 <페럴랜드라>는 읽다가 코를 박고 잠이 들기도 했다.(잘못된 번역 탓이라고 믿고 싶다.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보리라)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작품은 <나니아 연대기> 책들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런던의 아이들은 폭격을 피해 부모와 떨어져 시골로 피신했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없던 집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방도 뒤지고 옷장 속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았을까. (나도 어릴 때 옷장 속에 들어가 혼자 놀았던 경험이 있다. ^^) 그렇게 옷장 속으로 들어가 나니아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책이 시리즈 중 가장 먼저 쓰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다.
개인적으로 외전 형식의 <말하는 말과 소년>이나 나니아의 종말이 나와있는 <최후의 대결>을 가장 좋아한다. 모든 나니아 시리즈에는 기독교의 정수(선과 악, 구속과 타락, 죄와 벌, 삶과 죽음,창조와 종말까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어떤 선교사님은 학교에서 ‘나니아 북클럽’을 운영하시기도 한다) 특별히 <최후의 대결>에서 루이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아름답게 소설 속에 녹여냈다. 이 책을 읽으며 그 당시 어렸던 딸에게 이데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대학에 가서 서양 철학을 배운 딸은 나와의 대화가 기억이 나더라고 했다. 나니아는 자녀와 그런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책이다. 후루룩 읽어버리기에는 부담이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심심한 판타지만 여러 번 읽다보면 마음 속에 저장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는 문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항상 영화는 소설의 함축적 표현을 다 따라오지는 못하는 법이다.
독서 숙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맡은 한 젊은이를 잘 관리하도록 신참 악마에게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보낸 편지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미있으면서도 신랄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곰곰히 생각할 여지가 있게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시 대가에 작품을 읽을 수 있다니, 좋은 숙제인 것 같다. 덕분에 이 글도 쓰고 말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생이자 교수로 재직한 옥스퍼드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글을 쓰며 일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았던 루이스는 예순의 나이에 미국인 조이 대이빗먼과 결혼한다. 그녀는 결혼 당시 두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고 골수암에 걸려 있었다. 조이는 결혼 후 3년을 더 살았다. (이 영화 같은 부부의 삶은 <섀도우 랜드>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루이스의 <헤아려본 슬픔>은 조이의 사후 겪었던 무섭도록 솔직한 슬픔의 지도를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논리적이고 명료한 가장 그답지 않은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고통의 문제>와 함께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리고 솔직한 실존적 몸부림이 그대로 드러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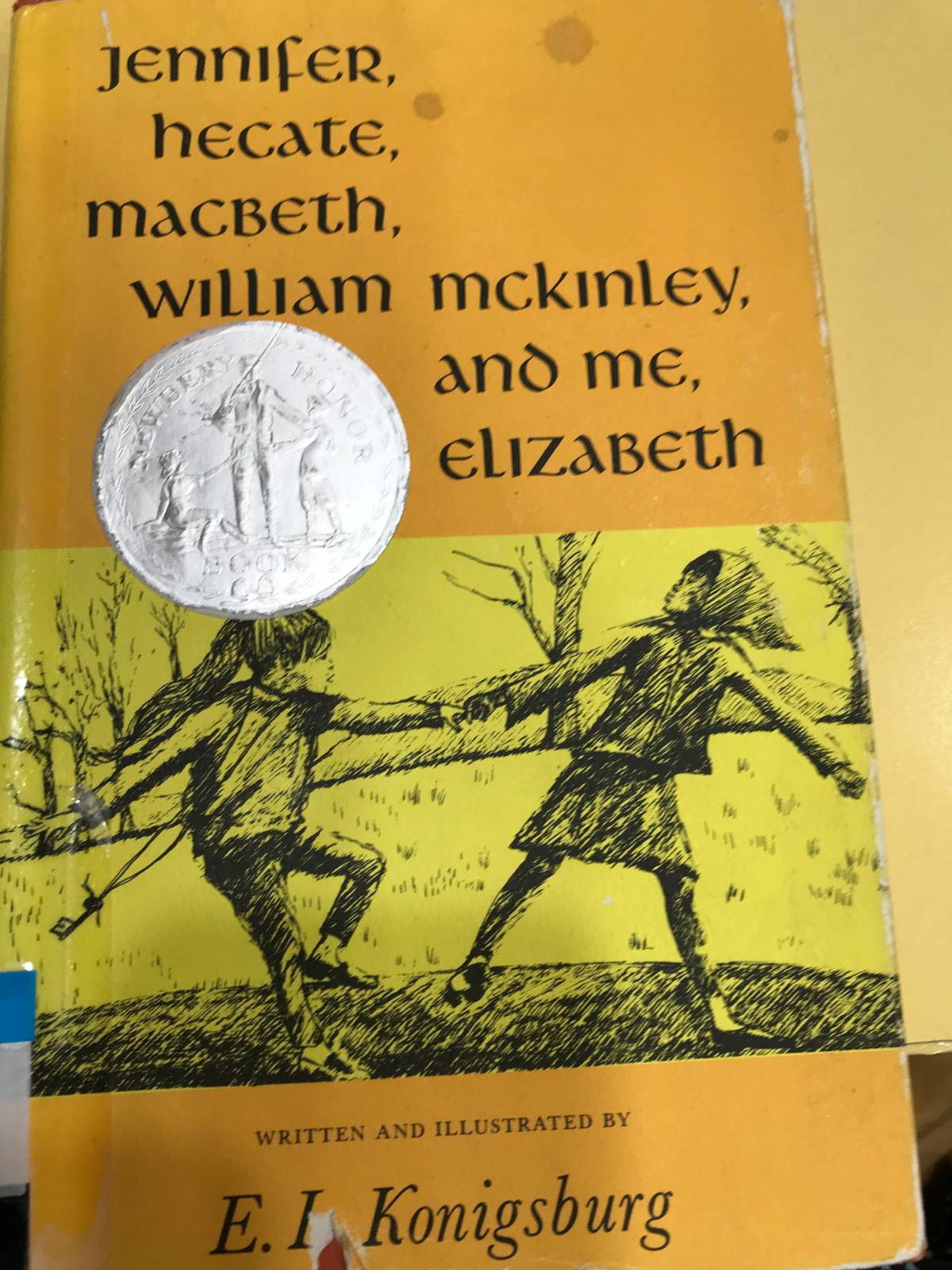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