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피렌체 중심가에서 미켈란젤로 광장까지 걸어가기는 무리였다. 여행 중반이라 좀 지쳐가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했고, 이미 조토의 종탑을 오르내리는 강행군 후였는데 말이다. 게다가 가는 길은 오르막이었고 흐린 날씨에 비 예보까지 있어서 우산을 하나씩 챙겨들어야 했기에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우산 하나로 엄살인 듯싶지만 기본 짐에 더해진 부분이라서 그만큼 더 무겁게 느껴졌다. 여행 초반이었다든지 우산이 필요 없는 좋은 날씨였다면 40분 오르막 정도의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흐린 날씨가 가는 길의 풍광과 묘하게 어울리기도 했던 것 같다.

미켈란젤로 광장(Piazzale Michelangelo)은 아르노 강 건너 언덕 위에 있는 곳으로, 광장 가운데에 미켈란젤로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다비드 복제품이 있다. 피렌체에는 도합 세 개의 다비드 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다. (진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다) 높은 언덕에 있어서 피렌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다비드 상보다는 피렌체의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금 돌아보면 무턱대고 갈 것이 아니라 근처 성당이라도 둘러보고 갔어야 했는데 그만 너무 일찍 도착해 버렸다. 일몰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일몰을 기다려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한 시간 이상 일찍 가버린 것이다. 물론 일찍 간 것이 무색하게 피렌체 쪽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일렬로 모여 난간에 매달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도 어찌어찌 난간을 한 부분 차지했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는데, 아뿔싸 날씨가 생각보다 추웠다. 걸을 때야 몸이 더웠지만 가만히 기다리자니 점점 추워졌다. 우산을 펼까말까 싶은 가랑비까지 때마침 내렸다. 무슨 객기에서인지 피렌체에서 쓰겠다고 가져온 베레모가 보온 기능을 단단히 해 주었다. (참고로 피렌체에서 베레모 쓰고 다니는 사람은 관광객 외에는 없다) 후드를 뒤집어쓰고 목도리를 감고 서로 옹기종기 체온을 나누며 해가 빨리 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일몰 시간이 되었다. 흐린 날씨니 별로 일몰이 이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야경은 멋있었다.





일몰 후에도 깜깜해지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 아름답고 낭만적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는 야경을 확인했으면 됐다며 너무 추우니 어서어서 내려가서 저녁을 먹자고 의기 투합했다. 오르막길을 힘들게 걸어왔으니 내리막길도 걸어와 버렸다. 강변의 야경을 벗삼아 내려오는 길은 꽤 괜찮았다.

유명하다는 베키오 다리도 건넜다. 관광객들이 와글와글 했다. 가장 힘든 피렌체 코스를 다녀왔다며 서로 자위하며 뜨끈한 한식 메뉴를 먹자고 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무척 고생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마저도 재미있게 기억이 된다. 사진을 보면 추워서 서로 껴안고 깔깔 웃는 모습이 찍혀있다. 이런 미화된 기억이라니! 여행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돌아보면 고생도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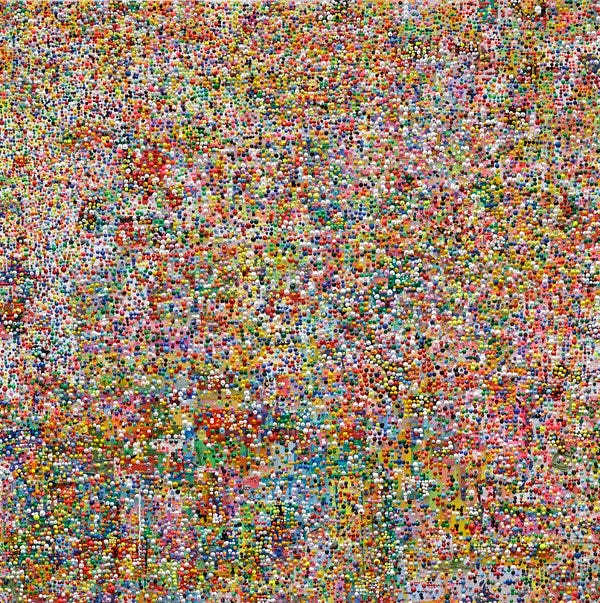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