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나는 그룹홈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 일이 많다. 표도 하나 나지 않는 일이 고되기만 하고 아이들은 내 맘 같지가 않다. 그룹홈 보육사는 처우까지 좋지 않다고 한탄하던 사이 동료가 또 바뀌었다. 새로 들어온 동료가 그 선하고 맑은 눈으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질문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나 자신이 밉고 싫다. 새로 하는 일이니까 뭘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인데도, 뭘 모르는 그 사람이 야속해 죽겠다. 일일이 알려주어야만 일을 나눌 수 있다고 스스로 되뇌면서 버텨왔는데 무엇이든 서툰 동료의 몫만큼 뭘 더해야 하는 상황이 끝나지 않게 되어서 지쳐버렸다. 난들 그걸 다 배워서 알겠냐고요,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누르느라 가끔씩 멍해지기도 한다.
글 쓰는 일도 버거워졌다. 이건 이래서 숨겨야 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가려야 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다 보니 글 쓰는 일이 재미 없어졌다. 사는 일이 재미 없으니까 덩달아 쓰는 일도 재미없어진 것 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그룹홈에서 일한 지는 2년 11개월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글을 쓸 때마다 아이들이 싸워서 속상했던 마음이며,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을 토로하는 글이나 쓰는 내가 초라해 보여서 싫었다. 그룹홈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이전에 그룹홈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그룹홈에 대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 아이들의 개인사가 드러나 보이는 이야기 못지않게 내 모습 역시나 숨기고 가려야 하는가, 매번 글쓰기를 하면서 초조한 마음을 겪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은 조금 설렜다. 그룹홈의 사내아이 넷이 모두 학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온종일 집안을 뒹굴며 투닥거리느라 잠시도 짬이 없던 방학이 드디어 끝났다. 우하하하. 새벽 여섯 시에 일어나서 큰 아이들 깨우고 아침밥 차리고, 몰래 자러 들어간 녀석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차례로 욕실 보내고 밥 먹이는 와중에 사인해 준 가정통신문은 제대로 챙겼냐, 컴퓨터 사인펜은 챙겼냐, 로션은 발랐냐, 잔소리를 하는데 단전에서부터 힘이 차오른 단단한 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제 갓 입학한 막내 손을 붙잡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길에는 신이 나서 녀석과 투스텝을 밟으며 뛰게 되었다. 단지 집이 조용해진다는 사실만으로 그렇게 들뜬 것은 아니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은 녀석들이 기특해서만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나면 오로지 나만을 위한 15분을 가져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15분 타이머를 켜놓고 그 시간을 한번 누려보기로 했다. 초라하든 초조하든 그거라도 써보는 글쓰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 걸까? 더군다나 그룹홈에 대해서. 서른 평 남짓한 빌라 꼭대기 층에서 사내아이 넷과 함께 방학을 보내는 동안 내내 몸살 약을 먹으며 겨우겨우 버텼다면서, 치질이 자라는 두 달을 보냈다고 징징거렸으면서 왜 굳이 글까지 쓰고 싶다고 하는 걸까? 심지어 글을 쓰고 나면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서 괴로워지기까지 한다면서.
그룹홈을 구실로 유명해지고 싶어서 기를 쓰는 건가. 보육사 처우가 좋지를 않으니 사람들에게 존경이라도 받고 싶다는 보상심리인 건가. 아니다. 내 모습 이하로 무시당하는 것은 끔찍하지만 내 모습 이상으로 떠받들어지거나 회자되는 것은 무섭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보육사라고 떠벌리고 싶은 건가. 누구보다도 소명감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건가. 아니다. 금방 탄로 날 거짓말로 망신당하는 일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가장 먼저 알고 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보육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꾸만 그룹홈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다.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나마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정말로 월급 받는 만큼, 딱 그만큼만 아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두려움이 나를 자꾸만 떠다민다. 두텁고 불투명한 일상과 비루한 삶의 시간을 헤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을 쓰다 보면 그 글이 적어도 나를 살아지는 대로 휩쓸려 가지는 않도록 지켜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룹홈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룹홈에서 일한 시간을 소재로 글을 쓰는 작업은 씨실과 날실처럼 서로를 재료로 삼아 이전까지는 없었던 시공간을 창안해 내는 나만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깜깜한 방에 막내를 부둥켜안고 잠을 재우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며, 외출 시간을 두고 목소리 높여 실랑이를 벌였던 첫째와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다시는 없을 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까까지 존재했던 아이와 나 사이를 모두 풀어헤쳤다가 이전에 없던 다른 모양으로 다시 단단하게 짜나가는 작업이 된다. 바닷속을 흐늘거리던 미역을 따서 볕에 널어 말리듯이 그날 있었던 일을 글자로 써서 주르륵 정리하고 나면, 그리고 글을 써 낸 힘으로 나머지 시간을 살아내고 나면, 정성스레 끓여낸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한 끼 식사를 뚝딱한 것처럼 근기 있는 일상을 누리게 되는 것만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두 학교로 간 아침,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15분은 기대처럼 근사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그룹홈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세탁기를 돌렸고, 그러다 바닥에 비친 먼지를 보았고, 그래서 청소기를 돌렸고, 뒤늦게나마 15분 타이머를 켜고 자리에 앉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료들이 출근을 했고 인사를 나누며 차 한 잔을 내려마셨고 이윽고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 메일을 읽어 버렸다. 그래도 일기장에는 5분 남짓 쓰다만 글이 남았다. 간절한 기도문처럼.

‘보이지 않는 가슴’
그룹홈에서 일하는 보육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룹홈에서 일하는 나의 이야기가 당신과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
아동그룹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내 시간의 45%는 네 아이와 함께 그룹홈에서 보내고, 나머지 55%는 내가 낳은 두 아이와 남편이 있는 집에서 보냅니다. 집과 일터, 경계가 모호한 두 곳을 오가며 겪는 분열을 글쓰기로 짚어보며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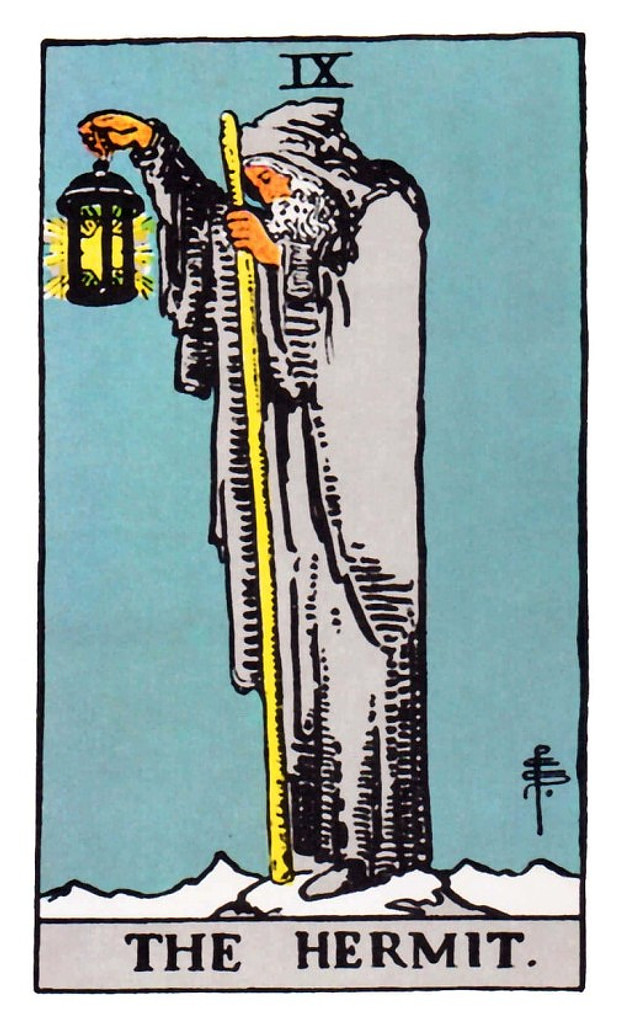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조경희
부모와 같이 산다고 꼭 좋은건 아니지만, 부모와 함께하지 못 하는 상처를 지닌 아이들 보듬어주시는 수고에 고맙습니다.
수영
별 것 아닌 글이지만 현장에서 느낀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가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며, 두려운 마음으로, 많이 많이 앓으면서 썼었습니다. 마음으로 읽기를 넘어서 댓글로 손 붙들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