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끌렸다. 틀림없이 귀신이 사는 집이라는 뜻의 鬼家(귀가)일 거라 생각했다. 다 읽고 나니 그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의 歸家(귀가)였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목차와 제목을 다시 살폈다. 단편소설 ‘공가’에는 괄호 표시를 해서 空家라는 한자 표기를 따로 했지만 ‘귀가’라는 제목 뒤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어쩌면 이승우 작가는 여러 겹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개발이 확정된 천하3구역은 철거 예정 구역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반년 넘게 방치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사 나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뿐이었다. 길이 지저분하고 흉흉했다. 골목 초입에 위치한 천하부동산은 여기 남은 마지막 가게였다. 황 노인은 이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부동산 중개를 해왔다. 이제는 늙어서 일을 그만둘까 하지만 그래도 골목이 철거되는 순간까지는 가게에 나올 생각이었다.
▌없는 취급당하던 그 공간, 없는 취급당하던 그 사람
이 와중에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뜬금없이. 골목 가장 안쪽 마지막 집, 천하로 78길 31번지였다. 무단으로 침입할 시 형법 31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대문에 빨간색 요란한 경고문을 붙여놓았는데도 말이다. 하룻밤 잠자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찾아든 노숙자나 부랑자가 아니었다. 미친놈이었다.
“무단 침입으로 감옥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요. 안 그러면 강제로 끌어낼 거예요. 그리고 곧 공사가 시작될 텐데 대체 뭘 한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다니, 무슨 엉뚱한 짓을 한 겁니까. 이런 곳에서는 버리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황 노인이 언성을 높였다. 그 남자가 아주 입주 청소하듯이 말끔하게 집을 치웠기 때문이다. 골목에 늘어진 보기 흉한 쓰레기들을 깡똥하게 뭉치고 분류하고 비질을 했다. 심지어 황 노인이 어떤 말을 해도 대답조차 하지를 않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묻지 않은 일
이까지 읽다 보니 소설집 『목소리들』 맨 앞에 수록된 단편소설 「소화전의 밸브를 돌리자 물이 쏟아졌다」가 생각났다. 어느 도시에 갑자기 나타난 노인 이야기였다. 그이는 자꾸만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물을 뿌리고 솔질을 하려고 들었다. 경찰이 제지해도 고집스럽게 나타나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식이었다.
“여기는 차도예요, 차도. 몰라요? 이러다가 당신 죽어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골치 아파요. 몇 번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경찰들은 그녀를 막고 차에 태우고 수갑을 채웠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 때문에 매번 무슨 짓인가 싶어 골치가 아팠다. 와중에 노인은 완강하게 솔질을 고집할 뿐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말을 못 하기 때문이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입을 연다.
“당신들은 무례합니다. 그분을 풀어주세요. 그분이 하던 일을 하게 하세요. (...) 저분이 왜 저기에 물을 뿌리는지 당신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 있었고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차도에 뛰어들어 물을 뿌리고 솔질을 하는 노인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 공가에 들어와 청소를 시작한 남자와 이를 제지하는 황 노인(이라기보다 천하3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더 정확하겠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소화전의 밸브를 돌리자 물이 쏟아졌다」에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과 그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문득 되살아나 현재를 덮치는 과거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면 「귀가」에서는 낯선 사람이 왜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지, 그 간절한, 미처 들려주지 못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 같던 그의 과거와 현재를 기어이 풀어내어 들어보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그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였을 것이다. 천하로 78길 31번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황 노인에게 그곳은 단순히 공가, 혹은 이웃집이나 재개발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에게 그 집은 ‘그녀’가 살았던 공간이었다. 그 집에서 인기척이 나면 “그 사람이 돌아온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게 되는. 그녀, 정순임 씨에게 천하로 78길 31번지는 아들이 엄마를 찾아 돌아올 집이었다. 남들이 다 이주비 받고 떠나도, 절대 떠날 수 없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도 없고 엄마도 없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집부리게 되는. 그 남자, 청각장애가 있는 낯선 남자에게 천하로 78길 31번지는 돌아올 집이었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며 포근히 반겨줄 거라 기대하게 만드는. 없는 취급당하던 그 사람, 없는 취급당하던 그 공간이 어느새 내 안에서 생생하게 태어나고 있었다.
소설집 『목소리들』에 두 번째로 수록된 단편소설 「공가」 역시 엮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았다. 낯선 남자가 빈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는 그 마음까지 이해해 보는 여지를 주는 이야기였다.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만 남아서, 몸이 공가처럼 거의 비어버린 남자가 주인공이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돌아가리라, 했던 집에 돌아왔지만, 남자는 그 집마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그 집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정말 마지막에 다다른 남자의 구구한 빈집이었다. 이후로 공가는, 누군가를 지키고 기다리는 주인공이 치우고 고치고 채우면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하게 되었다. 어느 미친놈이었던 낯선 존재들이 어느새 내 일인 양 맘을 졸였다가 울렸다가 하고 있었다.
▌‘이해받으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이해하는’ 글
죽은 사람에게는 들려주지 못한 것도 많을 텐데 노래가 여기저기 떠도는 이유 같은 거
그 사람이 꼭 죽어야 했던 이유 같은 거
그 이유가 여기저기 떠도는 노래 같은 거
- 진은영, 「사실」(『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문학과지성사, 2022)
이승우 작가가 소설집 맨 앞에 인용한 시였다. 그리고 그는 소설집 맨 마지막 페이지, 작가의 말에 이렇게 썼다. “아마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탄식 없이 슬퍼하고 변명 없이 애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해받으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이해하는’ 글의 저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혹은 글을 쓰고 나서 애가 타고 목이 마르고 끝이 씁쓸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나 알게 하는 문장이었다. 덩달아 그룹홈에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원가정복귀 절차는 미루면서 아이 몸에 모기 물린 자국 하나, 입술 부르튼 자국 하나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탓하는 그 엄마와 수시로 다투던 내 마음이 조금은 호흡을 찾게 되었다. ‘이해받으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이해하는’ 마음은 의도치 않게 나를 먼저 건져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가슴’
그룹홈에서 일하는 보육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룹홈에서 일하는 나의 이야기가 당신과 우리의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
아동그룹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내 시간의 45%는 네 아이와 함께 그룹홈에서 보내고, 나머지 55%는 내가 낳은 두 아이와 남편이 있는 집에서 보냅니다. 집과 일터, 경계가 모호한 두 곳을 오가며 겪는 분열을 글쓰기로 짚어보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수의사 김아람 인터뷰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4qrcwh866gp3yopwtwowy95x8u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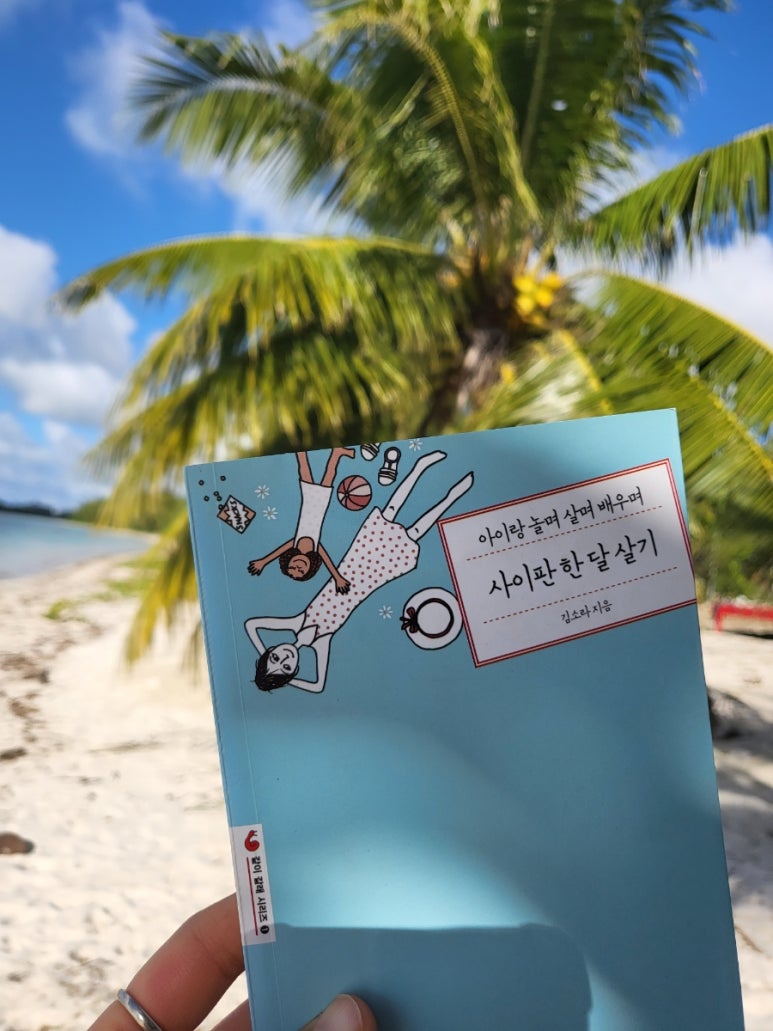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북치기땅치기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