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기린'의 ‘어느 심리학자의 고백’과 동일한 코너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른지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나의 것이 된 기준들이 있다. 특히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기준들은 무서운 선생이 되어 내 등 뒤에 버티고 선다. 내사(introjection)는 상대의 욕구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채 내면화한 것을 말한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거나 ‘어떤 일에도 의연해야한다’, ‘분노를 드러내면 안 된다’와 같은 도덕적 명제가 아슬아슬 까치발을 딛고 서있다. 완전히 이해되거나 수긍이 되지 않았지만, 타인이나 사회의 압박 속에서 얼떨결에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들이다. 이 명제는 우리가 사회에서 좀 더 잘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안내자기도 했다. 하지만 경직된 모습으로 심겨진 만큼 그에 반하는 충동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버티다 풀썩 널브러진 순간,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그것 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징징대니”와 같은 목소리로 찾아온다.
내게 자주 들리던 목소리 중 하나는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는 질책이었다. 무언가 잘못 결정한 거 같았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릇을 깨뜨렸을 때, 훅 하고 이 목소리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걱정이 많은 분이었다. 실수하거나 일을 그르칠까봐 여러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 아버지의 손을 거친 일은 늘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면 그 불안이 분노로 뒤바뀌곤 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을 따르다가 컵을 엎어버렸다. 아버지의 거센 호통이 따라왔다. “으이구, 그거 하나 못하냐.” 먹던 밥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만화영화 속 성난 악당을 닮아있었다. 놀이터 시소에서 떨어져 다치고 온 날에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 날에도 아버지의 언성은 높아졌다.
그 목소리는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깜박하고 시험 문제를 하나 안 풀었을 때, 아는 문제를 놓친 것도 속상한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목소리까지 따라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가뜩이나 늦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도, 열심히 쓴 과제를 저장하지 않아 날렸을 때도 나는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 앞에 불려왔다.
사실 그것은 진짜 아버지의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렇게 이름 붙여 저장한 나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정말 그러한가’라고 짚어볼 새 없이 답습한 목소리는 곧 자신의 높다란 기준이 된다. 자기를 가장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부모나 타인이기보다 스스로일 때가 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제임스 브라운(James A. C. Brown)은 실제 부모보다 내사된 부모가 훨씬 더 엄격하고 도덕적이라고 했다.
목소리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완벽해지는 것이었다.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것은 곧 ‘바보 같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므로 나는 주어진 일을 뭐든 잘 해내고 싶었다. ‘완벽주의적인 내사’의 이 비합리적인 논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업무를 처리하고 부모님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것에서 실수 없이 잘 해내야 하는 압박으로 다가왔다. 거기서 무언가가 삐끗 어그러지면 내사된 목소리가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곤 했다.
늦은 회의를 하느라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 어린이집 교사에게 연락이 왔다. 아이의 하원 픽업을 기다린다는 전화였다. 깜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원을 부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정신없이 주변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와중에도 ‘좀 더 잘 챙겼어야지’, ‘엄마가 돼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라는 무거운 목소리가 당황한 마음 위에 얹혀졌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내사된 언어는 실수를 하는 순간마다 아버지를 다시 소환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느꼈던 억울함, 내가 또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불러와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드는 것이었다. 그 뒤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실수 하나로 그 바람이 무산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다. 당시 어린 나의 좌절감과 두려움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뒤에 바짝 서있던 목소리가 가벼워진 것은 자신의 빈틈을 긍정하고 또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덕분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꼼꼼하기로 유명한 강 앞에서 보고서 인용정보를 잘못 적는 실수를 했을 때, “이런 건 내가 귀신같이 잘 찾잖아. 네가 큰 그림을 그려주면 오류는 내가 찾을게”라며 날 안심시켰다. 오히려 그녀는 “난 너무 비효율적이야.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말하며 코를 찡긋해 보였다. 책상에 물을 한가득 엎질렀을 때, 그들은 “조심해야지”라고 핀잔하기보다 “역시 허당이야”라며 깔깔거리고 같이 물을 닦아주었다. 강은 잘 잊어버리는 날 위해 오늘도 물어봐준다. “내일까지 연말정산 마감인 거 알지?”
서로의 흠이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 곁에서 나의 부족함을 긍정하는 목소리를 얻었다.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나의 모자람을 드러낼 용기가 생겼다. 내가 못하는 것, 자주 실수하는 것이 별 일 아닌 것이 되어갔다. 그제야 비로소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줄 알게 되었다.
‘왜 그랬어’ 대신에 ‘어휴 나 또 그랬네, 그럴 수 있지 뭐’ 같은 좀 더 다정한 목소리가 찾아왔다. 사실 그 목소리는 전부터 있었다. 내가 그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뿐이었다.
내사된 목소리는 힘이 세다. 그러므로 그에 반하는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보통 이는 ‘실존의 나’와 가까운 목소리다. 지금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과 충동, 몸의 상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외치는 아우성이다.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 아닌가’하는 항의하는 목소리, ‘잘 해내고 싶었다’는 욕구가 주장하는 목소리, ‘다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목소리까지. 내 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저항하는 외침이 또렷이 존재한다.
곧바로 날아오는 화살 같은 목소리 말고도 우리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 어느 지점을 더듬더듬 찾아가 나를 보듬어주거나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말하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본다면 다른 목소리에도 점차 근육이 붙을 것이다. 그마저 힘들다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좋겠다. 내 안에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 글쓴이_이지안
여전히 마음 공부가 가장 어려운 심리학자입니다. 캄캄한 마음 속을 헤맬 때 심리학이 이정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같은 고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닿길 바라며, 심리학을 통과하며 성장한 이야기, 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일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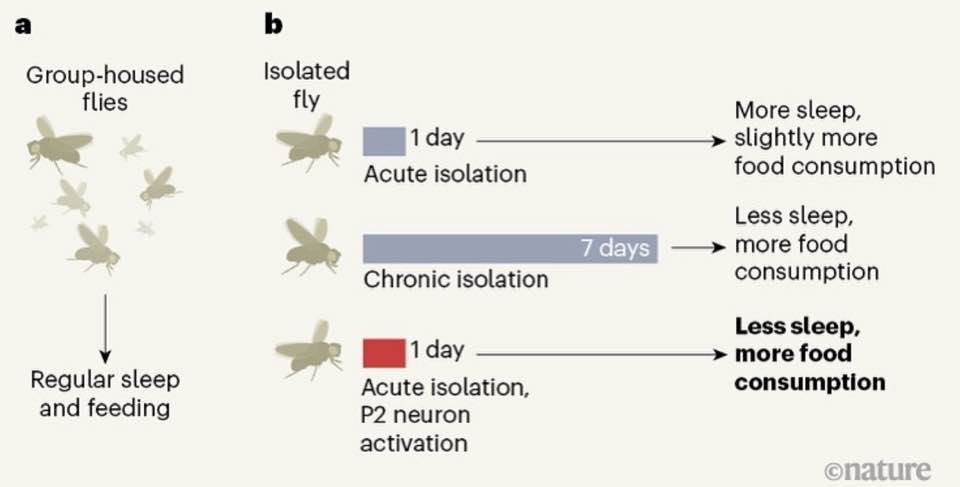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글쟁이Brian
‘내사된 목소리’..배우고 갑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견을 남겨주세요
탈퇴한 사용자
도움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