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0년 초는 미국이나 유럽(특히 독일)에서 만들어진 게임들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식 보드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대학가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시기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즐기던 장기나 바둑, 오목 같은 것도 사실 보드게임의 일종이다. 비록 보드게임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부터 이미 한국에는 부루마블이나 일본 반다이의 저가형 보드게임들을 복제하여 파는 어린이용 게임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졸리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이라는 브랜드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보드게임은 기존의 아동용 게임과는 크게 달랐다. 가장 큰 차이점은 패키지와 게임 시스템(룰)의 완성도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박스 앞면에 박혀있는 보드게임 작가 이름의 존재감이었다.
유럽, 특히 독일의 보드게임은 게임 시스템이 독창적이고 질적 수준이 높아서, 지적인 모험을 즐기는 게이머들을 매료시켰다. 열성적인 독자가 작가가 되듯이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보드게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 마련이다. 2002년,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생각하던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게임 디자인은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을 "재미를 위해 고안된 규칙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면 사실상 게임의 핵심을 만드는 것이 게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책을 읽는 사람의 반응이 작가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듯, 자신이 디자인한 게임을 타인이 플레이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 그것은 마치 작은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보드게임 계에서 게임 디자이너는 문학에서의 작가처럼 존중되는 문화가 있다. 여기에는 1991년 독일의 게임 작가 단체인 Spiel Autoren Zunft (우리말로는 게임 작가 길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의 설립과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일군의 게임 디자이너들이 주점에 모여 이제 게임 작가의 이름을 패키지 전면에 공개하지 않는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연판장을 컵받침에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S.A.Z. 의 활동은 게임 작가의 이름이 기억되고 브랜드화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995년, 보드 게임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SDJ(Spiel Des Jahres) 수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독일 작가 클라우스 토이버의 보드게임 '세틀러 오브 카탄'은 독일 스타일의 유로게임을 일부 게이머들의 문화가 아닌, 보편적인 엔터테인먼트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에 처음 시작된 SDJ는 영화의 아카데미상이나 문학에서의 맨부커 상처럼, 수상만으로 흥행을 보장하는 상으로, 카탄 보드게임이 1995년 수상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작이 됨으로써 그 권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소비자들이 SDJ 로고가 박힌 게임은 게임성을 담보한 게임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믿게 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그것을 달성해 냈다.

카탄은 1995년 독일 Kosmos 사에서 출시한 게임이다. 가상의 섬 카탄을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경쟁하는 게임으로, 이 게임의 성공을 계기로 취미로 보드게임을 만들던 클라우스 토이버는 치기공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전업 보드게임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중에 클라우스 토이버는 오로지 카탄의 저작권만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카탄을 설립했고 현재는 클라우스 토이버의 아들이 주식회사 카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카탄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출시되었고 현재까지 약 2200만 카피의 게임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드게임 카탄의 성공 이후 독일의 소설가 레베카 가벨은 보드게임과 동명의 소설 '카탄의 개척자들'(Die Siedler von Catan)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른 보드게임 Candamir(The First Settler)와 Elasund (The first City)가 2004년과 2005년에 출시된다. 특정 스토리가 직, 간접적으로 보드게임의 소재가 되거나 게임을 테마로 하는 소설 역시 최근 장르문학에서는 흔한 사례다. 그러나 Candamir와 Elasund는 2차 창작물(소설)을 기반으로 3차 창작물이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게임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의 내러티브 또는 그 내부의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반지의 제왕에서 시작된 RPG 게임, 그리고 RPG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플레이 경험을 다시 소설로 만들고, 다시 그 소설에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는 것은 RPG 게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지의 제왕의 스토리는 DnD(던전 앤 드래곤스)라는 롤플레잉 게임 시스템을 낳았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발더스 게이트나 아이스 윈드 데일 같은 히트 게임들은 모두 DnD 를플레이하는 유저들이 플레이한 기록으로 만든 이야기를 다시 독립적인 게임으로 만든 것이다. 물론 이런 게임들은 또다시 새로운 장르문학의 원소스로서 영감을 주고 실제로 게임을 소재로 하는 판타지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게임의 시스템과 테마, 또는 규칙과 내러티브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보드게임을 만드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이런 일련의 생태계 안에 창작자의 역할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드게임 창작자로서의 역할이 자리잡기까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독일 보드게임 시장의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S.A.Z. 의 사례와 같은 수많은 노력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환경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보드게임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였고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시장이었다. 카탄과 같은 히트작들이 자리 잡은 유럽의 시장은 콘텐츠의 기획과 생산, 마케팅과 유통까지의 시스템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형무형의 장치들이 자리 잡은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보드게임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은 수많은 문제들과 조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딱히 보고 배울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업으로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은 그 모든 문제들을 온몸으로 부딪쳐가면 해결해야 한다. 기획에서 제작까지의 모든 과정을 맨땅에 헤딩하며 학습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에서 타인의 재능과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불쾌한 사람들과 부딪쳐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대학원을 다니다가 짧은 직장생활을 한 게 사회생활의 전부인 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온몸으로 겪게 되었다.
글쓴이 - 정희권
2000년경부터 게임, 장르문학, 만화 등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렉시오, 스파이시 등의 보드게임을 기획, 제작했고, 현재는 만화 등 다른 IP 가 갖고 있는 재미를 게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보라는 보드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 정희권 | Facebook
브런치 : 정희권의 브런치 (brunch.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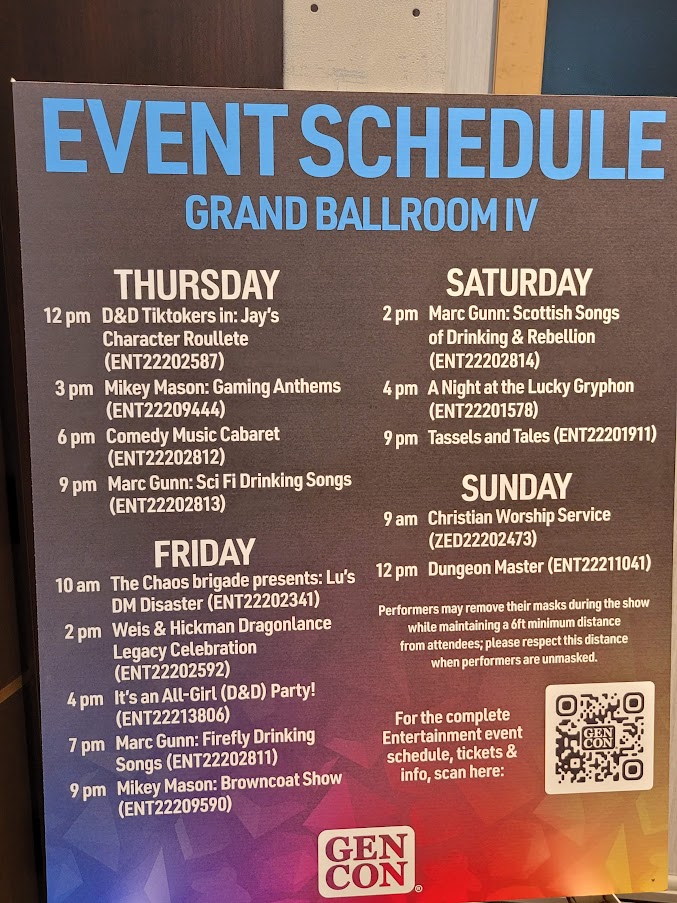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