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기록관리를 직업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때에는 하소연을, 또 어떤 때에는 심각한 논의를,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힘을 내자며 으쌰으쌰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 나이와 함께 떨어지는 체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득 없이 소모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늘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고, 해결 방안은 없었다. 결국 이것 저것을 핑계삼아 필요한 논의들을 회피했다. 그러던 중 ‘기록관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관한 단상’(김장환, 2024) 논문을 읽었고, 일기나 다름 없는 오늘의 글을 작성한다.
빠르게 자리 잡은 기록관리 생태계가 어딘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다. 늑대가 없어져 사슴만 잔뜩 늘어난 숲은 과연 평화로울까? 사라진 늑대가 가져오는 그 생태계의 악순환이 지금 우리 기록 생태계에서도 보인다.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고,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의 풀뿌리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위 논문, 87p)
일과 연구에 연차가 쌓이면서 지식과 경험은 내가 갖추어야 하는 무기 같은 것이었다. 전쟁에 총칼이 필요하듯 일을 수행할 때 그간의 지식과 경험이 유용할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내 밑천이 드러날까 전전긍긍 할 때도 많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나름 노력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라 불리는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 비해 공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나는 우리 분야가 석/박사 학위를 주는데 무척이나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현실에 비해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생각보다 오래 활용(?)된다.
아키비스트라운지의 과거 인터뷰를 종종 다시 읽어보는데, 다시 보다 보면 새로운 지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처음 읽었을 때와는 다른 부분에 공감이 되기도 한다. 라운지 인터뷰는 정보나 학술적인 내용이라기 보단 인터뷰이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중요하지 않지만, 5-6년 전 인터뷰임에도 지금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인 기록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라거나 기관장은 물론 조직원들의 인식 부족, 예산 부족, 타 업무를 하느라 기록관리는 뒷전이라는 이야기 등은 지금도 늘 나오는 이야기다.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트렌디한 것을 넘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행어가 되었지만 공공이 아닌 영역의 탄탄한 아카이브는 유니콘과 같은 존재이고,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기록학박사는 손에 꼽는다. 라운지의 과거 인터뷰 뿐만 아니라 기록인대회에서, 아키비스트캠프에서 혹은 그 외 여러 학회 발표에서 누누이 지적되는 ing 과제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키비스트라운지 인터뷰가 아웃데이트 되지 못하는 이유다.
나는 00년에 공공기록관리 정책 중 하나인 A를 주제로 삼아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했다. A 정책으로 첫 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이후 약 5년 후 학위논문을 작성했는데, 첫 논문에서 수행했던 인터뷰는 5년 후 학위논문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용했다. A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동일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위논문을 쓰던 중 ‘이 정책이 사라지면 너의 논문은 더이상 참조될 일이 없겠지만, 그게 제 소임을 다하는것이다‘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이 정책은 이슈였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다. 정책의 목적과 의미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다. 논문의 인터뷰 내용은 현 시점에서도 많은 부분 아웃데이트 되지 못했다.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과거 연구 사업 보고서를 참조해야 하는 때가 있다. 업데이트가 빠른 분야의 연구들은 2-3년 전 결과도 배경연구로는 활용되어도 미래모델을 만드는 작업에는 반영되지 못한다. 우리는 5년 전은 물론 그 이전의 연구보고서들도 여전히 유효한 참조물이다. 기록관리의 이론, 역사, 의의 등의 영역이라면 이해되지만, 새로운 기술의 적용, 미래모델의 방향성 제시, 하다못해 혁신방안 제안 까지도 여전히 비슷한 것이 많다. 중요도가 높아서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아이디어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기록관리계를 대하는 사회적, 정치적 인식도 한 몫 할 것이다. 기술은 물론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용자들의 성향과 문화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여러 발 뒤에서라도 따라가고 있는 걸까?
기록관리법이 제정되던 20여년 전만 해도 기록관리 생태계는 그 어떤 곳보다 역동적이었다(위 논문, 85p)는데, 그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양한 영역에서 아카이브의 밑바탕이 탄탄하게 올라서고, 실무의 문제점들은 하소연이 아닌 해결방안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며, 연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생태계 말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의 반성이다. 그 역동성을 위해 나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면 되니까.
이 주제로 글 쓰는 것을 고민하자 근래 나와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B가 ’우리가 아는 지식이 빨리 쓸모없어 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야만 하는, 늘 새로운 것이 업데이트 되는 그런 학계이자 업계를 바란다는. 게으른 나는 따라가고만 있지만, 늘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기록연구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이 역동하는 생태계 안에서 생동하기를, 반성과 함께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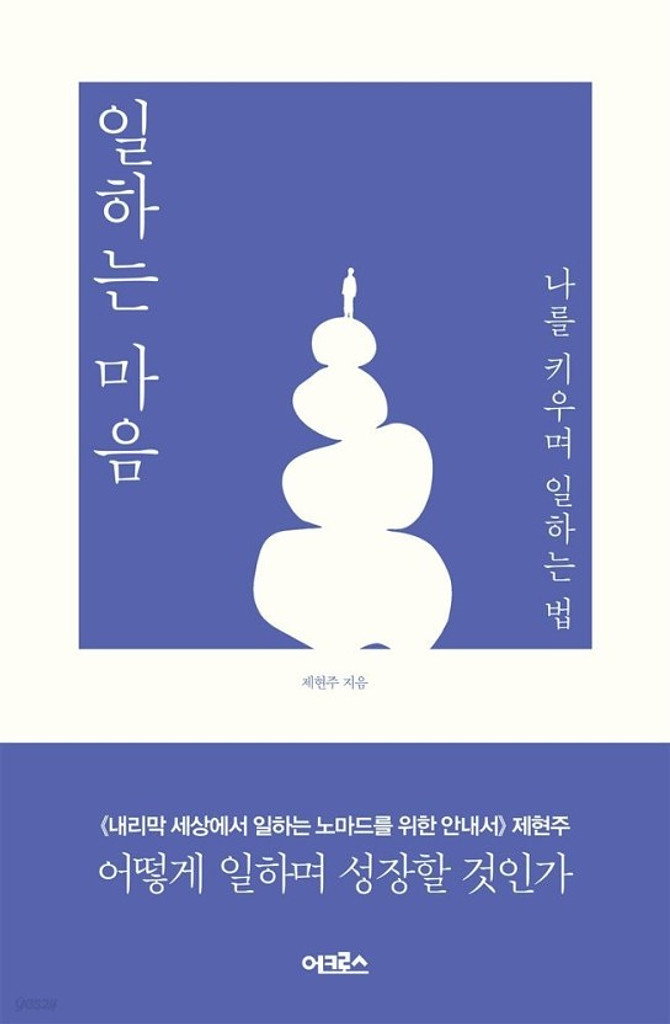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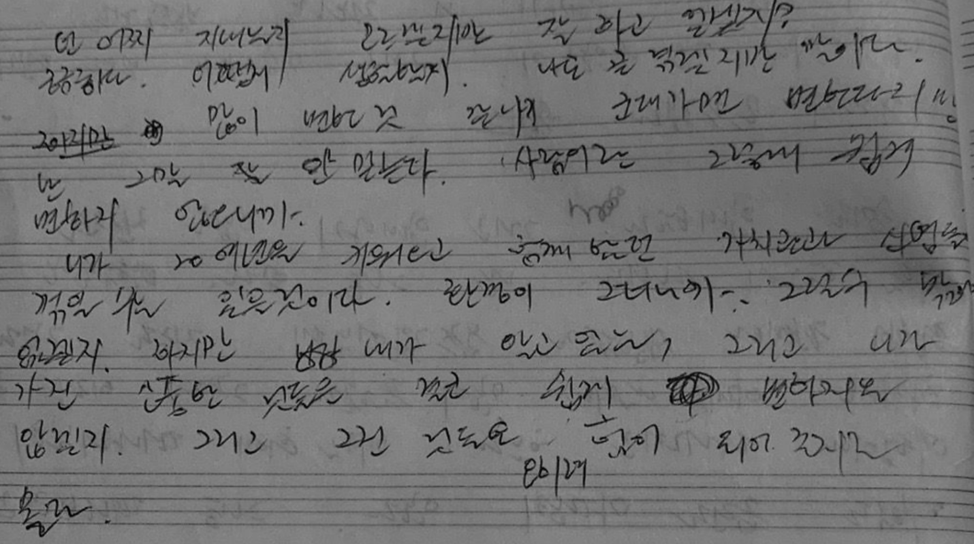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