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시절에는 좋아하는 시 한 편 어디서든 읊어내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시가 좋은 게 아니라 그저 멋져 보였던 까닭입니다. 일상에서 시 읊을 일 과연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쩐지 든든한 부적 같기도 했고요. 근데 긴 시는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헤매던 어느 날 한 편의 시를 만났습니다. 막스 자콥의 시 <지평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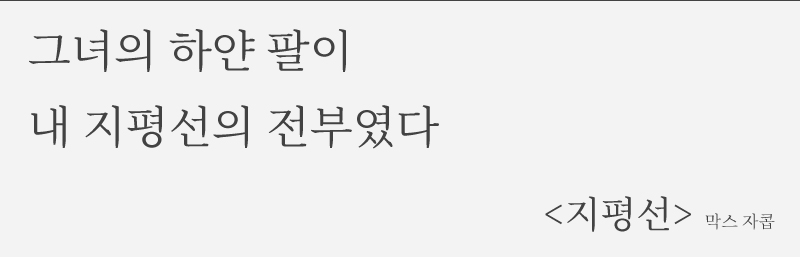
짧은 시 한 편은 20년 넘도록 제 안주머니 어딘가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외투를 바꿔 입어도, 얇은 반소매 티셔츠만 입어도 두둑한 채로요.
친구는 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함축적인 탓에 요지 파악이 어렵다고요. 공감합니다. 쉬우면 한없이 쉽지만, 어려우면 끝도 없는 게 시일 테지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건 문학적 소양과 별개입니다. 세상 수많은 시 중 제가 이해하고 좋아하는 몇 편의 시를 찾았을 뿐이에요.
이동진 영화 평론가는 책을 반드시 완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완독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 그러니까, 책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라. 책은 당신을 모른다."라고요. 김태리 배우는 팬들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익! 부록까지 660페이지네요. 제가 이 책을 왜 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세 장은 읽겠죠. 세 장 읽으면 값어치 한다고 봅니다."
좋아하는 시만 읽고요. 이해가 어려운 시는 넘깁니다. 오늘 넘긴 시를 내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시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는 황인찬 시인의 <종로 사가>입니다. 처음 읽던 때를 제외하면 저는 이 시를 끝까지 읽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읽을 생각도 안 해요. 줄 바꿈 없이 한 페이지 가득 채워져 읽기 전부터 까마득하거든요. 아주 잘 읽히는 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좋아하는 시를 이야기할 때 <종로 사가>를 빼놓지 않습니다. 첫 문장 '앞으로는 우리 자주 걸을까요' 한 문장을 소름 끼치게 좋아합니다. 참 별거 없죠? '앞으로는 / 우리 / 자주 / 걸을까요' 어느 낱말 하나 말뜻 어려워 사전 찾아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어체라 일상에서 듣기 힘든 것도 아니고요. 역시 좋은 글은 쉬운 말로 써야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또 한 편, 김용택 시인의 <울고 들어온 너에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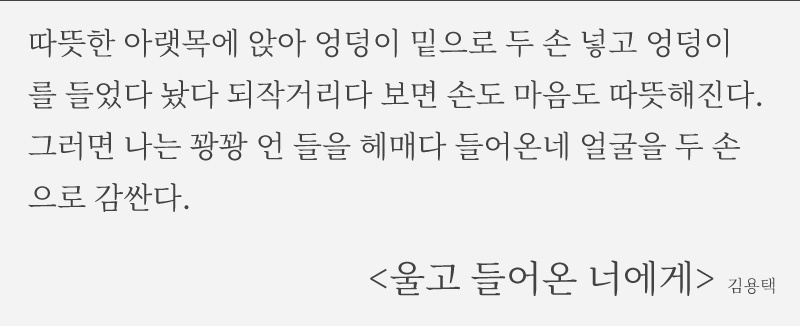
저는 노래 들을 때 노랫말에 시선이 잦게 머뭅니다. 곡에 빠져드는 게 멜로디의 몫이라면, 젖어 드는 건 노랫말의 몫이에요. 노랫말 따라 머릿속에 장면이 펼쳐진다면 최애곡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그런 노랫말이 사라지는 탓에 제 플레이리스트는 과거에 머뭅니다. 이렇게 MZ에서 도태되는 걸까요? 엉엉. 김용택 시인의 시는 읽고 있자면 글자가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상영돼요.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일요일 자정쯤 방영되는 단막극 같습니다. 트렌디하지 않지만, 명작이 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내는 시 한 편, 오은 시인의 <1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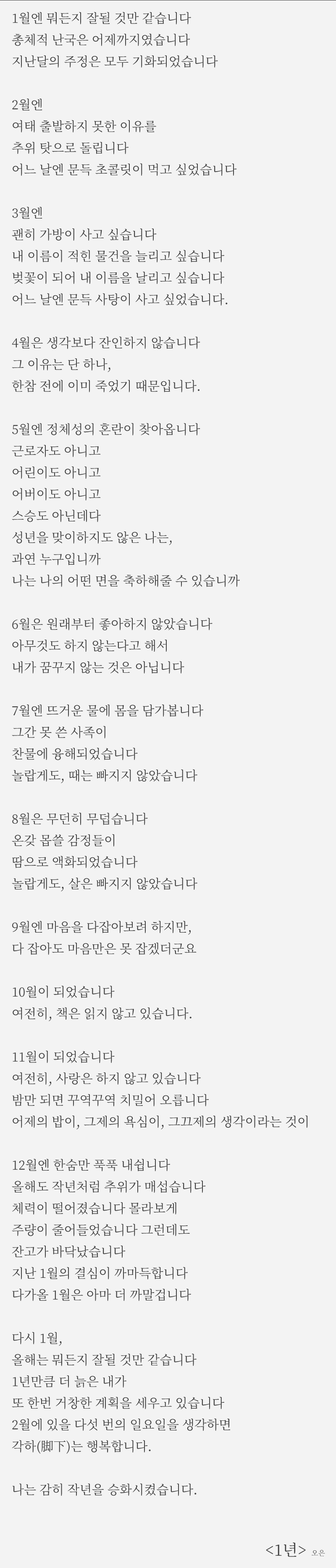
누군가 제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글 쓰다 말고 유튜브 쇼츠를 한 시간 넋 놓고 봤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군요. 머쓱하기도 하지... 좋은 글 읽고 나면 여운에 젖는 한 편 고민이 깊어집니다. 나는 무슨 작업을 해야 할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요. 글은 기쁨이자 숙제로군요.
말씀드린 네 편의 시는 모두 저의 공감에 근거했습니다. 구독자분 중에는 전혀 다른 걸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일입니다. 되레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가 궁금해집니다. 꼽는 것 있으시거든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제부터 불쑥 벚꽃이 피더군요. 생김새만 팝콘과 닮은 줄 알았는데, 피어나는 순간도 닮았다니. 틈 생기시거든 많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볕이 좋은 시간이면 더 좋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지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