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의 나날이 지나간다. 이팝나무, 아까시, 때죽나무, 장미, 쥐똥나무…… 거리마다 산세마다 봄꽃이 맹위를 떨치던 날들이 가고 있다. 봄의 꽃들이 모두 저물면 비로소 여름의 문이 열릴 테다.
이팝나무. 그 나무의 이름은 이팝나무였다. 눈꽃처럼, 흰 쌀밥처럼 희게 피는 꽃나무. 저게 이팝이구나! 쌀밥처럼 탐스러운 꽃 모양새를 보니 불현듯 이름이 기억났다. 나는 저 나무의 이름을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
기억난다, 하얀 밥을 소복하게 담은 것처럼 보여서, ‘이 밥 같다’고 해서 ‘이밥나무’라 불렸다고, 그 이름이 전해지며 ‘이팝나무’가 되었다고, 엄마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이었다.
🌿
내가 자연스럽게 터득했고 알고 있다 믿는 것들은 전부 엄마에게서 왔다. 엄마는 나의 모국어, 나의 시작, 나의 많은 면면을 채워 넣어온 장본인이다. 그가 나를 지금껏 가르쳐왔다. 어떤 때는 엄마를 뛰어넘고 싶어 분통이 터지고, 어떤 때는 그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우러러보면서 나는 엄마에게 사는 법을 배워왔다.
돌이켜보면 내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엄마의 얼굴은 조금 달떠 있었던 것 같다. 어린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내 나이였던 그에게 사소한 기쁨이 되었던 듯하다. 무엇을 모르는 이에게 자신 있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의 해사한 얼굴. 그 맑은 얼굴을 내 엄마가 갖고 있었다.
지금 나의 얼굴이 꼭 그러할까? 아니, 내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낳은 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세상에 내던져졌고, 그 애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나는 매일 그 애들의 언어가 될 말을 귓가에 속삭인다. 이는 곧 아이들의 표정, 말투, 정서, 그 모든 것이 되어간다. 그때의 나는 조금 두렵다. 나를 흡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무섭다.
욕실에 서서 오랫동안 거울 속 얼굴을 들여다본다. 나의 엄마를 쏙 빼닮은 얼굴. 어쩌면 그때 엄마의 다른 얼굴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애를 사회에 홀로 서게끔 키울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내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 무서워하는 엄마의 얼굴을 어렴풋 본다.
🌿
이제 나이 든 엄마는 종종 내게 무얼 묻는다. “얘, 이것 좀 해줘. 이걸 이렇게 깔았는데 로그인이 안 돼.” “포인트 쓸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줘.”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생긴 문제들을 엄마는 고스란히 안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만난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많은 자녀들이 그러하듯 나 또한 처음엔 엄마의 질문을 조금 귀찮아했다. 전화 통화 중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꺼낼라 치면 “주말에 오빠 오면 해달라고 해봐!” 하고 은근슬쩍 바통을 넘기는 식이었다. 문제를 해결해드리지 못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어물쩍 넘기고 잊어버렸다.
그러나 내게 자식들이 생긴 뒤로 나는 엄마의 물음과 청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어린 나를 가르쳤을 엄마의 젊은 날과 나의 지금이 자꾸 오버랩되기 때문이었다.
같은 걸 몇 번이나 되묻는 아이를, 실수를 거듭하는 아이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가르쳤을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세상에 온 아이를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았을 엄마. 웃다가도 금세 두려움에 빠져 굳은 얼굴이 되었을 엄마. 내 엄마가 그러했고, 나 또한 그 삶을 살아내야 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날 때면 그가 안고 지냈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끙끙대며 시간을 쓴다.
🌿
간만에 만난 엄마와 길을 걷다 부러 이것저것을 물어본다. “엄마 저 꽃 이름이 뭐였지? 저게 원래 저런 색깔 꽃인가?”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 답을 내어준다.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대답해주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나는 그때 내가 본 해사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린다.
두려움 따위는 모두 잊고, 그날의 엄마처럼 웃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근사한 것을 알려주었단다. 이것이 네가 살아갈 세상이란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렴. 저 나무를, 저 하늘과 세계를! 나는 달뜬 얼굴로 네게 웃어 보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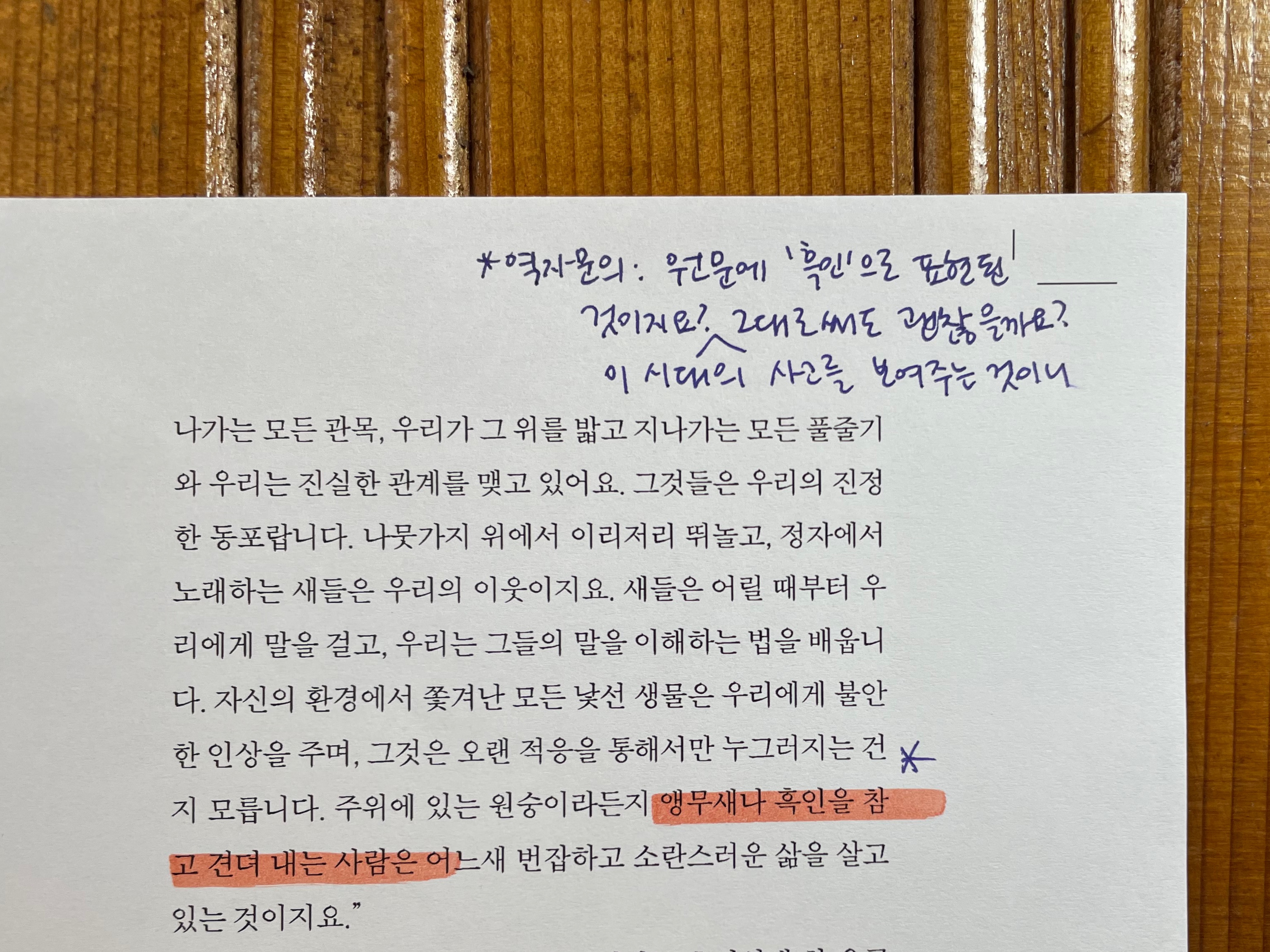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은빈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읽고 쓰는 마음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