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랬듯 표준어를 기반으로 글을 쓰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말맛이 덜하다. 이것은 편견일까요. 저는 여러 지역 색깔이 혼재된 이상한 말버릇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말끝마다 요상한 음정으로 “건디요”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닐 건디요. 그것이 맞을 건디요. 잘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디요. 금방은 또 운동을 끝내고 씻고 나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 건디요”라는 말에 제멋대로 음을 붙여 타령 비슷한 걸 불렀습니다.
혼잣말이 늘어나고, 추임새가 늘어나고, 심지어 글을 쓰다가도 마침표를 여러 개 찍거나 물결표를 붙이고 싶다면 나이가 든 거라는데. 나이가 들었으면 드는 거지 안 먹을 도리가 없을 건디요. 중독이 됐나본디요. 큰일입니다.
이 말버릇은 어디에서 온 건지. 혼자 만들어낸 것인지. 그냥 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런 말맛을 찾아 헤매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본 결과, 속으로 자꾸만 고이는 말들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려는 작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여서 시가 될 법한 말들이 아닌, 무자비한 생활 발화가 즐비할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최근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과 달리 요즘엔 저와의 대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혼잣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과 대화하며 살아갈까. 그런 게 궁금해지다가 정말 과묵한 사람이면 좋겠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도 안 하고, 자주 나가는 모임도 없고, 생활 루틴이 또렷한 삶. 그럼에도 이것저것 궁금한 건 많아 조금씩 일상에서 탐험하는 삶.
조금이라도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어디에 소식을 올리지 않고 소중히 오래 함구하는 버릇이 있었으면 좋겠달까. 혼자면 혼자인 대로. 또 함께면 함께인 대로.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간직하고 싶은 건 오프라인 기록 같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만나서 덥석덥석 올리는 SNS 게시글보다는 상자 안에 차곡차곡 보관할 수 있는 편지나 인화된 사진이 더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과 몇 달 가까이 지냈을 때 내재적으로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 공허한 연속이 제 삶까지 돌진해 최근에 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평생 찍어도 될 사진을 다 찍었다고 믿을 정도로요.
그렇게 많은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느낀 점은 렌즈의 왜곡과 포토샵의 보정력을 압도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움이라는 성찰이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숱하게 찍어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진은 내가 자연스럽지 않은 순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지 않았을 건디요. 그래도 이미 찍은 사진 귀하게 적재적소에 쓸 일이 생기길. 사진을 자주 찍으면 영혼이 닳는다는 속설을 믿지는 않지만, 영혼 없는 영혼 한동안 닳았으니 이제부터 진정 실체로 살아야겠습니다.
이것만, 이 부분만 나아지면 좋겠다고 말하던 사랑 없는 실체들을 확실히 뒤로하고 나로 살아가는 연습. 그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2024년 10월 3일 유서에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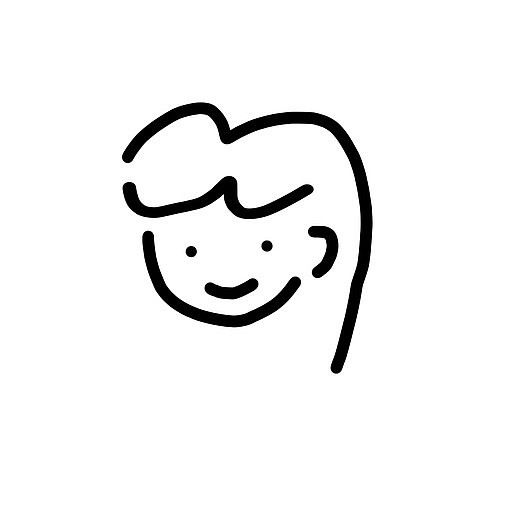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탈퇴한 사용자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만물박사 김민지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