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11월 카프카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전향이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의 전향인지는 결코 의식할 수 없다.”
2024년 11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 미래일기를 쓰면 그거대로 될까요. 오늘 혼자 쓰고 감춘 일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지 그때쯤 말씀드릴게요.
오늘 유서에 어떤 이야기를 남길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무엇에 관한 명확한 이야기는 관두고 싶었지요.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아하는 계절이 너무 짧아서 그 흐름에 잠시 몸과 마음을 맡겨도 될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순간이 좋습니다. 만원 지하철에 가까스로 올라 출입문 앞에 밀착했을 때 갑갑함에 멍을 때리다 이내 돌아오는 시선으로 유리창에 비친 제 눈과 마주치는 순간 슬며시 웃어 보이는 순간 같은 거.
그러다 그 뒤 어딘가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민망해지는 순간. 직접 마주치진 않아도 어느 잔상 속에서 머물렀다 흩어지는 반복이 없으면 서운할 것 같은 가을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남긴 기록을 들춰보니 카프카의 또 다른 말을 인용했더군요.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는 귀환이 불가능하다.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 한다.” 특정한 지점은 어디고,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 하는 각오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한참을 헤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가을에 발표한 시들이 고스란히 처음 내는 시집에 들어갔고, 그 무렵 알게 된 사람들과 며칠 뒤 오랜만에 만납니다.
“정말로 시를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어렵지만 재밌어서 시를 쓴다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 좋았다”고 일기를 남기기도 한 작년 가을. 그리 나쁘진 않았네요.
한동안 왜 누구와는 멀어지고 또 삶의 어느 한구석은 자꾸만 축이 나는지 골몰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걸 자연스럽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두 번째 시집에 들어갈 시들은 혼자만의 예정에 가깝습니다. 쓰면서 만날 변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사랑이란 예기치 못한 변화에 관한 수용이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탄치 않던 길들 끝에 만난 평지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걷다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간사하다 여길 만큼 제정신이 오랜만에 박혀 있는 듯한 이 계절에 감사하다고. 2024년 9월 25일 유서에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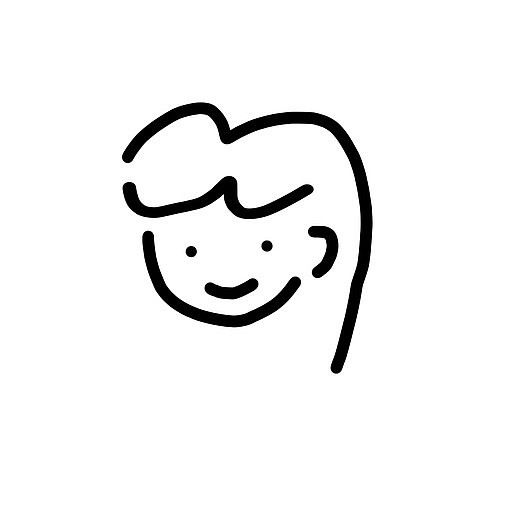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탈퇴한 사용자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