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에선 모든 걱정이 사소해진다고 들었어요. 주렁주렁 걱정을 달고 사는 제가 요즘 부쩍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일까요.
빈 페트병이나 캔을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이듯 걱정을 분리수거합니다. 그러고 보면 분리수거라는 말도 좀 이상합니다. 전 그저 분리를 할 뿐이고 수거하는 쪽은 따로 있는데 모든 과정을 묶은 말을 그대로 쓰니까요. 분리수거함. 분리만 하는데도 이 말을 쓸 수 있네요.
과정의 총체에서 어디까지나 일부. 이 보여지는 삶도 지극히 일부겠죠.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죽으면 해명할 여지 없이 내가 살아온 궤적이 드러나겠다 하는 두려움이요. 저는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참 열심히 산다는 오해. 참 열심히 산다는 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야무지지 못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마따나 실속 같은 거 차리고 살지 못하는 삼십 대, 무늬만 어른입니다. 알고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고, 또 낭비가 심합니다.
몇 주 전부터 거주지 내부 정돈을 시작했는데요. 정돈이란 말도 사실 거창하고, 아주 조금씩 작은 잡동사니부터 정리 중입니다. 처음에 정리한 건 액세서리, 그다음에 정리한 건 상비약통, 가장 최근엔 각종 화장품과 향수를 정리했어요.
이렇게나 물욕이 많은 인간이었다니. 스스로 다시 한 번 놀라면서 아끼다 쓰지 못한 거, 있는지 모르고 또 산 것들을 많이 버렸습니다. 살갗이 닿고 먼지가 닿으면 조금씩 변질되는 것. 엄청 대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게 아닌 이상 모든 게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네요.
나라는 사람의 자질은 어떨까요. 여전히 소모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끝에서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끝. 조금 더 가지 않아도 돌아서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도 저는 조금 더 갑니다. 아둔하기도 하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좋은 일 뒤에 좋은 일들을 맞았던 반복된 경험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몇 해 전 늦은 밤 친한 언니와 약속 끝에 헤어지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 달려오던 차와 크게 부딪쳤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저는 좋은 노래 나온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려다 그날 탄 택시 내부가 이상하게 난잡해서 수선한 마음에 무릎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택시 기사님 성함이 적힌 종이에 시선이 갔습니다. 고, 고인, 고인호?
네, 모든 건 갑자기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상은 없었으나, 차체가 많이 흔들려 여기저기 부딪친 탓에 내상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경찰이 오고, 어느 정도 말이 오간 뒤 쫓기듯 내려서 엉겁결에 잡아탄 모범택시 안에서 울면서 별별 생각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던 생각을 나열해볼까요.
그래, 죽진 않았구나. 만약 이대로 죽었으면, 잠깐만 오늘 나올 때 집꼬라지가 어땠더라. 가방엔 뭐가 있지. 아, 오늘 만난 언니랑 통화한 친구한테 괜한 마음의 짐을 줄 뻔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누구한테 연락하기도 애매한 늦은 시간이라서 다행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수습할 자신이 없다. 자고 병원 가야지. 근데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오늘은 깨끗한 잠옷을 입어야겠다.
죽으면 다 끝인데, 죽어서 발견되거나 기억될 모습에 집착하는 모습. 정말 우습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또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뒤로 택시를 못 타냐고요. 아니요. 잘 탑니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길 법도 한데 신기하죠.
어쩌면 아주 깊숙한 곳에 남모를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 자주 고단할 때 택시를 타거든요. 한때 타고 가다 죽을 뻔한 택시를 타는 습관. 그건 어쩌면 자학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따금 전처럼 아침 자학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필사적으로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출근 택시비로 뿌린 제 죽음의 거름이 아쉽지만, 지난 인생 수업료라 생각하고 이제 그만 지불해야겠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 〈너는 나의 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 땐 서른 넘으면 진짜 으른이 될 줄 알았는데."
"으른?"
"네. 월요일엔 바보짓하고, 화요일엔 호구짓하고, 수요일엔 삽질하고, 목요일엔 미친 짓하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요."
"그렇게 사는 게 어른일 걸요?"
"일곱 색깔 무지갯빛 루저가 되는 게 어른이라고요?"
"그냥 신나서 신나게 했던 걸 이제는 미친 짓이라 부르고, 그냥 좋아서 좋아했던 걸 이제는 호구짓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좀 미쳐보자 그래도. 겨우 이런 거밖에 못 하고."
"와, 나 갑자기 승부욕 생기네? 이 나이에도 미친 짓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미치게 좋은 짓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그런 짓들을 되짚어 봅니다. 죽고 싶어질 때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스쳤다고 2024년 8월 7일자 유서에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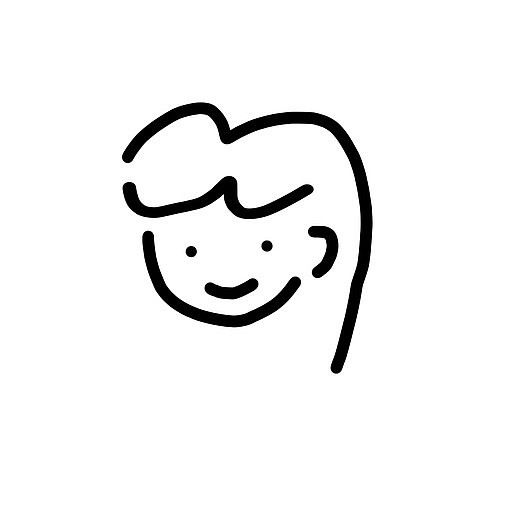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아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만물박사 김민지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탈퇴한 사용자
비공개 댓글 입니다. (메일러와 댓글을 남긴이만 볼 수 있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