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카니발 안 가?” 2월 중순이 다가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안부처럼 묻는 말이다. 독일에는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크게 열리는데, 내가 살고 있는 NRW 주는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유명한 카니발이 열려서 다들 그 얘기로 바쁘다. 대부분은 심드렁하게 본인은 바빠서 안 간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면 큰일날 것처럼 채근하기 시작한다. “독일에 와서 카니발을 한 번도 안 가봤다니!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해.” 남편과 나는 각자의 할 일로 이미 충분히 바쁜 상황이라 안 간다고 대답하면서도 꼭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서 어느 순간 답하기도 귀찮을 지경이 됐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바로 장미의 월요일(Rosenmontag)이다. 소위 카니발이 절정에 이르는 날 중 하나다. 독일은 주마다 종교가 다른데, 내가 사는 NRW(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를 포함해 몇몇 카톨릭 주에서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가 카니발이다. 카톨릭에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금식을 한다. 사순절을 앞두고 풍요롭게 먹고 즐기는 축제가 벌어지며 그 중에서도 부활절을 48일 앞둔 날이 바로 장미의 월요일이다. 독특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수많은 초콜릿과 사탕을 뿌리는데 무려 한 해 300톤에 달한다고 한다. 가장 처음 독일에서 카니발이 열린 도시이자 가장 크게 행사가 열리는 도시인 쾰른에는 한 해 약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다고 한다.

사실 카니발을 한 번도 안 가본 것은 아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연히 쾰른에 있다가 카니발 인파를 마주친 적이 있다. 그 날은 대형 퍼레이드는 없지만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대낮부터 도로를 메우고 있었다. 카니발 기간에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통제되었고 도로 위에는 만취한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깨진 맥주병 잔해들이 널려있고, 건장한 장신의 독일 청년들의 눈이 반쯤 풀려있는 장면을 보면서, 코로나로 아직 몸을 움츠리고 있던 당시에는 두려움이 앞서서 얼른 인적이 드문 가게로 들어가 자리를 피했다. 유명한 축제일수록 오히려 현장은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몇가지 있는데, 여의도 불꽃축제나 벚꽃놀이를 갈 때마다 ‘다신 안 와야지'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쾰른의 카니발은 나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올해도 역시 시큰둥한 나였지만, 그렇다고 카니발 주간을 깜박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온 동네가 우스꽝스러운 코스튬을 한 사람들로 가득해 지금이 카니발 시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 심지어 동네 마트도, 헬스장도 문을 일찍 닫고, 어학원은 휴강을 할 정도로 다들 카니발에 진심이기 때문이다. 이맘때쯤 백화점 1층에는 카니발 의상으로 가득하다. 정상적인 옷은 위층으로 올라가야 보이고 온갖 기괴한 분장 의상으로 가득해 도시 전체가 카니발 분위기로 뒤덮인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유치원에서 정해준 테마에 맞춰 아이들 의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깜박잊고 평범하게 입혀서 유치원에 보내면 슈퍼맨, 베트맨, 엘사같은 화려한 분장 속에서 평범하게 입은 내 아이만 눈에 띄는 수가 있어 엄마들도 나름의 치열한 전투를 한다고 한다.

이 곳의 코스튬은 어딘가 낯선 면이 있다. 코스튬에는 연령도 성별도 없다. 할머니들은 마녀 분장을 하고 할아버지들은 멜빵바지에 다소 옹졸해보이는 조그마한 모자를 쓴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도 각종 인형탈을 쓰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신기한 건 누구도 예쁘거나 멋있어 보이려는 의지가 없다. 일부러 더 추하게, 우스꽝스럽게, 유난스럽게 과장해 분장을 한다. 건장한 남성들이 핑크색 발레 튤스커트와 핑크색 스타킹을 신는 모습도 꽤 자주 보인다.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삐에로 같은 분장을 한 사람들, 각종 동물 옷을 입은 사람들, 알 수 없는 각종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꼭 거리 행진을 할 때만이 아니라, 카니발 시즌이 되면 그냥 그렇게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술집에 모여서 논다. 한 이웃은 나에게 “우리 딸은 나비도 아니고 나방 분장을 하고 나갔어요.”라고 웃으며 “혹시 코스튬 의상 없으면 우리집에 세일러문 가발 있는데 빌려드릴게요"라고 덧붙여 날 당황시키기도 했다.
이 요란스러운 코스튬을 보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한국에도 비슷한 축제가 있었나 떠올려보니 그나마 할로윈 축제가 있다. 할로윈 시즌이 되면 코스튬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일단 한국의 유명한 축제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다. 독특한 분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날씬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젊은 남녀가 외모를 과시하며 그야말로 ‘인싸력'을 자랑한다. SNS는 온갖 화려한 메이크업과 의상으로 가득하다. 과장스러운 할로윈 분장 역시도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급스러운 스킬로 분장의 완성도를 높인다. 어설프고 촌스러운 차림으로는 영 축제 분위기에 합류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이 곳의 코스튬은 예쁘지 않을 뿐 아니라 엉성해보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처음 봤을 땐 ‘할 거면 조금 더 신경쓰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촌스럽고 어설프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K-뷰티가 고도로 발달해 유럽의 코스튬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나보다라고 생각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길을 걷다가도 웃고 마는데, 나를 웃기고 만 그들은 꽤나 흐뭇해 한다. 처음으로 내년에는 나도 한 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건 멋있고 근사할 자신은 없어도 엉성하고 괴짜스러운 분장 정도는 해볼만 할 것 같아서였다. 이 맘 때 고릴라 옷을 입고 이 거리를 걸어도 다들 가볍게 웃는 분위기가 괜히 나까지 살랑거리게 한다.
운동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는 길, 엄청난 인파가 집 근처 골목에 모여있는 게 보였다. 누가봐도 카니발 행진이었기에 잠깐 구경이라도 할 셈으로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들과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부모들, 젊은 남녀와 청소년들, 포대자루만한 장바구니를 들고 정신없이 사탕을 주워담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은 몰려있었고 행진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라인강을 향해 걸었다. 제복을 입은 중장년의 남성들, 요정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 일제히 동작을 맞춘 기악대까지 다양한 행진대가 퍼포먼스를 하며 천천히 지나갔다. 행진을 하면서 모든 퍼레이드가 사탕, 초콜릿, 젤리 같은 군것질을 하늘로 던지면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다. 땅에 떨어진 사탕을 줍겠다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정신없이 주워담았다. 가끔은 플라스틱 볼펜같은 학용품도 날아왔고, 고무공이나 캐릭터 카드도 던져졌으며, 작은 유리병에 담긴 술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다.


날아오는 사탕에 안경을 맞은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안경을 확인하고 다시 퍼레이드를 구경했다. 아이들은 커다란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기 위해 사탕을 줍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거리를 꽉 채우는 EDM에 맞춰 건장한 아빠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비트에 맞게 거칠게 흔들었고, 유모차 안에 있는 아이도 흔들림에 맞춰 춤을 췄다. 왠지 바닥에 떨어진 젤리를 줍기는 민망했던 나와 남편도 어느샌가 무리에 합류해 열심히 주웠다. 팝콘 봉지나 초콜릿을 주우며 신이 나서 주머니에 담았고, 카메라로 들뜬 풍경을 찍고 있는 내 품에 날아드는 초콜릿도 놓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우산을 거꾸로 들고 쾰른 카니발에 사흘 내리 참여했더니, 3년치 먹을 간식을 챙겼다"고도 할 정도로 대도시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이 작은 동네에도 꽤 근사한 퍼레이드가 열렸다.

그 곳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잖을 떨기보다는 다들 하늘에서 날아오는 초콜릿에 아이처럼 달려들었다. 내가 받으려다 놓친 고무공을 친절하게 ‘당신 거에요'라며 주워줬던 중년의 남성은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애들이나 노는 축제'라거나 ‘젊어서 좋겠다'라는 힘 빠지는 말 같은 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다. 열 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경쟁적으로 사탕을 줍는 모습도, 퍼레이드가 다 끝났는데도 여운을 못 이겨 아직도 유모차를 흔들며 춤을 추는 아빠의 모습도, 하리보 젤리로 장바구니 가득 채워 돌아가는 노부부의 모습도 흥에 겨워 보였다. 모두가 진심으로 즐기는 이 축제가 무려 카톨릭에서 기리는 날이라는 것도 잠시 잊을 만큼, 경건함과 엄숙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특별히 더 아름답고 잘 노는 소위 ‘인싸'는 보이지 않았다. 흔히들 말하는 ‘어린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 ‘젊은 커플이 가기 좋은 곳’,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곳’, ‘할머니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구분은 그 곳에 없었다. 누가 더 잘 노나, 누가 더 멋있게 꾸미나 같은 어설픈 눈치 게임 없이 까르르 웃으며 사탕을 줍는 놀이라니. 평생 일년에 한 번은 이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 곳의 사람들이 부러워졌다. 백발이 된 나도 남 눈치 보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탕에 몸을 던지며 해맑게 놀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

* 메이
유학생 남편과 함께 독일에서 신혼 생활을 꾸리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야기. 프리랜서로 일하며, 독일어를 배우면서, 일상의 풍경들을 낯선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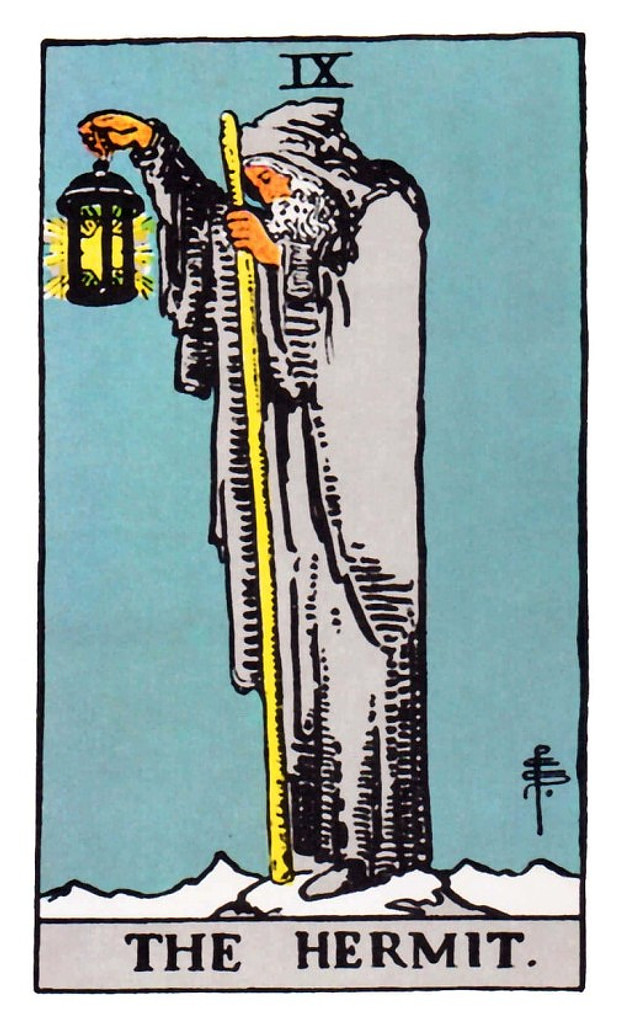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