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만에 한국행을 앞두고 요즘 나와 남편은 부쩍 들떠있다. 바쁜 일정 와중에도 가장 설레는 건 한국 음식을 먹는 일이었다. 매콥 짭짤하고 뜨끈한 국물과 갖가지 밑반찬도 기다려지지만, 무엇보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를 먹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유튜브로 요즘 유명하다는 식당과 카페를 찾다보면 익숙한 것들 만큼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아져서 따라가기 바쁘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시절, 매일 똑같은 출퇴근을 반복하는 평범한 하루 속 소소한 기쁨은 새로운 카페를 찾아나서는 것이었다. 주말이면 안 가본 카페를 찾아가서 처음보는 디저트를 시키곤 했다. 디저트 천국인 한국은 빙수가 유행하면 메론, 수박, 망고 등 각종 과일을 통째로 쏟아부은 거대한 빙수부터 치즈케익, 초코케익도 빙수 위에 토핑으로 얹을 만큼 수많은 카페들이 새로운 시도에 거침없고 고객들도 이색적인 메뉴를 반긴다. 요즘에는 사람 얼굴보다 한참 큰 대왕 크로와상이라던가, 곰인형 모양을 한 아이스크림 케익이라던가, 카스테라와 소금빵을 합친 카스테라 소금빵같은 이색적인 메뉴들이 쏟아진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거의 모든 계절마다 먹는 음식과 디저트가 변하지 않는 느낌이다. 더이상 새로운 카페를 찾아나서지 않게 된 건 대부분의 카페가 같은 커피와 같은 디저트를 팔기 때문에 호기심을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늘 익숙한 그 맛을 찾아다니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딜 가도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 같은 기본 메뉴와 계절 과일이 올라간 크림 케익, 애플 파이, 크로와상 같은 것을 판다.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눌러서 구워낸 크로플이라던가, 생전 처음보는 비쥬얼의 디저트 같은 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카페만이 아니라 매년 가장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도시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보면서 그 지역만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어딜가나 전형적인 몇 가지 음식들과 음료로 기가 막히게 통일되어 있다.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정해진 품목만 팔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무려 11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는 쾰른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을 며칠에 걸쳐 뒤져봤지만 와플, 군밤, 크레페, 소세지 같이 전형적인 몇 가지 메뉴로 통일이 되어 있었다.
“지겹지는 않으세요?” 이 도시에 정착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한국계 독일인 이웃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유럽은 낭만적이고 역사가 보존된 도시가 많지만, 그 말은 즉 매일매일의 풍경이 어제와 같고, 10년 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한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즐거움보다는 지루함으로 느껴질 것 같았다. “지루하긴 하죠. 그치만 매력이 있어요.” 이곳에서 두 아이를 성인으로 키운 노련한 아이 엄마에게 이 작은 도시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물었다.
흐리고 우중충한 겨울과 봄이 지나 바싹 마른 햇살이 쨍하게 들어오는 여름에는 햇볕을 맞는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 기다리던 여름이 오면 독일인들은 실내 텅빈 테이블을 마다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좁은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즐긴다. 뜨거운 햇살을 놓칠까 옷을 벗고 잔디밭에 눕기도 하고, 등산과 산책을 열심히 다닌다. 여름에는 제철 음식인 슈파겔(화이트 아스파라거스)을 먹고, 흐린 가을이 올 즈음에는 초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페더바이서(매해 첫 수확한 포도로 만든 숙성되기 전의 햇와인)를 마신다. 겨울에는 따뜻한 글뤼바인(달콤하고 따뜻한 와인)과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파는 겨울 간식들을 즐긴다고 한다.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평화롭다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색적인 신메뉴를 기다리는 마음만큼이나 늘 돌아오는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렐 수 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다. 30년만 지나도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게 당연한 서울에서 살다보니, 100년 넘는 집도 구옥은 아니라던 독일인 친구의 말에 당황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쩐지 뒤쳐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보니 오래된 것은 당연히 지루하고 떠나고 싶어지기도 하는 마음을 새삼 다시 살피게 됐다. 150년 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낭만적이란 생각은 했지만, 정작 3년만 지나도 신메뉴가 없다며 답답해했던 건 ‘변화' 그 자체를 나도 모르게 신봉했기 때문이란 생각도 들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늘 같은 커피를 마셔도 여름 햇살 아래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에 설렘을 느끼는 것,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똑같은 글뤼바인을 마셔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세 시간을 줄 서서 먹고 인증샷을 찍어야만 보란듯이 즐거워지는 마음과는 또 다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다. 행복에 정답은 없다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를 떠나 느리고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독일의 한 소도시에서 느끼는 이 행복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의 모습으로, 겨울에는 겨울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즐길 마음만 있다면 지루함을 뚫고 나오는 작은 설렘들로 배부르게 즐길 수 있다.
* 메이 - 유학생 남편과 함께 독일에서 신혼 생활을 꾸리며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야기. 프리랜서로 일하며, 독일어를 배우면서, 일상의 풍경들을 낯선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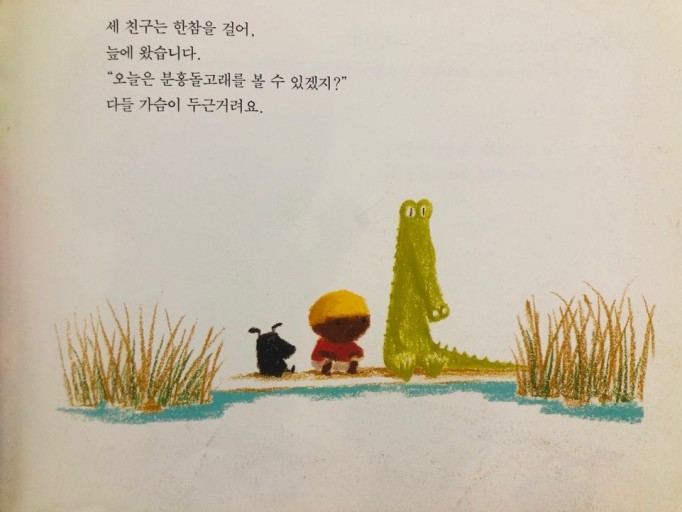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