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엄마가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가득 들여 만드신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고,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차에 우연히 ‘마이네임이즈 가브리엘’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눈이 말갛고 반짝이는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루리’라는 사람의 삶을 3일간 살아보는 흥미로운 내용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다. 나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블린에서 살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40대 아일랜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나는 더블린에 살지 않아요.
가끔 한국에서 또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이 아일랜드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나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올 때가 있다. 그들에게 아일랜드는 곧 더블린을 뜻하는 것과 같았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정말 미안해하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더블린까지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다.
최근에 한국문화가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나 역시 아일랜드에 살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한국이 곧 서울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부산이나 제주도 또는 전주와 같은 곳들에 대해 알고 있고 또 방문해 보고 싶어 해서 좀 놀랐던 기억들이 있다.
더블리너(Dubliners)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뉴요커(New Yorker)라고 부르듯이, 더블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블리너’라고 부른다. 내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일랜드의 전통음악 밴드인 ‘더블리너’를 통해서이다.
한국에서 전국 어느 곳에서든 편의점을 찾아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에서는 전국 어느 곳에 가도 작은 펍(pub)을 볼 수 있다. 이 펍 들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거나 주류를 마실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매일 또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아일랜드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들이 공연을 하는데 더블리너 역시 작은 펍에서 노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를 만들어 낸 유명한 밴드가 되었다.
그냥 펍에서 맥주 한잔 마시며 (공간이 작아) 무릎을 맞대고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밴드의 공연이 시작되면 함께 노래를 듣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은 아일랜드의 어느 펍에서든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들이다.

다시 박보검의 더블린으로 돌아가서
아일랜드 사람과 결혼하여 아일랜드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헐링(Huling)과 아일랜드 풋볼(Itish football) 훈련에 참여하게 하고, 아일랜드의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역의 음악 클럽에 보내는 것은 한국에서 아이를 영어, 수학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처럼 선택보다는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박보검이 삶을 대신 살았던 루리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음악과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합창단을 지휘하고 또 피아노 레슨을 하는 등의 일을 하며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루리는 램파츠라는 남성 아카펠라 중창단을 이끌면서 단원들과 음악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었다.
아일랜드에서는 도시에서든 작은 마을에서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해 나가는 공동체 문화가 오랫동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그런 경향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는 것들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네에서 합창단, 드라마 클럽, 카드 클럽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누구든 마음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이 높지 않아 아일랜드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모임들에 속해서 시간을 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루리의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소다브레드
아일랜드 사람인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 언제나 가족들이 먹을 빵을 직접 구우셨다고 했다. 시어머니께서 구우셨던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빵이나 모닝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통밀가루로 만든 갈색 빵이었다. 박보검이 루리의 부모님 댁에 방문해서 어머니의 안내로 함께 만들어 보았던 빵이 바로 그것인데, 소다 브레드로 소개된 이 빵은 사실 ‘브라운 브레드’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마치 파운드케이크처럼 생긴 빵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엄마가 손으로 대강의 성형을 통해 커다랗고 둥글게 만들어서 가운데에 십자 모양의 칼집을 넣어서 식탁에 놓을 때는 작게 잘라 놓을 수 있도록 만든다.

박보검이 루리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브라운 브레드와 연어의 조합은 꽤나 좋아서, 아일랜드의 식당에서 런치메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리고 오늘의 수프를 주문해도 브라운 브레드 한 두 조각과 함께 서빙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조금 놀라웠던 점은 점심식사를 먹으며 와인을 곁들이는 루리의 가족 모습이었다. 전통적으로 브라운 브레드를 곁들인 점심식사에서는 따뜻한 홍차를 우유에 타서 설탕을 넣어 먹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야 식사 후에 후식으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일랜드에서는 특히 주말이면 차를 담은 주전자를 가득 채워놓고 식사하면서 또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차 주전자를 비우고 또 비우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며 점심쯤 시작한 식사가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보검이 경험하고 보여준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아일랜드의 문화는 소박하지만 착하고 정겹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서 10년을 살면서 내가 느낀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한다는 점이다. 또 이웃들에게 무심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작은 바자회, 모금 활동 등을 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다. 그리고 손님들을 환대하고 낯선 이들에게도 웃음기 넘치는 말들을 하며 대화를 즐겁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마음 한편에 장착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든 쉽게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박보검이 더블린에서 루리로 살아간 3일의 시간은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갔기에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일랜드가 가까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이는 박보검이 함께 하는 합창단이 부르는 아일랜드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아일랜드가 가까웠다면, 더 많은 한국인들이 아일랜드를 방문해서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자주 부모님을 방문하고 또 부모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에 오셔서 아이가 부르는 아일랜드 노래를 함께 들으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날이 더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희망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일랜드 로컬 여행기'
아일랜드 사람과 결혼한 뒤 10년 동안 아일랜드 코크(Cork)에 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크고 작은 도시와 작은 마을을 여행하고 쓴 세가족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글쓴이: 도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길에서 만난 아일랜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올 해로 10년째 아일랜드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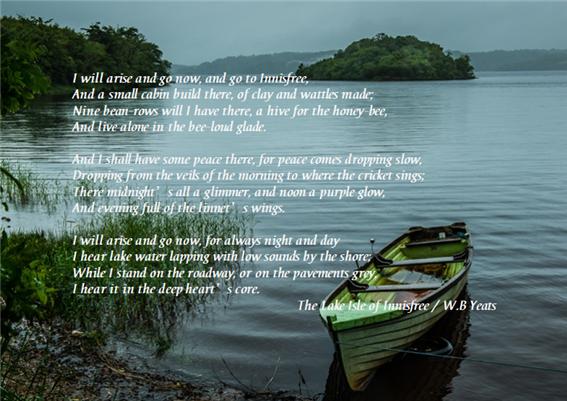



의견을 남겨주세요